-

-
똑같은 빨강은 없다 - 교과서에 다 담지 못한 미술 이야기 ㅣ 창비청소년문고 32
김경서 지음 / 창비 / 2018년 10월
평점 :



똑같은 빨강은 없다, 교과서에 다 담지 못한 미술 이야기

참 이기적인 미술을 좀 더 친근하게 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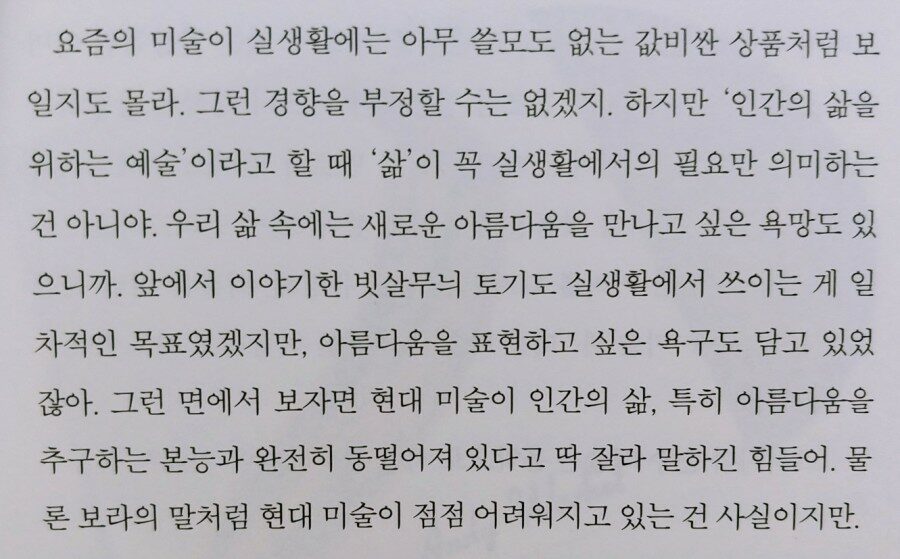
미술은 '잘 그려야 하는 것'일까?
작가는 이 책을 이끌어가는 보라와의 대화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할 것'을 강조한다.
그리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술에 흥미를 잃는 것을 경계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두 가지 색으로만 캔버스를 가득 채운 마크 로스코의 추상화 <오렌지와 노랑>,
변기를 예술이라 칭한 마르셀 뒤상의 <샘> 등을 보며
이 작품들을 왜 훌륭하다고 평가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보라에게
작가는 작품을 감상하는 데 틀린 관점이란 없으며
"누구나, 언제든,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
그건 진정한 창작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즉, 미술 작품 감상은 솔직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는 것.

화가이자 사진 작가였던 도라 마르를 모델로 피카로는 <우는 여인>이라는 작품을 그린다.
지적이거나 아름답기는커녕 잔인할 정도로 이목구비가 뒤틀린 모습.
피카소는 왜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그렸을까?
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과 작가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개념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재현에 관심을 두었던 화가들이 대상이 가진 객관적 형상에서 그 원본을 찾았다면
고흐는 작가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즉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것에 중심을 두었다.
모딜리아니 역시 <큰 모자를 쓴 잔 에뷔테른>에서
길게 과장된 비례를 활용함으로써 가녀리고 애절한 감정의 전달을 극대화하려 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 그는 미르에게서 슬픔의 감정을 찾아내 표현하고자 했고
마르의 얼굴을 왜곡하고 변형하고 생략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가진 슬픔의 감정을 대변하고자 했다.
이러한 재현은 형태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방법 말고
아주 단순화하는 방법도 있다.
자코메티의 <걷는 세 사람>이라는 조각 작품이 단순화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메마르고 황량한 인간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처럼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작가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고흐는 거칠고 격렬한 붓 자국을 이용했고
모딜리아니는 비례를 변형했고,
피카소는 형상을 분해했고,
자코메티는 단순화함으로써 감정과 개성을 나타낸 것이다.
남들과 다른 창조적 표현을 하면서도 모두가 공감하는 인간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술의 중요한 가치라고 하겠다.

미술 작품 이야기나 작가들 이야기 역시 역사 이야기만큼이나 흥미롭지만
사실, 내 눈에 이상한 것을 최고의 작품이라 말하는 데는 동의하지 못하는 1인.
《똑같은 빨강은 없다》에서는 작가가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것을 담아낸 작품을
꼭 사회적 기준이나 평론가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미술사가 언스트 곰브리치가 말한 것처럼
미술은 시대에 따라 늘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의 내릴 수 없다.
다만, 미술 작품을 창조하는 미술가들만이 존재한다는 것.
책 속 보라와 선생님은 작품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화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작품이 상징하는 바를 추측해보고
작품이 놓인 시대적 맥락을 살피기도 한다.
두 사람의 대화 끝에 다다르는 '미술'은 결국 '미술가가 세상에 건네는 이야기'.
미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라 말함으로써
미술을 어려워하는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책이랄까.
미술이 궁금하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들여다보기 딱 좋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