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혼자서 떠나는 여행 - 낯선 곳에서 침묵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정원철 지음 / 어깨위망원경 / 2025년 4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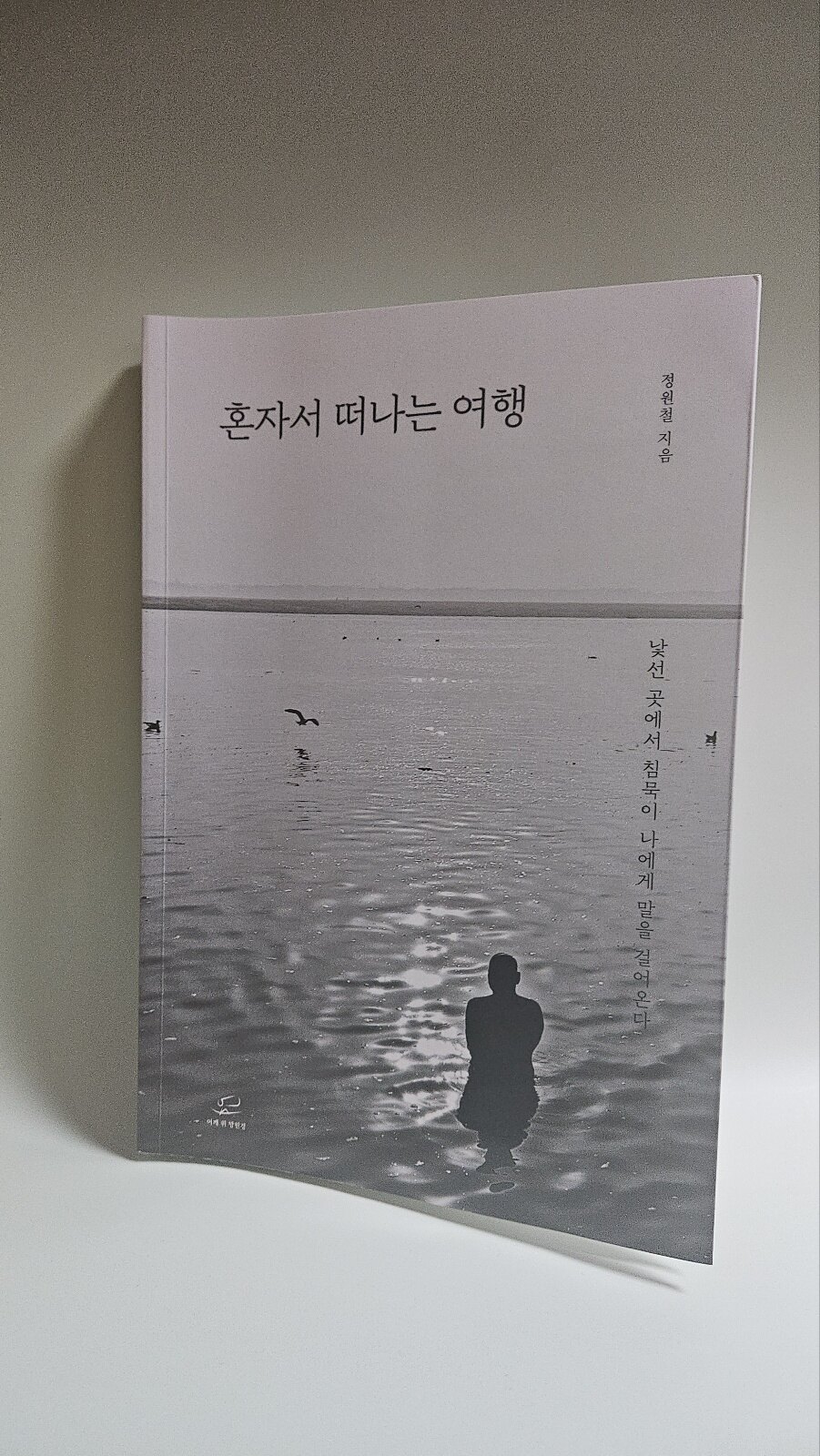
혼자서 떠나는 여행 - 정원철
*본 도서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혼자서 떠나는 여행> 얼마나 낭만적인 말인가. 2025년 4월에 나도 혼자 여행을 두 번 이나 떠났다. 물론 작가처럼 유럽이나 인도 네팔 같은 해외는 아니다. 그렇지만 지독한 집순이인 내가 달력 한 장이 채 넘어가기 전에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설 생각을 하다니 놀랍다. 새로 다가오는 5월에는 첫날부터 연휴가 몰려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떠나겠지만 역시 나도 또 혼자서 떠나봐야지. 작가는 퇴직과 함께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유럽여행을 혼자서 떠났다. 원래 나처럼 홀홀단신인 사람일까 했는데, 그럴리가.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을 내려놓고 떠나는 숨쉴 수 있는 여행이었다.
책은 일단 여행지에 대해 엄청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혼자서 여행을 다니는 소회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담았다. 여행지에 대한 가이드북이 필요하다면 가이드북을, 각자의 여행 스타일이 궁금하다면 이런 에세이를 읽는 것이 맞다. 책은 거의 10년 전에 육박하는 2016년 6월 초부터 2018년 2월 초까지의 여행기 4챕터를 담았다. 사진을 전공했다고 하지 않았으나 10년 전 화질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여행 뽐뿌가 제대로 오는 사진들이 담겨있다. 역시 여행에는 사진이 제일 많이 남는 것인가 싶었다. 그렇지만 여행기의 면면히 남아있는 작가의 생각을 엿보는 것이 좋았다.
나에게 유럽은 그다지 끌리는 곳이 아니다. 한 때 여러 번 가기도 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런던은 가보지 않았다. 역시나 가보지 않았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8년 연속이나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다고 하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암스테르담도시 이름이 <담>으로 끝나는 것도 강둑을 따라 만든 댐에서 비롯된 것이란다. 암스테르담도 암스텔 강을 가로지르는 댐이라는 뜻이라고. 암스테르담의 건물과 창문은
좁고 길쭉한 창문과 건물들이 많다고 한다. 예전에 도로에 면한 면적에 비례해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지금의 좁고 긴 창문이 만들어졌다는데, 역시나 가보지 않는 교토와 비슷하구나 하고 생각했다. 매장을 들어가면 좁지만 회랑식으로 뒤로 길쭉한 건물들. 그런 건물이 일본에도 네덜란드에도 비슷한 이유로 생기다니 세상은 역시나 비슷하게 다른 곳이다.
나는 인도 여행을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한 번쯤은 가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다만 인도에서 적선하는 것과 관련된 프렌드들과의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 물론 나도 그 젊은 친구처럼 당장을 해결하는 적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만큼 형편이 좋지도 못하기도 하고, 비슷한 신념이랄까. 그렇지만 당장 일을 할 수도 없어보이는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작가에게 그러지 말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했다. 그 뒤의 여행기에서 봐도 역시나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더라. 사람에게 절대적인 선을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 잘못일까. 나이가 좀 들어보니 세상이 젊었을 때처럼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도와줘도 되지 않나로 바뀌었다. 영화 배트맨의 촬영지인 메헤랑가르 요새의 입구 손 모양의 부조에 관한 이야기가 괴로웠다. 인도의 풍습 <사티>는 남편이 죽어 화장할 때 부인도 산채로 화장했던 풍습 이란다. 1829년 금지령 이후 줄었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근세까지 있었던 이야기다. 최근 혼자 여행했을 때 원래 하얀 소나무를 보러 갔다가 열녀문에 당황해서 원래 목적을 잊고 돌아온 생각이 났다. 왜 남편이 죽었다고 14일이나 곡기를 끊어서 죽는단 말인가. 왜 남편이 죽는다고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본인도 삶을 마쳐야만 한단 말인가. 사람은 1+1이 아닌데. 여행기와 최근의 내 여행의 접점이 만나는 것 같아서 오랜 시간 생각했다.
이외에도 인도에서 웨이팅리스트라고 적힌 기차표를 당연히 봤을 거면서도 하루 강제로 여행 가이드를 해준 마리아와의 하루에서는 깔깔 웃었다. 유심도 개통해주고, 가고 싶었던 곳도 데려가 주고, 그 모든 게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 느낌이 아니라 그녀가 입었던 제복이나 느낌이 이미 말해주었을 테니까.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도착하고자 하는 기차에 대한 문제부터 같이 해결해줬다면 그렇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 경험의 일부가 아니겠나. 내일 택시 여행으로 만나자고 선금을 50%나 줘버린 것도 나에게는 하등 이상하지 않은 구두계약이 어떤 이에게는 눈먼 돈일 수도 있다는 것. 다시 만날 사람이 아니니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것. 그렇지만 작가는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쌓아간다. 아마 즐겁고 행복한 순간은 짧게 묘사되고, 이런 각자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과는 빌드업이 있어서 많이 기억나는 것 같다.
스리랑카의 <실론 싯>에 대한 여행기는 처음 접해보았다. 커피나무의 전멸로 차나무로 업종을 변경한 스리랑카에도 언젠가는 한 번 가보고 싶다. 네팔과 히말라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일까에 대한 내 편협함도 조금쯤은 지워졌다. 작가처럼 나도 2019년 이후로는 국내를 떠나본 적이 없다. 올해는 꼭 여권을 새로 발급하고 훌쩍 혼자서 떠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