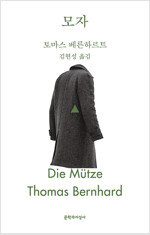
모자
토마스 베른하르트 지음, 김현성 옮김 / 문학과지성사 / 2020년 5월 |  |
이 소설집은 내게 하나의 철학서라 할 수 있고 정신이 조금 나간 신경증 환자의 독백이며 불안과 파괴 본능에 몸서리치는 작가의 자전적 고백서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였다. 더 나아가 방기된 유년시절을 겪은 사람이라면 의식의 흐름같은 이 단편들이 자기를 불순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너무 사변적인 독백같고 다른 편으로는 인간성을 훼손당한 자신의 극대화된 대변이라고도 여겨질 것이다. 그렇듯 소설은 외곬으로 세상에서 배제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어쩌지 못하는 삶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소설이 매체처럼 한 사건을 정면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사건들 전체를 상징한다고 할 때, 소설이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 그래서 작가의 눈은 자신과 세상 전부를 관통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해도 그것 또한 이 세계의 극히 작은 일부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차피 커다란 세계, 우주의 먼지 한 톨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한 인간의 삶은 그토록 고통스러워도 세계를 이루는 모순과 자연의 법칙 안에서 그저 일어나고 스러지는 순간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보면 죽음만이 영원한 것이고 불안과 광기, 슬픔과 고통은 한 순간 생명이 있던 부조리한 자리에서 피어났다 지는 들풀 하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것을 누군가는 기록해야한다. 작가는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작가는 그래서 무상하고 유구한 자연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다 가는지를, 그 모순 투성이의 삶이 얼마나 리얼하게 인간을 옥죄고 괴로움에 떨게 하는지... 그것을 깨우쳐주는 문학이 없다면 얼마나 더 헛되고 허무한가.
두 명의 교사
모자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야우레크
프랑스 대사관 문정관
인스브루크 상인 아들의 범죄
목수
슈틸프스의 미들랜드
비옷
오르틀러에서--고마고이에서 온 소식
이렇게 열 편이 수록되어 있는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소설집. 문지판 스펙트럼 시리즈로 얇고 가지고 다니기 알맞게 가볍다.
내 느낌을 적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다. 얼른 베른하르트를 흉내내는 글을 쓰고 싶은 욕구 때문에 문지에서 책소개하는 난 일부를 그대로 옮겨 놓고 나는 한글 2018 키보드를 두드리고 싶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질병으로 죽어가거나 자살하거나 살인하거나 살해당한다. 그의 작품에는 줄거리나 플롯 없이 다만 누군가의 죽음만 주어져 있고, 그가 죽기까지의 정신적 혼란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그의 문장은 이 죽음과 광기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병렬과 대비로 과장하고 반복하고, 빠른 속도로 패러독스를 계속하며, 형용사와 부사는 언제나 최상급으로 사용한다. 그는 독일어 문장의 특징을 십분 발휘해 끝없이 이어지는 종속문의 사슬 속에 수많은 쉼표와 느낌표, 쌍점등을 흩뿌려놓고, 동의어를 끝없이 반복하고, 때로는 구나 절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반복하기도 한다. 주인공의 정신이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나타내는 이러한 광적인 문장은 읽는 사람의 머릿속까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한다.
베른하르트는 삶에 대한 어떤 기대도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 삶에 대한 환상이 없기 때문에 문학에도 환상이 없다. 베른하르트는 노발리스와 카프카의 관념적인 아들로 간주되지만, 그들과 달리 어둠과 죽음을 예찬하거나 구원의 빛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 베케트와도 자주 비견되지만,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 '삶이란 결국 모두 미치고야 말 절망인데도 미래라는 과대망상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옥 속에서 더듬대고 있을 뿐, 존재론적인 질문들엔 당연히 답이 없다. 같은 주제, 같은 질문의 부조리한 ㄴ반복만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베른하르트는 이 세상이,인간이 처한 조건이 얼마나 잔인하고,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집요하게 설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