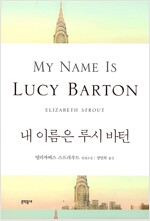
내 이름은 루시 바턴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지음, 정연희 옮김 / 문학동네 / 2017년 9월
이 작가가 글을 쓰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천천히 기억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쌓여있던 작고 희미한 기억의 편린들을 끄집어낸다. 걸려나온 편린들은 작가의 책상 앞에서 서서히 아련하지만 크고 진중하지만 고요한 과거의 시간들로 탈바꿈한다.
허나 작가는 그것을 과거의 생생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하지 않는다. 조금 사이를 띄고 바라본다. 여유를 가지고 스케치한다. 천천히 그렇게 한가지 한가지 기억을 들추어내면서 그 의미를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고 또 과거에 지나쳤던 의미를 되살린다. 뭐랄까. 기억하되 그 기억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간다할까.
정직하게 회고되지만, 진정성있게 그려지지만, 한꺼풀 보드라운 천으로 씌워진 듯한, 날 것인 감성이 아니라 잘 숙성된 치즈같이 부드럽고 원숙하고 한편으로는 착한 어린아이같은 문장들로 흥분을 일으키지 않는다. 기억나는 대로 두루뭉실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읽고나면 알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글쓰기는 작가의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저절로 형성된 부분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글에 함몰되지 않으려고 거리두기에 성공한 까닭이기도 한 것 같다.
주 사건은 오래전, 뉴욕의 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머니가 닷새간 내 병문안 겸 간호를 위해 들른 시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랫동안 서로의 진심을 나눌 수 없었던 어머니와 내가 이런저런 기억을 서로 나누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가족사를 되새겨보게 된다. 한 가족이면서도 비정상적인 가족이었던 그들의 가난과 고달픔, 열등감 등이 조금씩 독자의 뇌리에 안타깝게 쌓여간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루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족들을 떠나왔고, 어느덧 어느정도 성공한, 평범한 중산층 주부가 되어있다. 그리고 서서히 작가로서의 입지도 다지고 있다.
어머니와 딸인 루시는 닷새동안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의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에둘러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녀의 이별은, 정상적인 중산층 모녀의 이별과 아주 다르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가정도 꽤 많다. 독자로서는 루시 바턴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면서도 생의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전부를 다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된다.
페이지 221, 여백이 많아 장편치곤 아주 짧았다. 대부분의 문장이 심심하면서 담백한, 몸에 좋은 나물과 밥으로 한 상 차린, 소박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식사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