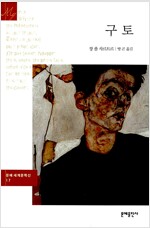
장 폴 사르트르 지음, 방곤 옮김 / 문예출판사 / 1983년 3월
몇 년 전인지, 혹은 십 몇 년 전인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 <구토>를 읽으려던 당시 계획은 30페이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작파되었었다. 왜 그렇게 사소한 일상이 어지럽게 나열되고 있는지, 사물들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그렇게 정신착란을 일으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읽을 수 있었다. 속도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여다보고 다시 읽고, 끝까지 읽었다. 읽어냈다.
어떻게 읽기가 가능했을까. 아무래도 그간의 독서의 이력도 있겠고 짧은 기간이지만 철학강의를 들었던 게 주효했던 것 같다.
'구토'는 처음부터 실존주의를 그대로 소설화했다는 말로 설명하면 쉽다. 그래서 기존의 소설문법은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 계속 사물을 보여주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신 그것의 사용가치나 본질은 이차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인간은 존재한다. 어느날 그 사람의 필요성(용도)을 배척하고 그를 본다면 그는 무엇일까. 로캉탱은 자신의 손과 발조차 이물스런 괴물로 보인다고 말한다.
특히 공원 벤취에 앉아 마로니에 뿌리를 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그 장면은 내게 확실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본질 앞에 존재하는 그 존재는, 뿌리라는 것을 망각한 상태의 존재는, 검고 울퉁불퉁하고 마디가 져서 그에게 공포심을 주는 무엇이었다. 그것의 어휘와 용법, 사람이 붙인 기호가 사라지자 그는 사물의 속성(본질,실체)에만 길들어졌던 것에서 깨어났다. 그는 존재하는 존재자체를 깨달은 것이다.
특히 '여분의 존재'라는 말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 나라는 인간도 풀도 어떤 동물도 꼭 필요한 몫이 있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어쩌다보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없어도 상관없었을 존재들이다. 모든 존재는 여분의 존재이다.
그러니 '여분'의 존재인 나는 그냥 말라비틀어져 죽어도 상관없다. 저 들의 풀 한포기든 두포기든 말라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존재는 살아있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거기에서 존재의 의미가 태어난다. 풀은 바람에 쓸리고 비에 맞아도 초록빛 몸을 다시 일으켜세워 싱싱한 풀의 향내를 낸다. 내 의미는 존재하는 동안 '여분'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상수고 최선이다.
실존주의는 이렇게 '구토'를 통해서 내게 자신의 존재를, 그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