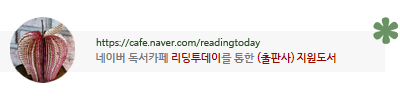-

-
익명 소설
앙투안 로랭 지음, 김정은 옮김 / 하빌리스 / 2023년 4월
평점 :



비올렌이 책임자로 있는 출판사 원고 검토부에 도착한 170쪽짜리 원고 한 편. 관련 직원들의 만장일치로 출판이 결정되고, 출판 후 대대적인 성공으로 공쿠르상 후보 지명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정작 원고를 보낸 작가 카미유 데장크르가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한다. 나이는 고사하고 심지어 성별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 공쿠르상 심사위원회에서 작가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지만, 카미유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 비올렌이 갖고 있는 카미유의 정보라고는 이메일 주소가 전부였다. 그리고 얼마 후 비올렌을 찾아온 경찰 소피 경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1부를 읽다보면 내용이 장황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을 일일이 언급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3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사실 소설이 2부에 접어들면 실체 없는 작가가 누구인지, 살인범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이 가능해지는데(독자는 그렇게 여기게 된다), 작가는 여봐란 듯이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다. 독자가 궁금해지는 지점이 카미유 데장크르가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범인이 왜 범죄를 저질렀으며 굳이 이를 대중에게 알리려 했던 의도는 무엇이냐는 관점으로 옮겨간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설이 후반부로 치달으면서 독자의 시선은 다시 '누구' 로 옮겨진다. 이렇듯 소설은 독자들이 유추할 수 있게끔 스토리를 풀어놓다가 마치 독자를 약올리듯 결정적인 순간에 흐름의 각도를 틀어버린다. 꽤 흥미로운 진행 방식이기는 한데 세 번째 범죄의 해결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차라리 네 번째 예상 피해자 죽음의 방식이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이사이 은근히 문학상과 상업성의 유착과 관례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더라는.
얼핏 성공을 위해서라면 성상납 쯤이야 예사로 여기는 한 여성의 출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소설은 예상 외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만약 르파주 부부가 엘렌의 사건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들 가족은 행복했을까? 가해자의 부모들이 자식의 범죄를 부정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 반면 비올렌의 인생에서 샤를과 에두아르(의 사랑)가 없었다면 그녀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
가끔, 책을 덮고 이런 기분이 들 때면 칠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우리 삶에 필요한 건 오직 사랑 뿐이라는 듯 여전히 사랑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해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