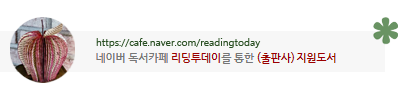-

-
흰옷을 입은 여인
크리스티앙 보뱅 지음, 이창실 옮김 / 1984Books / 2023년 2월
평점 :



"때가 되어 내게 주어질 죽음의 면류관은 미나리아재비이기를."
(에밀리 디킨슨)

붉은 머리에 흰옷을 입고, 집 밖으로 전혀 외출을 하지 않으며 종종 이층 자신의 방에서 조금 열린 덧문 사이로 이웃집 아이에게 갓 구워낸 생강빵이 담긴 버들광주리를 줄에 매달아 내려뜨렸던 신비로운 여인.
1886년, 쉰다섯 살에 임종을 맞은 에밀리 디킨슨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한다. 보뱅은 마치 그녀의 장례식을 지켜보듯 그려내고 있다. 그는 에밀리 디킨슨의 삶을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아닌, 사진첩에서 스냅 사진을 한 장씩 꺼내어 마치 오래된 친구의 추억을 소회하듯 쓰고 있다.
ㅡ
에밀리는 아무에게도 그녀만의 정서와 영혼을 이해받지 못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 중 인상적인 대목은 열 살에서 스물네 살까지 살았던 묘지를 등진 집을 '그녀의 집'이라고 부르고, 그녀가 태어났고 죽음을 맞은 또 다른 집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어머니가 딸이 인근의 숲에 들어가 다칠 것을 우려해 겁을 주듯 과장되게 충고를 했는데, 에밀리는 그 충고에 더 큰 호기심을 느끼며 숲을 돌아다녔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오히려 천사를 보았다고 말했다는 대목에서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겠더라는.
지극히 현실적이며 완벽주의였던 아버지, 자연과 영혼을 따랐던 에밀리가 충돌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에밀리는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서 영혼이 갇혀버린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처량하게 여겼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빵을 굽고, 피아노를 연주했다. 에밀리는 자신이 구운 빵을 맛있게 먹는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영혼이 열려있다고 보았다.
성마른 오빠의 성정을 맞춰주는 사람은 에밀리뿐이다. 그래서 그는 여동생을 필요로 했고, 그녀는 오빠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 에밀리는 오스틴을 돌보고, 비니는 에밀리를 돌봤다. 세 남매가 서로에게 부모이자 보호자였다. 읽다보면 세 남매가 성격도 다 다르고 개성도 제각각이었던 듯 하다. 에밀리의 여동생 비니가 각자가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말이다.
텍스트와 책을 사랑했던 수잔이 한식구가 된 건 에밀리에게 있어 다행스러운 일일테다. 올케 수잔과 친구 이상의 애정관계라는 시각도 적지 않은데, 보뱅은 이 부분을 참 묘하게 썼다.
그녀에게도 마음을 기댔던 몇몇 이들이 있었다. 히긴슨, 보울스, 오티스 필립 로드.
에밀리의 상실감은 어린 시절 이모댁에 맡겨젔을 당시 어머니의 부재, 스승이라 여겼던 벤자민의 사망, 강건하고 완벽했으나 오히려 에밀리가 측은하게 여겼던 아버지의 죽음, 친구 소피아의 임종을 지키는 순간, 에밀리는 은닉자가 된다. 매순간 세상의 종말을 응시하면서. 특히 자식처럼 사랑했던 어린 조카의 죽음과 잠시나마 결혼을 생각했을 정도로 마음 속에 깊이 두었던 오티스 필립 로드의 죽음은 에밀리에게 결정타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실과 결핍이 그녀에게 있어 글쓰기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더없이 씁쓸한 아이러니이고.
ㅡ
읽다보니 그동안 갖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든다. 그녀의 은둔이 온전히 자의였을까. 물론 누가 그녀를 물리적으로 가뒀다는 의미는 아니다. 감수성이 넓고 깊었던 에밀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견디기 힘들었을테고, 무엇보다 모든 식구들이 그녀의 헌신에 기대고 의지하는 정도가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영혼과 순전한 감각을 중요시했던 에밀리에게 있어 집, 가족, 그들에 대한 사랑은 신앙과 같지 않았을까. 그렇기에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건 아닌가라는 데에 생각이 미친다. 그러면서 누구하나 버려지는 이가 없게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모든 것을 글로써 남기려 했던 에밀리의 성향은 모순적이게도 그녀의 아버지와 닮은 것 같기도 하다.
기술 발달과 돈의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삶을 섬겼던 에밀리 디킨슨. 겸손이 오만이며, 소멸이 승리였던 사람. 자신의 감각에 충실하고, 감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는 삶의 희열이 무엇인지 알았던 그녀. 도대체 이 사람은 그토록 강렬한 열정을 어떻게 가슴 속에 품고만 살 수 있었을까.
그러다 문득, 편지를 주고 받으며 지냈던 어릴 적 친구가 찾아와도 결국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않고 서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긴 잡담을 나눴다는 대목에서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불편하게 했을까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 알 수 있었다. 남다른 정서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잣대에 맞춰진, 소위 보편적 시각을 가진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늘 느끼는 바이지만, 같은 내용도 보뱅이 쓰면 참 다르다는 생각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들었다. 전기물을 이렇게 쓸수도 있구나... . 에밀리 디킨슨의 죽음과 삶의 이력을 헤밍웨이나 울프의 결을 가진 작가가 썼다면 아마 이 책과는 많이 달랐을 터다.
한 장 한 장 아껴가며 천천히 읽었다.
사족
에밀리가 서른 살 때에 길을 묻는 한 노파에게, '노파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묘지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는 그녀. 때로는 누가 그녀를 쉽게 이해해 줄 수 있었겠나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