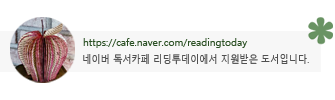-

-
환희의 인간
크리스티앙 보뱅 지음, 이주현 옮김 / 1984Books / 2021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며 우리가 보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이름을, 진정한 자신의 이름을 부여한다고 말하는 시인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시선이 느껴지는 에세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시각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평소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 드러나는 모습을 목격할 때가 있다. 좋다, 나쁘다 혹은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때때로 우리에게는 거창하지 않은, 일상의 작은 틈을 이용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시인은 오래된 책보다 더 젊은 것은 없다고 썼다. 무슨 의미일까? 곰곰 생각해보기도 전에 한두 쪽을 넘기니 푸쉬킨과 시인의 글이 답을 준다. 황폐한 우리의 머릿속에 불을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오래된 책들이다. 글은 죽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아마 죽음으로 침묵하는 이들의 모든 생각과 말들이 책 안에 녹여져 있으며, 책이 부싯돌 역할을 해준다면 내면화를 통해 재창조하는 것은 결국 독자 개인의 노력에 달렸음이다.
연주회장에서는 연주자도 청자도 오롯이 음악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글렌 굴드의 말에 현혹된다. 하물며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 것도 거슬려하는 나같은 사람은 격하게 공감한다. 오페라 공연 관람시에도 노래 들으랴, 연기 감상하랴, 자막 보랴 정신이 없다. 어느 연주회에서는 아주 가끔 조는 사람도 있어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엉뚱하기는 하지만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 책에서도 여지없이 등장하는 지슬렌. '단 한 번의 봄이 일생의 모든 봄이었고, 단 한 순간의 삶이 모든 순간을 살아낸 삶과 같았다' 라는 문장이 얼핏 읽기에는 그저 사랑타령에 불과한 듯 하지만 좀 오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사랑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때의 좋은 기억으로 남은 추억은 삶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는 경험이 있지 않은가.
시인은 알츠하이머가 고단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일들과 물건을 사고 타인을 질투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현대 생활의 질서에서 해방시켜준다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한 번도 삶이었던 적이 없는 삶을 끝내준다고 말한다. 이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자, '우리가 잊지 않은 녀석',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는 분. 시인의 남다른 감수성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지점이었다.
산책을 하고, 책을 펼치고,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면,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이겠냐는 시인의 물음에서, 나는 잠시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크고 아름다운 열쇠 꾸러미, 그러나 문이 없다면 그 열쇠 꾸러미는 쓸모가 없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문이 존재한다. 그 문이 어떤 문인지는 본인만이 알 것이고, 그 문을 만드는 자가 누구인지 또한 본인만이 알 터다.
야생과 순수가 결합된 집시 소녀, 시각과 관점, 괴짜 글렌 굴드를 바라보는 이해 충만한 시선, 음악과 사랑과 삶의 숭고한 동일성, 지금은 세상에 없으나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여인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추억,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하는 철학적 사유, 질병과 노화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정서적 측면이 결여된 부적절한 노인 부양 시스템의 지적, 어린 고양이의 죽음을 통해 바라 본 삶이 우리를 데려가는 종착지에 대한 단상, 스스로 만든 단절과 허상에 대한 성찰.
서투름으로 붉어진 상처 입은 삶이야말로 진실하고, 자신의 책들은 모두 스스로 쓰여졌다고 말하며, 읽고 쓰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크리스티앙 보뱅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부분들에서 삶의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