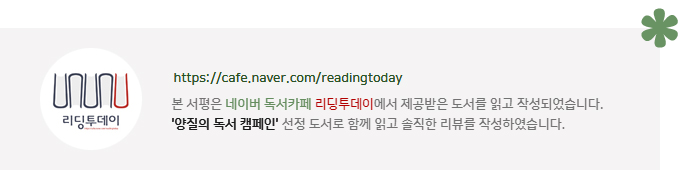-

-
잃어버린 밤에 대하여 - 우리가 외면한 또하나의 문화사
로저 에커치 지음, 조한욱 옮김 / 교유서가 / 2016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이 책은 산업혁명 이전까지 인간의 밤의 역사에 대해 기록했다.
인간의 어둠에 대한 본연적인 두려움 혹은 불안감은 태곳적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특정의 위험에 공포를 느꼈을 것과 여러 세대에 걸쳐 본능적인 공포를 갖기 시작했다고 추론한다. 어떻든 간에 저자는 문화가 밤의 어둠에 대한 공공연한 혐오감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고대 신화와 설화는 밤을 마법과 악, 죽음을 어둠과 동일시 했으며 성서 역시 일련의 사악한 행동은 밤에 저질러진다고 기록한다. 그랗다고 모든 사회가 밤을 혐오스럽게만 본 것은 아니었지만 산업혁명 이전의 몇백 년 동안 저녁은 위협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근대 초 전반에 걸쳐 밤이라는 영역은 교회와 국가의 감시를 벗어나 있었다. 세속계와 종교계에게 밤은 낮의 고된 일을 마감하는 시간이었고 어둠은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또한 당국에게 밤의 어둠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제약과 억압에 의존할 수 있었다. 본질적으로 밤이 갖는 최고의 가치는 신앙과 휴식의 장려와 더불어 깨어 있는 세계를 부정한다는 사실이었다.
근대 초 사회에서 공공도덕은 물론 개인적 이해관계에 뿌리를 둔 이유들로, 개인의 잘못된 행동은 곧잘 발각되었다. 가리거나 숨기는 행위는 이웃들에게 비난을 당했는데 특히 긴밀하게 맺어진 작은 사회에서는 이웃의 평판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근대 초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별로 보장받지 못했다. 사회의 낮은 계층은 가장 큰 검영열 대상이었는데, 일용 노동자 하인 부랑자 이교도 노예 등이 그들이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인간 최초의 조상들은 해가 진 뒤에 본능적으로 잠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낮의 인간이 진화인지, 유전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근대 초에 이르러 밤의 휴식은 삶의 자연적 질서와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옛 시대에는 잠보다는 밤 혹은 꿈이 연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일기, 의학 서적, 문학, 법률 서적 등 수많은 자료 속에 잠이 꼭 언급되어 있다. 잠은 사람들이 깊이 고찰한 주제였다.
어둠이 주는 두려움으로 확대된 공포와 실질적인 밤의 위험성, 초자연적인 현상이 갖는 밤의 신비, 밤 활동을 제한하려는 국가와 종교의 억압, 어둠을 틈타 은밀한 즐거움을 즐기는 환락, 휴식을 제공하는 밤 시간과 그에 반해 밤에도 노동을 해야 하는 하층 계급, 더불어 잠에 대한 이야기까지 책은 여러 의미로 광범위하게 밤을 다룬다. 18세기 중엽 이후 기술의 발달로 밤이 밝아지면서 밤은 더이상 신비로운 혹은 휴식의 시간으로 남아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글을 맺는다.
책을 읽다보니 엄청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방만한 생활 습관을 키웠으며, 육체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켰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밤의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밤은 사람들의 창의성이나 기지에 큰 자극을 주었던 당시를 떠올려보면 현대인은 점점 더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싶다. 산업화 이전이든 이후든 경제적 하층민에게는 여전히 밤은 또다른 생존의 시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조명 기술이 발달한 현재,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졌지만 누군가의 달콤한 시간이 모두에게 달콤하지 않았다는 역사를, 그리고 현재도 그렇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