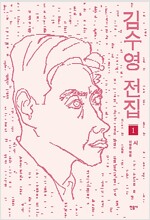
김수영의 시 앞에서 모든 문장은 위선이거나 위악일지도 모른다. 문장의 이면에 숨겨둔 의도와 장치들이 무의미해지는 지점이 그의 시에 확연히 드러난다. 생과 역사를 그대로 관통하는 시어의 힘은 강하다. 그 힘은 다른 문장을 굴복시키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긴장을 치열하게 유지하는 온전한 힘 그 자체다. 내적 갈등의 증폭을 견뎌내는 강인함을 통해 그의 시는 살아있다. 하지만 힘의 근원은 ‘거대한 뿌리’에 있다. 척박한 땅을 뚫고 지나가며 단단히 끌어안는 뿌리로 그의 시를 형상화할 수 있다.
시인 김수영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4.19라는 사건에서 그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늘과 땅의 통일을 느끼며 스스로는 온몸에 허위가 없다고 한다. (「저 하늘이 열릴 때」1960) 김수영은 4.19를 찬양하여 사건 자체에 매몰되지도 않으며 사건에 대한 사유를 발전시켜나간다. 그의 시 「사랑」에서 사랑을 배우게 해준 ‘너’를 ‘4.19’로 치환하여도 독해가 가능하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랑의 변주곡」도 이해할 수 있다. 그에게 4.19는 기념의 사건이 아니다. 「<4.19>시」라는 제목의 시는 기념하지 않기 위해 쓴 시다. 그의 헌신에는 맹목이 없다.
그의 시는 세계와 소통한다.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우슈비츠라는 파국 이후에 아름다운 가상을 노래하는 것은 기만이며 더 나아가 야만이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도 수많은 파국들이 상흔을 남겼다. 김수영은 이러한 파국 앞에 절망을 노래하거나 근거 없는 긍정의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그는 눈물 없이 애도한다. 그의 반성적 사고는 그의 윤리적 자세에서 가능하다. 그의 자세에 철학자 김상환의 <시와 교량술>을 참고하여 ‘교량적 태도’하고 명명하고자 한다.
그의 시 「현대식 교량」은 앞서 언급한 교량적 태도가 잘 드러나는 시이다. 서로 다른, 거리를 두고 있는 두 대상은 다리로 이어져 고유성을 유지하며 구축된 다리를 통해 소통의 가능성을 연다. 시에 등장하는 다리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축조된 것이며 현재에도 이용되고 있다. 과거세대로 대표되는 화자는 미래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와 만난다. 그들은 화자와 20년의 거리를 두지만 화자는 서로의 간극을 소급한다. 현재는 과거의 미래적 도착이다. 과거의 역사성에 현재를 함몰시키며 미래를 예감하는 일방적인 사고가 아니라 과거와 분절된 현대적 사고에 다리를 놓으며 미래의 연대의식을 예감하는 것이다.
그의 ‘교량적 태도’는 시인과 생활인으로서 김수영을 연결시키며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공자의 생활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와 같은 시에서 생활인으로서의 지리멸렬함과 비루함이 거침없이 시로 형상화된다. 하지만 이런 삶이 시일 수 있는 이유는 사유의 치열함에서 기인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어 자신의 시작(詩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메타적으로 사유한다. 이런 긴장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교량’을 만든다.
그는 시 쓰기에 대해 머리로, 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 즉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온몸이라는 것은 그의 정신과 세계 그리고 도래할 미래와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일괄한다. 온몸으로 헌신하여 쓰되 진실이 남아 치열한 사유로 쓰여진 시들은 시의성에 무관하게 김수영의 정신으로 빛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