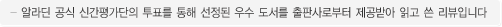[디너]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디너]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디너 ㅣ 매드 픽션 클럽
헤르만 코흐 지음, 강명순 옮김 / 은행나무 / 2012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예전에 '고려장'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도 많네요). 아직까지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가 유지되고 있는 사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유태인 학살이나 일본의 위안부 학대 같은 것들을 떠올려도 괜찮겠네요. 이것들이 모두 인간 사회에 있었던, 또는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기에는 말이죠.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경험한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우리 상상력은 아무리 뛰어나도 현실을 뛰어 넘을 수 없는 것처럼요. '지금'을 살면서 스스로 갖고 있는 상식이나 도덕 따위가 얼마나 상대적인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가끔 난 그 애의 그런 여유 있는 태도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져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 너무 초연하거든요. (...) 어떻게 해야 미헬의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애한테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293쪽
인간의 본성은 선(善)일까요, 악(惡)일까요? 세상을 보면 '악'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악'과 '선'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으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은 사회화나 교육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일까요?
<디너>는 인간의 '악'과 '선', 그 경계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디너>가 보여주는 섬세한 통찰에 대해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을 보신 분? 봤다면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단연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인공(임수정)이 세상의 갖가지에 불만을 늘어 놓는 장면이요.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생각하지 않았을 종류의 것들에 대해 여주인공은 사사건건 불만을 터뜨립니다. 예, 저는 이 소설에서 그 여주인공을 발견했어요. 아주 예민하게 상황을 바라 보는 주인공. 영화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섬세하게 분석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군' 하고 다시 한 번 읽은 부분이 한 두 곳이 아니랍니다.
사람들은 면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면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4쪽
그런 면에서 토네이도, 허리케인, 쓰나미 등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우리에게 상당히 큰 위안을 준다. 맞다. 그건 아주 끔찍한 현상이다. 우리 모두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불행과 폭력이 없는 세상은 - 자연의 폭력이든 인간의 폭력이든 상관없이 -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이다. -218쪽
심지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주인공의 묘사가 아주 실감났습니다. 사람은 때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만큼 희한한 생각에 압사 당할 것 같은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공감하지 못하시려나? 전 공감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광년(光年)이라는 개념은 생각할수록 무시무시했다. (...) 난 아주 멀리 떨어진 전망대 같은 곳에 서서 하나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려 애썼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심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227~228쪽
이런 강력한 흡입력으로 독자를 절정에 몰아 넣는 솜씨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책을 이틀만에 다 읽고야 말았거든요.(원래 저는 그리 빨리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진지한 얘기를 해야겠군요. 이 '절정'이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얄궂게도, 중요한 장치들은 이야기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씩 터져 나왔습니다. 주인공의 상태, 아들과의 관계, 아내의 솔직한 심정, 사건들. 때문에 책을 읽어 내리기는 쉬웠으나 질문은 아주 많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수직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플러스(+)영역과 마이너스(-)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0입니다. 그런데 어디부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를 따질 때 아주 곤란해집니다. 인간 세상은 수학이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저건 마이너스야!'라고 인정해도 당사자는 '이것까지는 플러스로 쳐줘야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론 가장 친한 친구와도 이 경계를 따지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겨요.(아주 흔한 일이기도 하죠)
파울은 살인이나 타인에 대한 피해 보다 아들의 논리 정연함이나 우리 가족의 행복이 우선하는 인물입니다. 아들이 쓴 '사형제도'에 관한 에세이를 봐줄 때가 그렇고요, 공놀이를 하다가 어느 가게의 유리를 깨뜨렸을 때도 파울의 대응 방법은 좀 불쾌합니다. 내 아들의 논리가 옳고 내 아들이 받는 꾸지람이 싫거든요.
상식적이지 않다고요? 물론 불편하긴 하죠. 좀 과장된 사례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오류기도 합니다. 나의 행복과 내 자식이 그토록 소중한 부모가 타인의 행복과 타인의 삶을 무시하는 것, 흔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길거리나 어느 음식점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벌어집니다. 이런 오류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혼돈해선 안 될 겁니다. 수직선을 초월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그 가치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줄 때 주인공이 바라 마지 않았던 행복, 그것도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파울 가족이 그 후 정말 행복했느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프랑스와 관계된 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부류였다. (...) 그러면서도 정작 도르도뉴에 사는 프랑스인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을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79쪽
그 영화의 감독은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여자랑 한 치도 다를 게 없어. 사실 시드니 포에티어는 일종의 본보기 기능을 한 거야. 그는 다른 불쾌한 흑인들, 도둑이나 조폭, 마약 운반책 같은 위험한 흑인들을 대신해 본보기로 이용당한 거지. 너희들도 시드니 포에티어처럼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모범적인 사윗감처럼 행동하면 우리 백인들은 분명 니들을 품에 안아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