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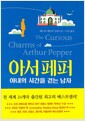
-
아서 페퍼 - 아내의 시간을 걷는 남자
패드라 패트릭 지음, 이진 옮김 / 다산책방 / 2017년 12월
평점 :



10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아버지가 가족의 곁을 영원히 떠난 지 만 1년쯤 지났을 무렵,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내가 아는 게 거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었다.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세상일에 대한 불만을 아버지는 오직 술로 풀어보려 했고, 술에 만취해 귀가한 날이면 여지없이 어머니에게 욕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겁에 질린 자식들이 조심스레 말리기라도 할라치면 그 불똥이 급기야 우리 형제들에게 옮겨 붙곤 했었다. 대상도 불분명한 분노를 아버지는 술과 폭력으로 풀었던 셈이다. 살면서 정신이 말짱했던 때보다 술에 취해 분간을 할 수 없었던 때가 더 많았던 아버지였으니 가족 중 누구도 곁에 가려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고민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살갑게 대화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고립과 외로움이 커질수록 아버지는 점점 더 술에 의지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술과도 멀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술과 함께 멀어진 가족과의 거리가 갑자기 좁혀지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데면데면한 관계를 이어가다가 영영 이별하고 말았다.
나는 정말로 나의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 젊은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는지, 무엇이 그렇게 아버지를 힘들게 했는지 나는 도통 아는 게 없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이런 질문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나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여기에 없다. 나는 오직 대답 없는 질문만 늘어 놓을 뿐이다.
패드라 패트릭의 소설 <아서 페퍼: 아내의 시간을 걷는 남자>를 읽는 내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평생을 함께 한 아내를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던 주인공이 자신도 까맣게 몰랐던 아내의 젊었던 시절의 과거를 따라 여행하게 된다는 설정의 이 소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각자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게 한다.
"꼭 1년 전 오늘, 그의 아내가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죽었다라는 말이 욕이라도 된다는 듯이. 아서는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증오했다. 그 말은 잔물결이 일렁이는 운하를 가르며 지나가는 보트처럼, 혹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떠다니는 비눗방울처럼 온화하게 들렸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그렇지가 않았다." (p.10)
곧 일흔 살이 되는 주인공 아서는 그의 아내 미리엄이 살아 있었을 때 행동했던 것처럼 7시 30분에 침대에서 일어나고,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면도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정각 8시에 토스트 한 쪽과 마가린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한 다음, 널찍한 소나무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친 8시 30분이면 설거지를 하고 부엌 조리대 상판을 손바닥으로 쓸어낸 다음 레몬향이 나는 물티슈 두 장으로 닦는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아서에게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아들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딸이 한 명 있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서 생활한다. 독립을 한 자식들은 혼자가 된 아서에게도 무관심하다.
어느 날 아서는 아내가 쓰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는다. 아내를 잊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아서는 아내의 옷장에서 못 보던 참(charm) 팔찌 하나를 발견한다. 여덟 개의 참이 묵직하고 화려한 금팔찌로부터 그림책에 나오는 태양처럼 뻗어 나가며 달려 있었다. 코끼리, 꽃, 책, 팔레트, 호랑이, 골무, 하트, 그리고 반지.
단 한번도 영국을 벗어난 적 없었던 아서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모험을 떠나게 된다. 모험을 통해 아서는 여행이라고는 자신과 근교에 다녀온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의 아내는 그들이 사는 영국이 아닌, 인도와 파리에서도 살았었고, 유명한 소설가와의 친분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 누드모델이 되기도 했었던 사실을 알게 된다. 심지어 자신이 미리엄의 첫사랑이려니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아내의 연인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고, 절친했던 단짝 친구와도 멀어지는 바람에 그 친구는 미리엄을 여전히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아서는 자신도 몰랐던 아내의 여러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된 후 놀라고 당황하는 한편 배신감도 느끼는 듯했다.
"아서는 새벽 2시까지 아내가 소니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다. 마지막으로 미리엄이 소니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처음 밝힌 첫 번째 편지를 한 번 더 읽었다. 그러고는 편지들을 차례로 조그맣게 찢었다. 다음 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종잇조각들을 쓸어 모아 손수건으로 싸놓았다. 그는 그의 아내를 잘 알았다. 두 사람은 40년 넘는 세월을 함께했다. 이제 그녀를 놓아줘야 할 때였다." (p.398)
아내의 과거를 따라 모험을 떠났던 아서는 모험을 통해 그의 아내 미리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모험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프랑수아 를로르가 쓴 <꾸뻬 씨의 행복 여행>을 읽었을 때처럼 마음이 푸근해지는 소설이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로 상대방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듯 행동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영영 우리 곁을 떠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게 그닥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의 상실감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의 크기와 비례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나의 아버지에 대한 애증이 깊은 까닭도 그런 이유가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