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빈리 일기
박용하 지음 / 사문난적 / 2010년 4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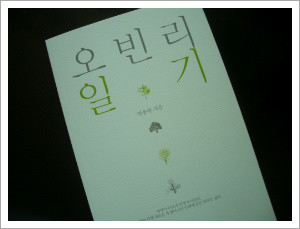
자연을 벗삼아 전원생활을 꿈꾸며 미련 없이 시골로 내려가거나 도시살이가 여의치 않아 역으로 귀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생각만큼 그리 낭만적이지도 녹록치도 않단다. 마을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현지인들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전원생활자체를 포기하고 되돌아 오는 경우도 종종 본다. 이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들은 시골인심이 예전같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농사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푸념이다. 이 글의 작가이자 시인 김용하, 그이도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이주했으나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사람사는 곳에서 사람과 부딪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라 인심도 좋지 않고 배타적인 그곳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다 급기야는 두손 들고 우여곡절 끝에 오빈리에 터를 잡았다. 이름도 생소한 오빈리에서의 일상을 기록한 그의 일기를 모아 엮은 글이 바로'오빈리의 일기'이다.
여느 시골처럼 오빈리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나이지긋하신 어르신들뿐이기에 환갑을 넘긴 이웃집 어르신이 먼저 통성명하자며 선뜻 손을 내미셨고 놀리고 있던 묵정밭을 선듯 내어 놓으신다. 함께 일하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신뢰가 쌓이고 술 한 잔에 정담과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다. 욕심 없는 노파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환해지고 어르신들과 스스럼없이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노래 한자락 목청껏 부르며 그는 그렇게 오빈리 사람이 되었다.
오빈리의 사계
오빈리에 봄은 꽃소식과 함께 한다. 시인은 집 뜰에 꽃나무 심고 나무들이 피우는 꽃들을 감상하며 꽂에 취하고 밭 일궈 고추, 호박, 참외, 오이, 옥수수, 토마토, 시금치 등을 심어 풀 뽑고 거름 주며 영글어 가는 열매에 땀을 흘려 흙과 함께하는 노동의 즐거움을 배우게 되었다. 비가오면 비가오는 대로 비 한 방울의 의미를 생각하며, 바람과 햇빛의 고마움과 자연의 신비한 치유력을 온몸으로 느끼며 근심과 비판적인 마음도 얼마간 정화된다. 오빈리 들판은 늘 같은적이 없다. 산책하면서, 밭일을 하면서 바라본 들녘은 계절마다 빛을 달리하고 봄꽃들의 향연에 왜이리 이쁜 것들 천지냐고 올라오는 새싹에도 피는 꽃들에도 기뻐하고 이뻐하는 시인의 마음이 넉넉하다.
텃밭의 오이와 호박은 아침 저녁이 다르게 굵어가는 여름, 눈앞이 신비고 발 밑이 신비라고 시인은 말한다. 주의에 온통 신비 아닌게 없으니 굳이 멀리 가서 구할 필요가 없다며 감탄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땀흘려 일한뒤 추수의 기쁨에 들뜬 영락없는 촌부의 마음이 느껴진다.
오빈리 들판의 가을이 성큼 다가온다. 벼들도 익어가고 맑고 높고 푸른 가을날, 뜨거운 해가 물러난 후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맛본다. 가을빛 곱게물든 하늘에 감동하고 지나온 모든 것들이 경이롭고 지나쳐버린 것들을 아수워한다.
기골이 장대하던 은행나무도 자연 앞에선 어쩌지 못하는가 보다. 황금빛 절정이더니 추위로 잎이 무녀지고 삶의 그 어떤 화려하고 빛나는 형식일지라도 조용히 눈 내리는 밤보다는 나중의 일이다라고 조용히 말한다.
일기 곳곳에는 시인의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아마도 일기이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음을 시인도 갓출수 없었나 보다. 시골생활의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 뒤편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만큼 절박함이 베어있다. 화에 시달리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심을 다스리지 못해 떨쳐내려 해도 괴롭히는 생각들, 마음의 상처, 거짓말과 속임수와 타락한 세상에 대한 울분을, 주인행세를 못하며 노동력이나 제공하는 노예처럼 살아가는지사람들, 괴로움 속에 무기력하게 지나가버리는 날을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한다.
“일기가 사적인 글이라고 생각하면 순진한 생각이다. 일기처럼 정치적인 글도 없다. 모든 글은 정치적이고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다. 정치적이지 않고 사회적이지 않은 글쓰기란 게 가능할까.”
시인의 말처럼 시인의 일기를 읽으며 일기가 사적임을 넘어서 정치적일 수 밖에 없는지 그 연유를 알것 같다. 그의 일기는 자신의 이야기인 동시에 세상으로 부터 도망쳐 아무리 숨으려해도 숨을 수없고 술에 취해도 잊혀지지 않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모순과 썩어버린 정치, 경제, 교육에 관한 분노이며 탄식이다. 책상 앞이 그가 있어야 할 곳이며, 투쟁할 곳이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해 글을 써 보지만 한 줄도 쓸 수 없는 날이 더 많다.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끓어오르는 화를 다스리지 못해 괴로움의 날들을 보낸 시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다짐을 한다. '내 앞에는 내가 가보지 못한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인간을 용서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시인의 말처럼 그 길은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리라. 비록 힘들고 가시밭 투성이라 할지라도 피흘리며 가야할 양심의 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