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악스트 Axt 2025.3.4 - no.59 ㅣ 악스트 Axt
악스트 편집부 지음 / 은행나무 / 2025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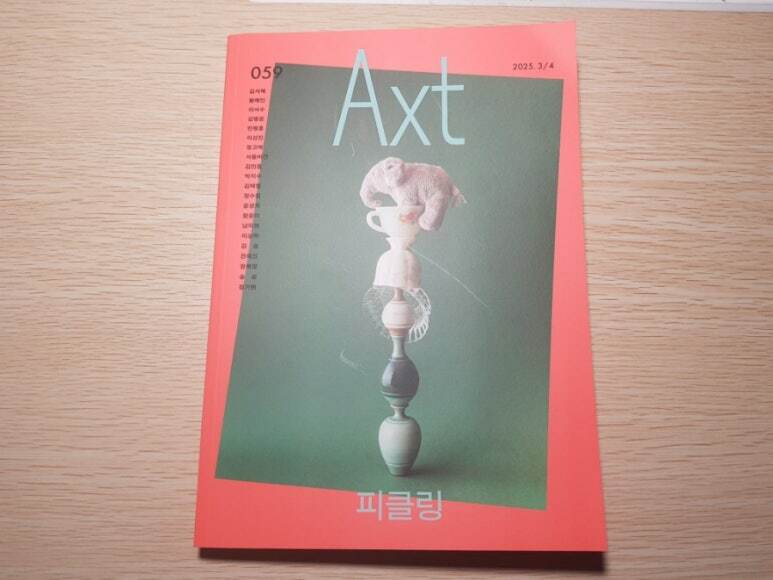
문학잡지 <악스트> 59호의 키워드는 '피클링'이다.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단어인 '피클링'은 말 그대로 '피클 만들기'라는 뜻이다. '저소비 코어'를 이끌고 있는 잘파 세대가 배달 음식 소비를 줄이고자 보관 기간이 긴 절임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유행하며 알려진 말이다. 무언가를 켜켜이 담아 오래 보관한다는 점에서, 피클과 같은 절임 음식은 문학과 비슷하다. 채소와 과일을 절여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려는 마음은, 책이라는 물성 안에 우리의 기억, 사회, 역사를 보존하려는 마음과 닮아 있을 것이다.
<악스트> 59호에서 이서수 작가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 눈길을 끈다. 특히, 이 책에서 이서수의 순간들을 담은 사진과 글이 흥미롭다. 이서수 작가는 외출 시에 필수로 '딴짓 노트'를 들고 다니며 엉뚱하지만 즐거운 딴짓을 기록하고, 단 한 가지만 영원히 저장(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뽀시래기 시절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반료묘의 유지를 저장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이서수 작가가 소설을 쓸 때 감정적 경험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글이 인상적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되는 감정이 살아가면서 얻는 소중한 자산인 것 같아요. 물질적 자산을 축적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을 쓰다 보면 그런 감정적 경험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많은데, 그것이 소설을 쓰는 재미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뒤늦게 얻는 깨달음도 있어서 그런 방식의 작업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여기에 더해 <악스트> 59호 이서수 작가 인터뷰에서 이서수 작가는 <몸과 고백들>이라는 2023년에 출간된 네 편의 중단편이 실린 연작 소설집에서 "누군가에게 고백은 가장 큰 연대의 방식일 수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작가의 말을 남겼다. 이처럼 연대와 고백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이서수 작가의 글에 깊이 공감한다.
"연대하기 위해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백이 일어나면 연대의 마음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고백만큼 용기 있는 행위도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어떤 이의 경험과 생각과 감정에 대해 말하고 듣는 것뿐임에도 청자와 화자 모두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고, 어느 순간엔 타자와 일체되는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연대와 연결 지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악스트> 59에서 비건 인플루언서 '정고메'가 쓴 '수고로움으로 절여지는 소중한 것들'이라는 글이 흥미롭다. 또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간 때문에 고통받는 동물을 먹지 않고, 지구 환경에 덜 해를 끼치며 살아가고 싶은 삶, 그것은 나 스스로를 잃지 않고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하는 정고메의 글이 눈길을 끈다.
"어쩌면 나는 나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수고로움이라는 절임 물에 나를 담가두려는지도 모른다. 무언가를 지키고 보존하려면 절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들은 신맛과 짠맛, 단맛에 부딪히며 비로소 균형을 찾는다. '나'라는 유리병에 어떤 피클을 담글 것인지 고려하며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따금 비건 외식에서 마주하는 고뇌들도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된다."
이 밖에도 <악스트> 59호에서 '이 시점에 문필로 일억을 벌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라는 정수읠 작가의 소설이 인상적이다. 이 소설은 희곡을 쓰던 '너'가 우연히 후배를 통해 웹소설 작가의 길로 향하게 되고, 계속되는 실패를 마주하던 '너'가 작가 '고정읽'을 만나면서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담아내어 깊은 여운을 남긴다.
"너는 너의 결핍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모른다. 정확하지 않은 충동이 너의 내면에서 일렁이는 걸 느낄 뿐이다. 얼크러진 머릿속이 뒤집혀 은이 네게 처음으로 선물한 책의 구적이 떠오른다. "불의가 행해지는 도시에서는 소요가 일어야 하고, 소요가 없는 곳이라면, 그런 도시는 차라리 망하는 편이 나아요, 밤이 오기 전에 불멸을 맞아야 해!" 수긍할 만한 의견이다. 은의 해석이 건 마법이 시효를 다하자 도시는 매혹을 잃었다. 미심쩍은 광택을 내는 연안의 화려함은 외지인들이 자아낸 것이다. 도시는 소요를 모르는 채로 진부해졌다."
"이거 그냥 서비스직인 건데, 고객님이 간지러운 데 긁어주고 쑤시는 데 주물러주는 게 핵심이라고. 독자가 기대하는 걸 기대하는 대로 해주는 거.
고정읽의 메시지는 네게 낯선 요소를 환기시켰다. 독자. 이제껏 너는 독자가 아니라 심사위원을 의식하며 써왔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 독자와 대면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너에게 독자란 먼 고장의 미인과도 같이 막연한 존재였다. 매체를 바꾸고 쓰는 내용을 바꾸었다고 독자를 만날 수 있었냐면 역시 그렇지 않다. 너의 창작물은 여전히 주목에서 벗어나 있고 너는 독자에게 인식되지 못하는 유령이었다."
"너는 승리를 통하여 실제로 누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있었다가 사라진 환희의 공백은 너의 의지를 허망하게 잠식시켰다. 고정읽이 몰고 왔던 향기는 진작 멀어졌다. 시멘트가 갈라진 마당이 봄비에 젖어 쿰쿰한 냄새만 올라왔다. 승리의 날과 마찬가지로 패배의 날에도 너는 같은 자리에 누워 작은 디스플레이를 들여다봤다. 생각이 마비되고 실감이 달아났다. 그건 예언 같은 게 아니다. 아니, 그것은 신탁이어야 한다. 믿음과 불신의 교차 속에서 너는 해소 불가능한 폐색 상태에 접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