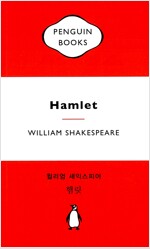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이제서야 읽었다.
마흔이 넘도록 여태 셰익스피어도 안 읽었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남들 다 좋다는 걸 나도 따라 하거나 따라가기는 싫어하는 쓸데없는 반골 기질 때문이었다고 해두자.
게다가 재미없을 것 같았다. 셰익스피어는 우리 쪽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시대쯤에 활동했다. 철학 고전도 아니고 연극 대본을 너무 옛날 시대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 자체로 가치는 있겠지만, 어디서 몇 번 본 것만 같이 고루하고 지루할 것 같았다고 할까? 그렇게 대단한 고전이라면 영화와 연극 좋아하는 내가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작품들에 셰익스피어의 흔적이 ‘클리셰‘가 되어 녹아들어 있을 것이므로.
하지만 그건 내 좁은 식견에서 나온 오해였다. 셰익스피어는 정말 읽을만했다. 아니, 너무 재미있어서 술술 잘 읽혔다. 어떤 면에서는 극장에 걸린 영화보다도 흡인력이 있다.
속고 속이고, 믿다가 배신당하고, 뱀의 혓바닥으로 현혹하는 사람과 그 앞에 내던져진 선량한 사람이 대비된다. 터무니없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오해 때문에 비극을 맞이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갈다가 결국 죽이고 죽게 되는 가운데, 갈등과 격정이 터져 폭발했다가 먼지와 같이 스러지는 이야기들. 살면서 듣거나 보거나 또는 만나게 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책을 다 읽고 내려놓은 나는 한참을 생각에 잠기게 된다. 희곡의 대사를 음미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좀 더 어렸다면 재미없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읽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펭귄클래식의 번역도 깔끔했다.
+
의문점 하나. 햄릿은 어쩌다가 우유부단함의 상징이 되었을까? 내가 보기엔 꽤나 신중하면서도 용의주도하게 자기 목적을 이룬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