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지내시나요?
님에게 받은 편지와 책 한 권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님이 주신 책이 다름 아닌 게일 콜드웰과 캐럴라인 냅 두 작가의 깊은 우정과 애도의 연대기인 <먼길로 돌아갈까?>라는 책 제목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우정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함께 하자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라는 에세이에서 박애희 작가님은 어른들의 우정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른이 되어 우정을 지키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그들을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때때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학창 시절 만난 친구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쉽게 연결될 수 있지만 사회 생활에서의 관계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로 함께 지내며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 직장이란 울타리를 떠나면 금방 잊혀지는 사이가 되죠. 어느 새 이름마저 기억이 나지 않아 이름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힘이 들곤 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 우정은 더 한 노동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을 낳은 후 서로 육아에 바빠 연결이 뜸해지는 걸 자연스레 여기곤 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조금이나마 여유가 있을 때 친구들을 떠올리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듯 한 머쓱함에 전화기의 전화 번호만 뚫어져라 쳐다보곤 합니다.
가족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에 사무칠 때, 누군가를 불러 소환하고 싶을 때 저는 윤이형 작가의 소설의 한 문장을 떠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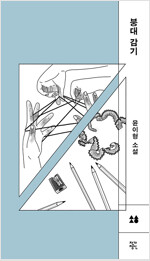
딱 한 명만 있었으면,
은정은 종종 생각했다.
친구가,
마음을 터 놓을 곳이
딱 한 군데만 있었으면
딱 한 명.
그 딱 한 명이 없기에 은정은 후회합니다.
직장생활과 아이 육아로 인해 우정이라는 적금에 적립을 해 놓지 못한 자신의 지난 세월을 안타까워하죠. 하지만 은정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시간도 아까워하죠.
어쩌면 우리는 우정이란 이름보다 경쟁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 육아 동지도 아이들간에 서로 비교 대상이 되기 쉽고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채근하기도 하니까요. 암묵적 경쟁 관계. 그러다보니 우리는 <붕대감기>의 은정과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은정에게 힘드냐고 말하지 못합니다.
함께 걸어가자고 해 주신 당신.
우리가 함께 걸어갈 우정이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 책이 떠올랐어요.

님이 제게 <먼길로 돌아갈까?>라며 우정의 손길을 펼쳤다면 저는 <우리 세계의 모든 말>의 책의 문장을 권합니다. 91년생 여성 작가들이 책을 읽으며 서로 나눈 교환 편지. 책을 통해 만난 우리에게 가장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김이슬과 하현 두 작가는 유명 작가는 아닙니다. 모든 불안정한 직업들이 그렇듯 투명한 글쓰기라는 작가의 미래는 시시때때로 이들을 흔들리게 합니다. 유명 작가가 아닌 이상 마트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며 과연 '글쓰기'를 계속 해도 되는 것일까 라는 불안감은 수시로 엄습해 옵니다.
그 불안감이 찾아올 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는 바로 두 친구들이죠. 서로에게 망했다고 하소연도 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채찍질도 하는 두 동료작가들은 서로가 붙잡아줄 것을 믿기에 때론 낙담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껏 서로를 믿고 넘어질 거라 말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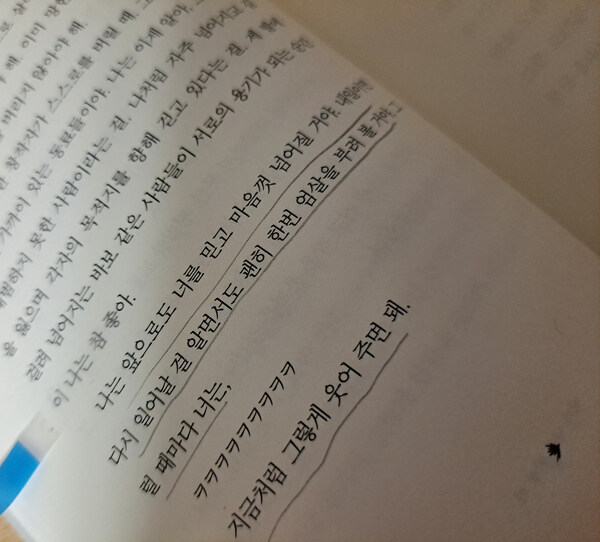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도록 먼길로 돌아갈까 묻는 게일 콜드웰의 말처럼 저는 당신에게 함께 미숙해지고 넘어지자고 말해봅니다. 서로 망했다고 하소연도 해 보며 막막함을 하소연하기도 하지만 서로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 관찰하며 붙잡아주는 관계가 되어요.
책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책을 통해 맺게 된 우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다정함과 적절한 거리감 사이에서 항금률을 찾으며 함께 단단히 붙잡기로 해요.
그리고 송길영 작가의 <시대 예보 : 호명시대>처럼 서로 깊어져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