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잃어버린 집 - 대한제국 마지막 황족의 비사
권비영 지음 / 특별한서재 / 2023년 7월
평점 :




대한제국, 그 불행한 역사 속 인물들
작가 권비영, 그의 전작 <덕혜옹주> 이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와 일본의 황족(화족) 나시모토의 장녀로 황태자비가 된 마사코, 황세손 이 구와 그의 아내 우크라이나 출신 미국인 줄리아의 삶을, 이 구의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아리사는 마사코 안에 있는 또 다른 마사코,
의민황태자 영친왕, 정상적 상황이라면 순종 황제 뒤를 이어야 할 인물이었다. 세 살 때 영친왕이란 봉호를 받았고, 1907년 황태자가, 이토히로부미의 손을 잡고 대한해협을 건너, 볼모로 일본 땅으로, 1917년 일본육사를 왔다고, 1920년 마사코(이방자)와 결혼, 1926년 순종 승하 후, 이왕의 자리에 올랐다. 1927년 5월에 일본 백작 부부 자격으로 유럽 순방을….
1940년 육군 중장에 43년 일본 제1항공군 사령관으로, 해방 후, 영친왕은 귀국을 희망했지만, 1963년에서야 반죽음 상태로 귀국, 70년에 한 많은 세상을 떴다. 이러한 큰 줄기 속에서 이 은과 마사코, 그리고 이들의 둘째아들이자 하나 뿐인 핏줄 이 구,
마사코, 영친왕과 정략결혼임은 알았지만, 남편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망국의 한, 늘 황실의 감시를 받는 처지, 창살 없는 감옥, 남편은 대한제국의 황태자로의 삶과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길러진 정체성 경계인의 삶 속에서 산다. 조국이 해방이 되든, 어쨌든 간에 불편이 끊임 없는 삶의 연속이었다.
잃어버린 집
구 만큼은 해방시켜주자는 아버지 이 은의 선택이 미국유학이었다. 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가의 길을 걸으면서 그보다 8살 연상인 줄리아와 결혼을 한다.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집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조선이 해방되는 날, 귀국했을 때, 조선여인이 아닌 일본여인과 그리고 미국여인과 결혼한 황실의 후계자들을 조선사람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적어도 종친들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강제로라도 갈라서게 할 것이다.
네 사람의 주변, 이 구의 눈에 비친 아버지와 어머니, 조선과 일본의 혼혈인 이 구, 그리고 미국인 아내, 다국적이다. 보통사람의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에 더해 그들의 생활의 밑바탕에 흐르는 황태자와 황족으로 사는 삶, 이 은과 마사코, 그리고 이들의 아들 이 구와 아내 줄리아의 미묘한 내면 갈등을 아프도록 시리도록 그리고 있다.
마사코 꿈이 나타난 아리사는 마사코의 심적 갈등을 그대로 표현해준다. 이방자 여사가 사회복지사업을 했다. 황족종친회가 어쨌다 저 쨌다. 조선은 대한제국의 519년의 역사는 이미 막을 내렸다. 1919년 대한민국은 탄생했고,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시곗바늘은 차근차근 서서히 현대로, 이승만의 의도적으로 영친왕의 귀국을 막았듯…. 망해버린 나라의 왕으로 산다는 것(신병주의 <왕으로 산다는 것>(매일경제신문사, 2023)이 어떤 한 삶이었는지, 일본 패망 후, 영친왕은 평민으로 그리고 조선인으로 호적이 바뀌고,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고, 조국의 정부는 아카사카의 그의 집을 내놓으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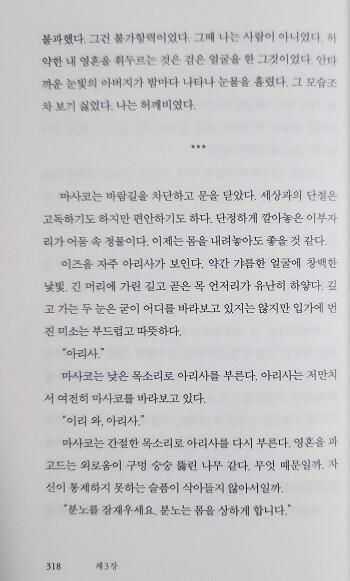
마사코는 낮은 목소리로 이리사를 부른다. 영혼을 파고드는 외로움이 구멍 숭숭 뚫린 나무 같다. 무엇 때문일까,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슬픔이 삭아들지 않아서 일까, 아리사는 마사코에게 말한다. "분노를 잠재우세요. 분노는 몸을 상하게 합니다." 조선은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마에게도 저에게도. 사는 땅이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마께서도 이미 조선인이십니다.", 마사코는 이렇게 내안 또 다른 나, 아리사와 이렇게 대화를 한다.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내 버려진 이은의 가슴은. 그래도 혼만은 잃지 않겠다며, 한국어독본을 만들기도 하는데. 복잡한 심경을 그려낸 이 소설, 지킬 수 없는 것은 조국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집마저 잃어버렸다. 마사코에게도 돌아갈 집이 없어진 것과 다름없었다. 그들에게 집은 함께 하는 이들이라는 형상 없는 마음의 집이었다.
이 구 역시 황세손이라는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이를 견디다 못해 떠나버린, 도망쳐 버린 구, 줄리아 역시, 그 틀 속에서 시어머니와의 거리감 등. 이 구와 헤어져 하와이에서 입양한 딸 은숙과 살면서, 구의 부음을 듣는다.
"줄리아가 머무는 방은 하나의 시멘트 관이다. 살아 있으되 산 것 같지 않은 몸이 머누는 현실의 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에 걸린 구의 사진을 보는 것이 큰 낙이다." 무정한 사람 어쩌자고 불러내는지... 이 가슴 아픔 대목이 이 구의 삶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든 환경들, 종친들의 잔소리도, 어머니의 차가운 눈길도... 이 구 역시 허수아비 삶이 아니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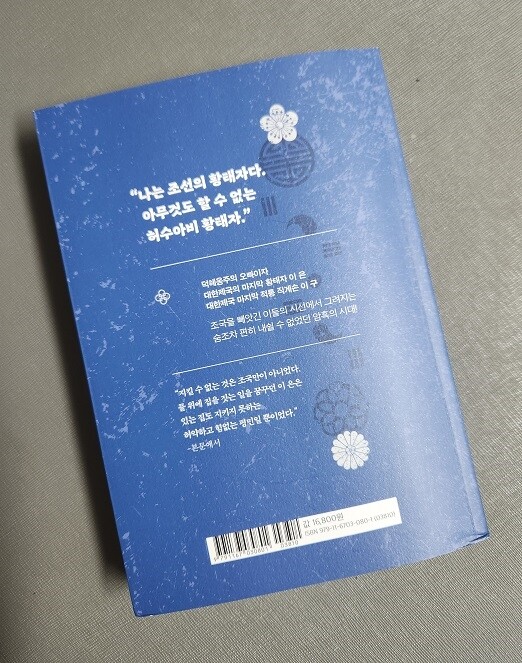
.
역사에는 가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영친왕이 해방 후, 바로 귀국했다면. 정치적 해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의 말년은 어떠했을까, 마사코, 이 구, 줄리아, 그리고 덕혜옹주는…. 상상을 해본다.
잃어버린 집, 비바람을 피하고, 지친 몸을 눕히고 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세속의 모든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 편한 그들만의 공간 그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애초부터 집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출판사에서 보내 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