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대한 사색 - 무한한 우주 속 인간의 위치
앨런 라이트먼 지음, 송근아 옮김 / 아이콤마(주) / 2022년 5월
평점 :



무한한 우주 속 인간의 존재와 그 위치
무에서 무한이란 말을 곱씹어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된 일과 아직 알아내지 못한 일의 경계는 시나브로 바뀌고 있다. 우리가 인식했든 못했든 간에 말이다. 아인슈타인의 “신비로움이야말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란 말…. 신비로움이란 뭔가 두렵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와 또 다른 미지의 세계 사이의 경계선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본다. 지은이는 매슬로의 인간 욕구 위계 마지막 단계에 상상의 욕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주는 어디서 시작됐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사치인 동시 인간의 필요적 욕구이기도 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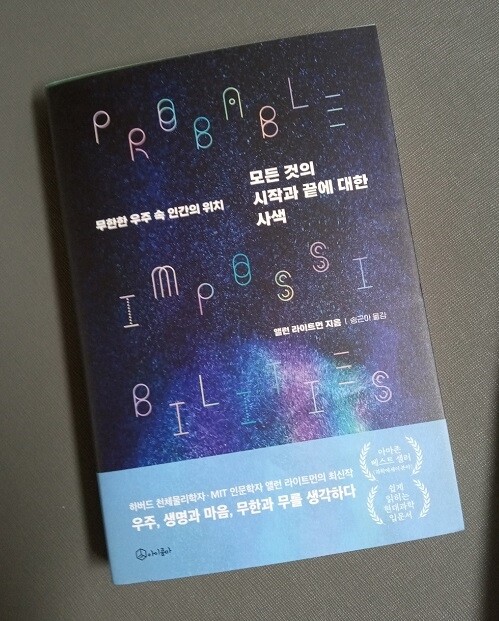
무에 관해서
셰익스피어의 소설 리어왕은 그의 딸 코델리아에게 ‘무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무다’(57쪽), 또한 파스칼은 ‘인간은 그를 탄생시킨 무와 그를 삼킨 무한을 목격하기에는 부족한 존재라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절대정지 상태를 없애버림으로써 발광성 에테르가 불필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라고, 그렇게 에테르의 존재를 없애버린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텅 비어 있는 공간으로 남겨놓았다. 이후 다른 물리학자들이 다시 그곳에 양자 에너지장으로 채워 넣었다. 하지만 양자 에너지장은 정적인 물질이 아니므로 절대정지의 기준틀이 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살아남은 것이다(6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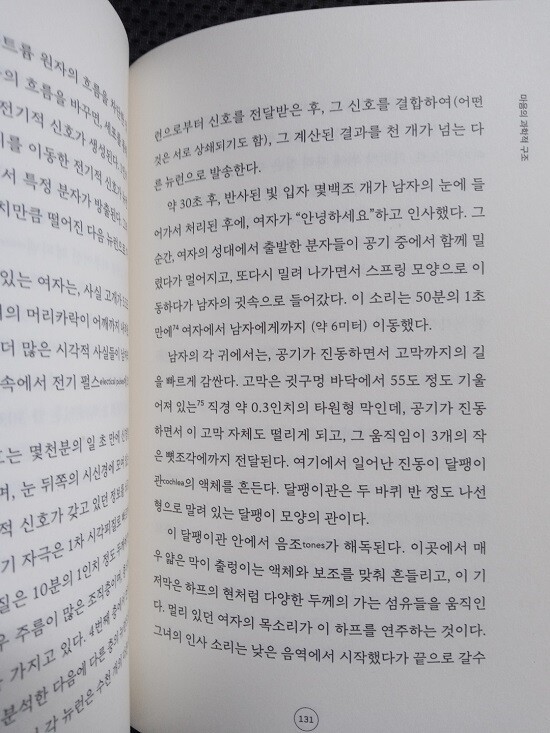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무소유의 ’법정‘?
영화 <매트릭스>는 영화 속 인물들이 경험했던 모든 현실이 실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에 실행시켜 놓은 가짜 영화이자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현실은 황폐하고 삭막한 세상이었으며, 그곳에서 인간은 혼수상태로 유선형의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생명 에너지를 빼앗기며 기계들에 동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의식, 무언가 강렬하게 감탄하며 의식한 경험은 물질세계 너머에서 발생하는 그런 초월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뇌의 신경세포 내부와 그 사이에서 전기적, 화학적인 반응이 셀 수 없이 일어나 결과일 뿐, 인간이 만든 관습도, 예술고 문화 윤리강령과 법률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구조물일 뿐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결국 우리의 정신작용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정신 바깥에서는 본질적인 가치를 잃는다. 정신은 원자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며, 그 원자들은 분해되고 해체될 운명을 가졌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자신과 문화는 늘 무와 가까워지고 있다.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아는 게 도대체 뭘까, 아는 게 뭔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마치 신기루처럼 좇아가서 잡아다 싶으면 저만치 멀리 달아나버리니 말이다.
무한 속에서 인간은 찰나지간 존재할 뿐,
지은이는 슈바이처의 사상 ’생명에의 외경‘ 그는 내 삶은 살고자 하는 다른 이의 삶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삶이다. 즉, 함께 사는 하는 삶을 의미하며, 최근에 형성된 생물중심주의라는 사상의 밑바탕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치관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인간 활동이 시작됐던 고대 종교나 철학에서도 발견되기에…. 현대에 와서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호, 동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생물 중심주의 개념이 제기됐다. 케플러 위성이 지난 5년간 모은 정보에 따르면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됐다.
우리 인간이 의식하는 존재로서 비교적 짧은 순간인 ’생명의 시대’를 사는 동안 다른 생명체들과 고차원적인 무언가를 나눌 수 있으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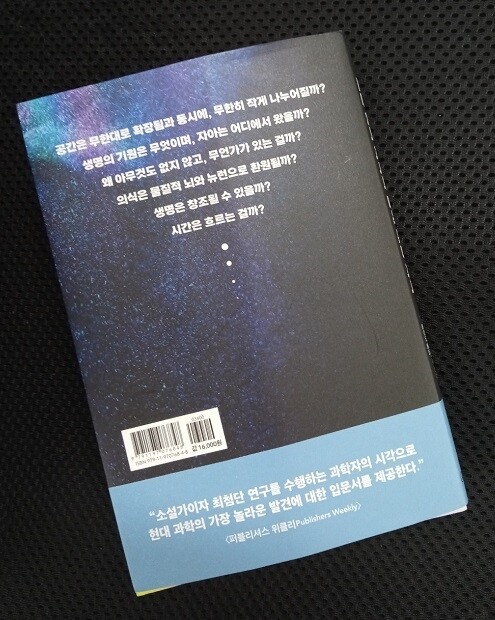
이 책은 말 그대로 소설가이자 과학자의 우주 기원에 관한 이야기다. 무와 무한을 구별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색의 여정이랄까, 파스칼로부터 시작하여 무한을 이해하는 남자 린네(구스-린네의 우주급팽창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말미에 유명한 호킹의 이중성까지 까발리면서, 우주급팽창론을 주장한 린네를 응원한다.
어디까지나 사색이다. 증거를 들이대고 논쟁하는 과학적 사고를 바탕에 둔 글이 아니기에 다소 편하지만, 뭐랄까, 그래서 뭐 어쨌다고…. 결론은 우주의 시간으로 보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억겁의 인연 중 그저 찰나지간을 살다 갈 뿐이라고,
이 책 제목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대한 사색>의 다른 표현은<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다. 현대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된다. 공(空)을 에너지로, 색(色)을 물질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색즉시공 공즉시색 8자의 한자어로 바꾼 것이어서 다소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우주 이야기를 시작해서 무와 무한을 논하지만, 실은 인간 문화는 모두 의식에서 생기는 것이기에 물질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 즉, 정신 밖은 모든 가치가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무로 수렴돼간다는 말이다. 대단히 철학적이지 않은가, 이 책을 읽는 동안 언제 어디선가 들어봄 직한 과학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이론이 나온다. 그들이 생각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아직 아는 바가 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신비롭고, 그 신비로움은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둘씩 밝혀진 원리들, 100년 전에 알지도 못했던 생명 탄생의 원리를 지금 우리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렇듯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영원불변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지적사고를 훈련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오랜만에 지적 허약함을 깨닫게 해준 책이다. 지은이가 적은 대로 이해하기보다는 행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읽는이로 하여금 꽤 고민하게 만들기도 한다.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