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는 완벽한 멕시코 딸이 아니야
에리카 산체스 지음, 허진 옮김 / 오렌지디 / 2022년 1월
평점 :



나는 완벽한 멕시코 딸이 아니다
완벽한 멕시코 딸은 대학에 가지 않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부모님과 함께 산다. 완벽한 멕시코 딸은 결코 가족을 떠나지 않는다. 주인공 훌리아 엄마는 결혼 전에는 절대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 정크푸드(햄버거 따위)를 먹어서도 안 된다. 마치, 우리 사회의 오래전 아니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지만 전통적(유교질서라 해두자) 사고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책 <나는 완벽한 멕시코 딸이 아니야>은 시카고에 사는 멕시코 이민자(미등록 외국인, 이른바 체류비자 없이 멕시코에서 몰래 미국에 들어와 사는 부모, 하지만 딸은 속지주의인 미국에서 태어났기에 미국시민이다)의 딸인 주인공 훌리아는 완벽한 멕시코 딸이 아니다. 성당에 제대로 안 나가고, 정크푸드를 먹고, 제멋대로 살면서, 엄마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진짜 무례한 백인이 되고 싶어 한다. 작가가 되겠다고 하고, 뉴욕에 있는 대학에 가겠다고, 다초점 안경에 여드름 자국, 뚱뚱한 몸, 15살이 되도록 간단한 요리 하나도 못 한다. 요즘 말로 엄마 눈에는 여성으로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물단지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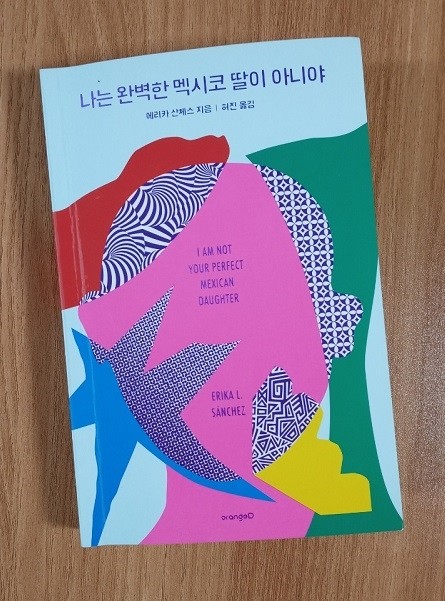
완벽한 멕시코 딸은 올가였을까?
완벽한 멕시코 딸은 훌리아의 언니, 올가다. 엄마를 도와 야무지게 집안 살림도 요리도 척척 해낸다. 이야기의 서막은 올가의 장례식이다. 시내버스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며 시카고의 가장 번잡한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어 죽었다. 올가의 죽음으로 훌리아와 엄마아빠는 충격에서 헤어나질 못한다….
훌리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 친하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언니. 그렇지만 가까운 존재의 죽음으로 훌리아는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학교생활 그렇고 우정도, 우연히 소설처럼 영화처럼 찾아온 첫사랑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언니 올가의 죽음이 자신의 탓인 것 같아 고통받던 훌리아는 언니의 흔적을 쫓는다. 뭔가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언니의 이면, 이 죽음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 말 그대로 얌전하고, 착하고, 욕심 없고 똑똑하기까지 한 아름답고 완벽한 올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나? 아빠보다 나이 많은 사람과 사랑을 하고(진짜로 그랬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감추고 인내하며 살아온 올가의 욕망, 욕구가 드러나는 뭔가 있는가)임신까지, 진짜 올가의 모습은 아무도 몰랐던 게 아닐까? 이해받지 못하고 부모님의 속을 뒤집는 사고를 쳤던 훌리아. 실제로는 가족들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지도 모른다.
이 책은 스물아홉 장으로 엮여있다. 에피소드를 하나씩 묶어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훌리아, 군데군데 촌철살인의 멘트, 페미니스트로서 인식도, 표현 하나하나가 시원스럽다고 해야 할까. 심각한 대목에서도 불쑥 뛰어나오는 코미디, 단조로울듯한데 전혀 그렇지 않은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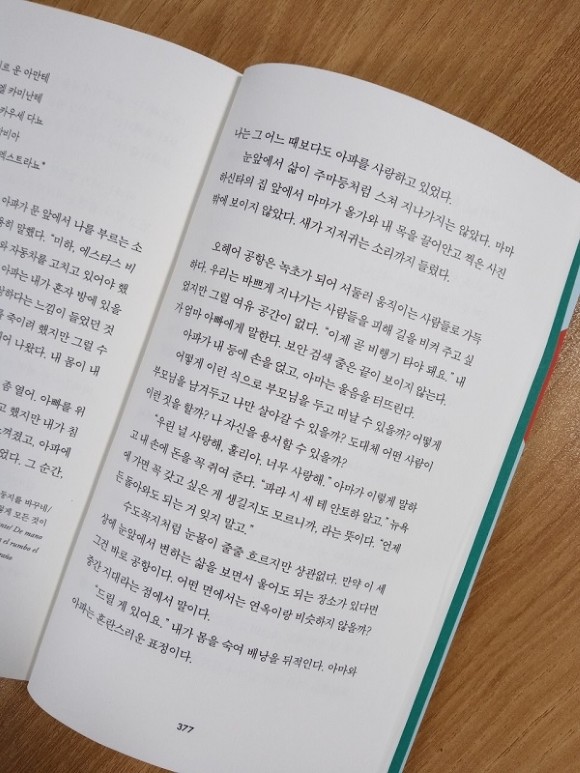
이 소설은 라틴계 이민자 가정의 딸인 청소녀 훌리아의 성장소설이다.
아마도 작가 에리카 산체스의 자전적 소설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세밀한 묘사는 마치 그 현장과 당시의 경험 등이 바탕에 깔린 듯, 미국이라는 인종의 샐러드 볼 안에서 정체성을 고집하는 부모세대와 미국 사회에서 삶을 지향하는 2세간의 마찰, 상반된 문화 속에서 나를 찾기 위한 노력, 그것이 올가형이든 훌리아형이든 어떤 형태로든 세상과도 가족과도 싸워야 했다. 뉴욕으로 떠나면서 아빠에게 다시 그림을 그리한다. 훌리아는 엄마 아빠가 이해하든 말든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그가 이루려는 것의 일부가 아닐까….
가족들과 화해, 그가 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이야기하자 잉맨 선생님은 그것을 글로 써보라고 한다. 그 글이 대학입학 지원 에세이가 됐다. 자신을 스스로 그의 안에 있던 또 다른 나와 싸움에서 이번은 승리한 듯하다. 또, 언젠가는 겨루기가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백인이 중심인 미국 사회에서 히스패닉, 라틴계 이민자 특히 경제적 이유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국경을 넘은 이들에게 직업의 선택이란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태어난 2세들은 미국시민이다. 이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법과 제도의 경계, 철조망이나 해자처럼 이것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소설이다.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미상을 11개월 연속으로, 전미문학상의 후보까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아시아계 이민, 한국계, 일본계, 중국계의 이야기도 소개되기를 기대해본다.
훌리아의 거침없는 쏟아내는 시원스러운 말, 하이킥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마지막 장면, 뉴욕을 향한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일기장에서 올가의 태아 초음파 사진을 꺼낸다. 지난번에는 심장이 뛰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내가 이것을 사랑해야 할 또 다른 존재를, 이미 죽은 또 다른 존재를 어떻게 엄마 아빠에게 줄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서. 2년 동안 언니를 이해하기 위해 언니의 삶을 뒤졌고, 그러면서 훌리아는 아름답고 추한 자신의 조각을 찾는 법을 배웠다. 어느새 한뼘 더 성장한 훌리아, 이제 둥지를 떠날 때가 된 것인가...

우리사회에도 많은 훌리아가 있지 않을까, 이 소설이 많이 이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 주변의 훌리아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기를, 응원해주시길...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