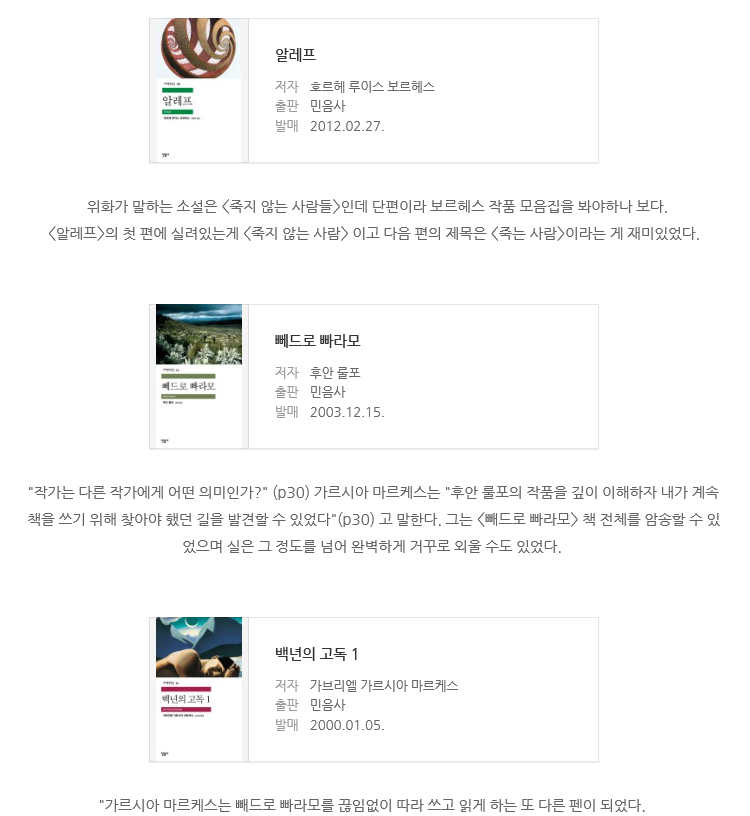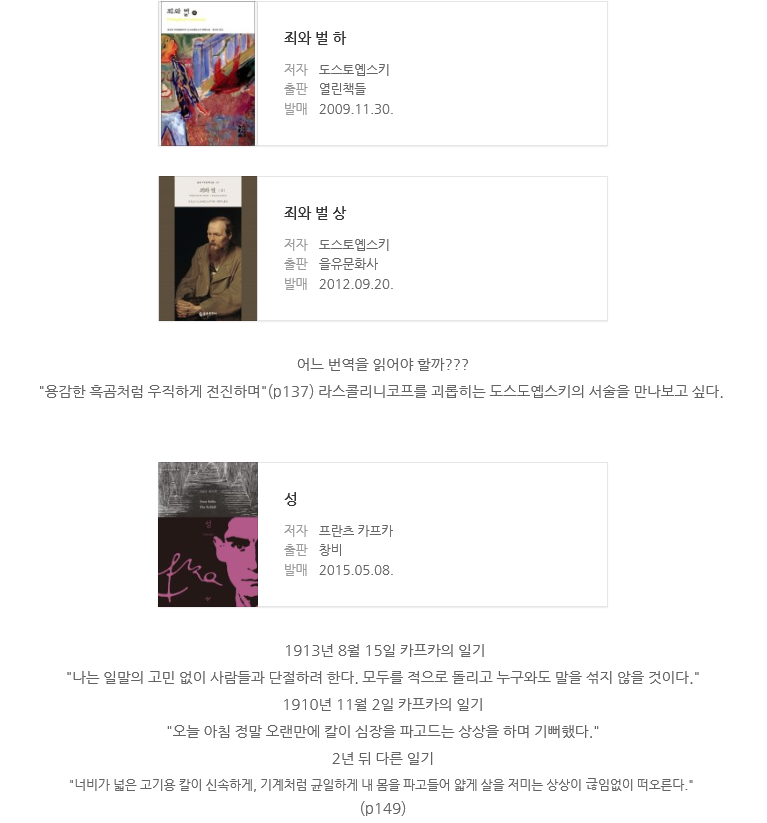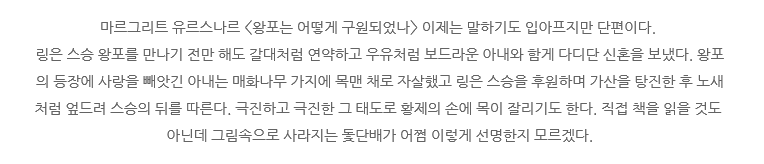-

-
문학의 선율, 음악의 서술
위화 지음, 문현선 옮김 / 푸른숲 / 2019년 9월
평점 :



처음 만나는 위화 작가의 글이 소설이 아니라 산문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그 산문을 보고 작가에게 이만큼이나 반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다.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연필로 그어놓은 줄로 가득하다.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읽고 시험 보느냐 물을 정도인데 정작 시험을 치렀으면 나는 반타작도 못했을 거다. 한번 읽은 것으로 내 머릿속에 다 담기에는 너무나 많은 작가와 더 엄청나게 많은 작품이 등장한다. 몽테뉴, 카프카, 후안 룰포, 보르헤스, 체호프, 불가코프, 가르시아 마르케스, 부르노 슐츠, 헤밍웨이, 히구치 이치요, 스탕달과 도스도옙스키, 너새니얼 호손과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까지. 그야 이런 책을 읽고 나면 자연히 책 속에 등장하는 모든 책을 읽고 싶게 마련이지만 위화의 산문을 읽으면서는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 읽는 틈틈이 인터넷 서점를 들락거리며 장바구니를 채웠다.
무슨 소설들일까? 기이한 화가 왕포가 대전에 바다를 그리자 궁궐 밑바닥에서 넘실넘실한 파도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대신들의 어깨까지 물이 차고 모두가 어안이 벙벙할 때에 황제에게 머리가 잘렸던 왕포의 제자 링이 조각배를 저으며 다가와 왕포를 태우고 그림의 바닷속으로 달아난다. / 사다리 꼭대기에 기대어 하늘과 나뭇잎, 새를 그려놓은 천장에 붙어 살았던 아버지. 그는 대머리독수리로 박제가 되었다가 바퀴벌레도 되었다가 게인지 전갈인지가 되었다가 아내의 손에 붙들려 삶아먹힐 뻔 하기도 했는데 행인지 불행인지 접시 위에 다리 한개를 두고 사라져버린다. /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콘라드 3세는 바바리아 공작을 포위한 후 그를 죽이리라 결심한다. 승리자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성 안의 부인들을 풀어주며 가져갈 수 있는만큼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내리는데 석방된 부인들이 어깨에 짊어진 것은 보석이나 금화가 아니라 남편과 자식들이었다. / 또다른 소설에서 등장한 한 아버지는 작은 배 한 척을 주문한 뒤 강에 나아가 더는 뭍에 오르지 않는다. 가족들이 모두 도시로 떠날 때에도 작은 아들은 홀로 강가에서 아버지를 기다린다. 새파랗게 무성했던 머리카락이 성성한 백발이 될 때까지. 기다림에 답하듯 마침내 아버지가 강 저 멀리서 나타났을 때 아들이 외쳤다. "아버지, 강에서 너무 오랫동안 계셨어요.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 돌아오세요. 제가 대신할게요.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요. 언제든 제가 배에 탈게요. 아버지 대신 탈게요."(p92) 그러나 웬일일까.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듣고 노를 저어오는 순간 아들은 온몸이 벌벌 떨렸다. 머리털이 곤두섰다. 그리고 미친 듯이 도망친다. 그 후로 누구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
사람을 죽이고도 침착하던 남자가 열쇠 짤랑거리는 소리에 긴장한다. 성상납을 요구한 관리를 거절했더니 온동네 사람들이 한 여자의 집안을 거부한다. 까치발을 디딘 채 손녀와 증손녀가 누운 침상으로 다가가는 할아버지는 오전 나절 손녀 사위를 낫으로 베었다. 연쇄살인범 남편을 자발적 청중으로 만든 아내는 천 하루를 넘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신비의 나라를 살아간다. 굽이 굽이 돌아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이 위화는 자신이 아끼고 감탄하고 경배하는 고전들을 이야기한다. 고전이 바다라면 위화의 책은 고전이라는 보물섬을 알려주는 지도 같다. 위화의 산문 속 보석처럼 반짝이는 찬란한 고전들과 함께 무인도에 딱 일주일만 갇혔으면, 오늘의 제일 큰 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