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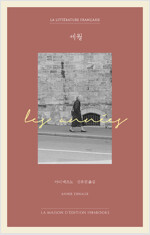
우리가 미래를 대표한다는 연설이 있었다.
- 아니 에르노, <세월> 中
어렸을 때 엄마에게 저당잡힌 빚이 하나 있다. 자그마치 빌딩 한 채를 사주겠다고 한 것이다.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리란 걸 스스로 의심하지 않은 때였다. 처음엔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시작했었는데, 큰 걸 말할수록 엄마의 표정은 더 밝아졌고 기어코 내 입에서 '엄마 빌딩 하나 사줄게'라는 말이 나온 거였다. 어린이 시절에 대한 기억은 어쩐지 거의 다 사라졌는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던 그 함박미소만큼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난다.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는다'라는 말을 그처럼 똑같이 묘사한 표정은 없었다. 그게 이렇게까지 기억할 일인가.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좋아할 일인가.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애의 아무 말 같은 건데.
그런데도 어린 나는 그때 내뱉은 그 말을 위대한 협약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겨우 과자 사먹는 돈을 아껴서는 빌딩을 못 산단 걸 깨달은 후로 초조함을 느낀 적도 있었으니 말이다. 그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한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네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뭐 사준다고 말했었는지 알아?"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쯤, 엄마가 그렇게 물었다. 짐짓 모르는 척 하며 "내가 뭐 사준다고 했는데?"라고 물으니 엄마가 피식 웃었다. "빌딩 사준다고 했어, 빌딩."
그 대답에서 어린 나와 엄마가 함께 다진 묘한 결의와 이제는 너무 커버려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서글픔이 느껴졌다면 내 착각이었을까.
아니 에르노의 문장이 뼈아프게 읽혔다.
2

이때였다. 어디서 "완서야, 완서야"하고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홍당무가 됐다. 그러나 마음 모질게 먹고 나서지 않았다. 학교에 입학하고부터 곧 이름을 일본말로 고쳐 부를 때라 '완서'가 내 이름이라고 선뜻 알 만한 아이가 없었다.
더군다나 선생님은 일본 사람이었다. 나는 어서어서 선생님이 우리들을 이끌고 어디론지 가주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할머니는 마침내 내 이름을 일본말로 부르시는 것이었다.
"보꾸엔쇼야, 보꾸엔쇼야."
그것은 아마 할머니가 입에 담으신 최초의 일본말이자 마지막 일본말이었으리라. 그러니 그 발음이 오죽했겠는가.
어린 마음에도 할머니가 부르시는 소리는 목놓아 울고 싶도록 슬프게 들렸다. 아무도 할머니의 그 괴상한 발음이 내 이름이란 걸 알아듣기 전에 나는 슬픔과 미움과 사랑이 뒤죽박죽된 견딜 수 없이 절박한 마음으로 할머니한테로 뛰어갔다.
- 박완서,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 中
박완서 작가님의 글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도 한국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하고 생각해봐도 역시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다른 작가들은 어떤가 생각했는데 한국 소설은 정말이지 읽은 게 별로 없었다. 한국 소설과 외국 소설 중 무엇을 더 즐겨 읽나, 라고 누가 물으면 고민도 하지 않고 '한국 소설은 잘 읽지 않아요.'라고 하곤 했으니 당연했다.
우리나라 문학은 '한'의 정서가 들어있다고 배웠다. 그 '한'이 뭔지도 모르면서 암기만 했던 기억이 난다. 삶이 그대로 녹아있다는 것도 그다지 마음에 안 들었다. 소설을 읽고 나면 작가에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었다.
"두 눈 뜨고 잘 보세요. 소설로 굳이 쓰지 않아도 이미 그 이야기는 현실에 있다니까요."
현실을 반영하는 게 소설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땐 현실이 녹아있는 소설 속 세상이 싫었던 것 같다. 그건 곧 현실이 싫다는 얘기기도 했다. 현실이 싫어서 외국인의 삶으로, 외국의 소설로 뛰쳐나갔을 것이다.
박완서 작가님의 위 문장들을 읽으면서 한국 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했다. 이곳에서 겪은 아픔은 이곳에서 치유해야 하는 법이라는 걸.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겪어보지 않았어도 누군가 부르는 내 이름을 못 들은 척, 속 끓이며 지나간 경험을 많은 이들이 겪었을 것이다. 너무나 덤덤한 어투인데, 특별할 것 없는 표현들인데 저 한 쪽을 읽고 비슷한 기억들이 치유받은 기분이었다. 견딜 수 없이 절박한 뒤죽박죽된 그 마음을 알 것 같았다. 마음이 아팠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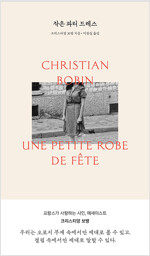
내 안으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암흑천지에 큰 태양 하나가 돌고 있었다. 만물이 죽은 땅에 옹달샘 하나가 춤추고 있었다. 그토록 가녀린 여자가 그렇게나 큰 자리를 차지하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 크리스티앙 보뱅, <작은 파티 드레스>中
I wanna love me (Ooh)
The way that you love me (Ooh)
Ooh, for all of my pretty and all of my ugly too
I'd love to see me from your point of view
I wanna trust me (Trust me)
The way that you trust me (Trust me)
Ooh, 'cause nobody ever loved me like you do
I'd love to see me from your point of view
- Ariana Grande <pov> 中
사랑뿐이다. 모든 불행을 볼 수 없도록 큰 태양이 되어 눈을 가려주는 것도, 뛰쳐나가고 싶은 구렁텅이에 흙을 메워 꽃을 심고는 그 꽃이 자라도록 옹달샘이 되어주는 것도. 나를 귀이 여겨주어서 나 스스로도 그렇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때때로 나는 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