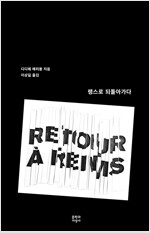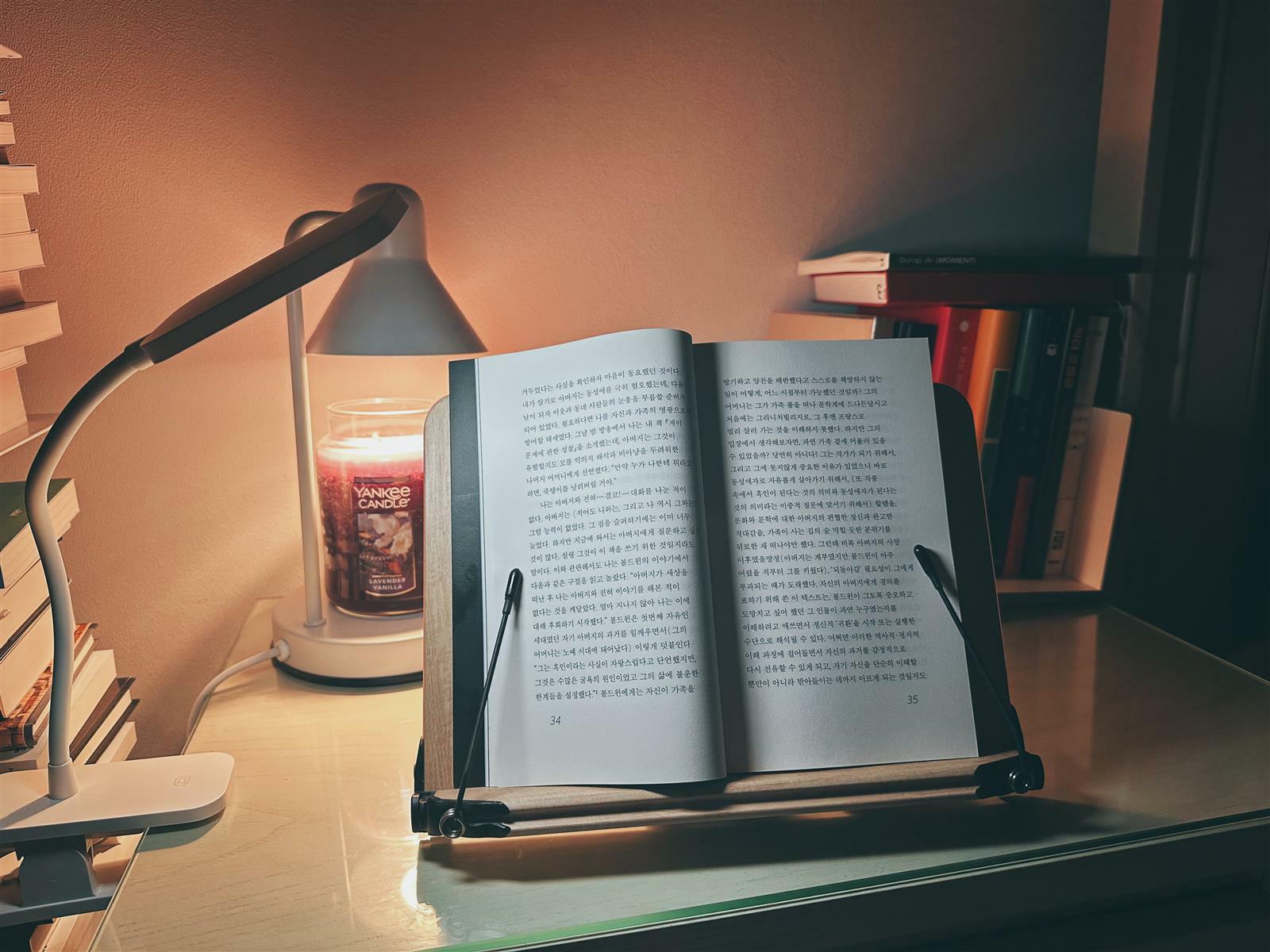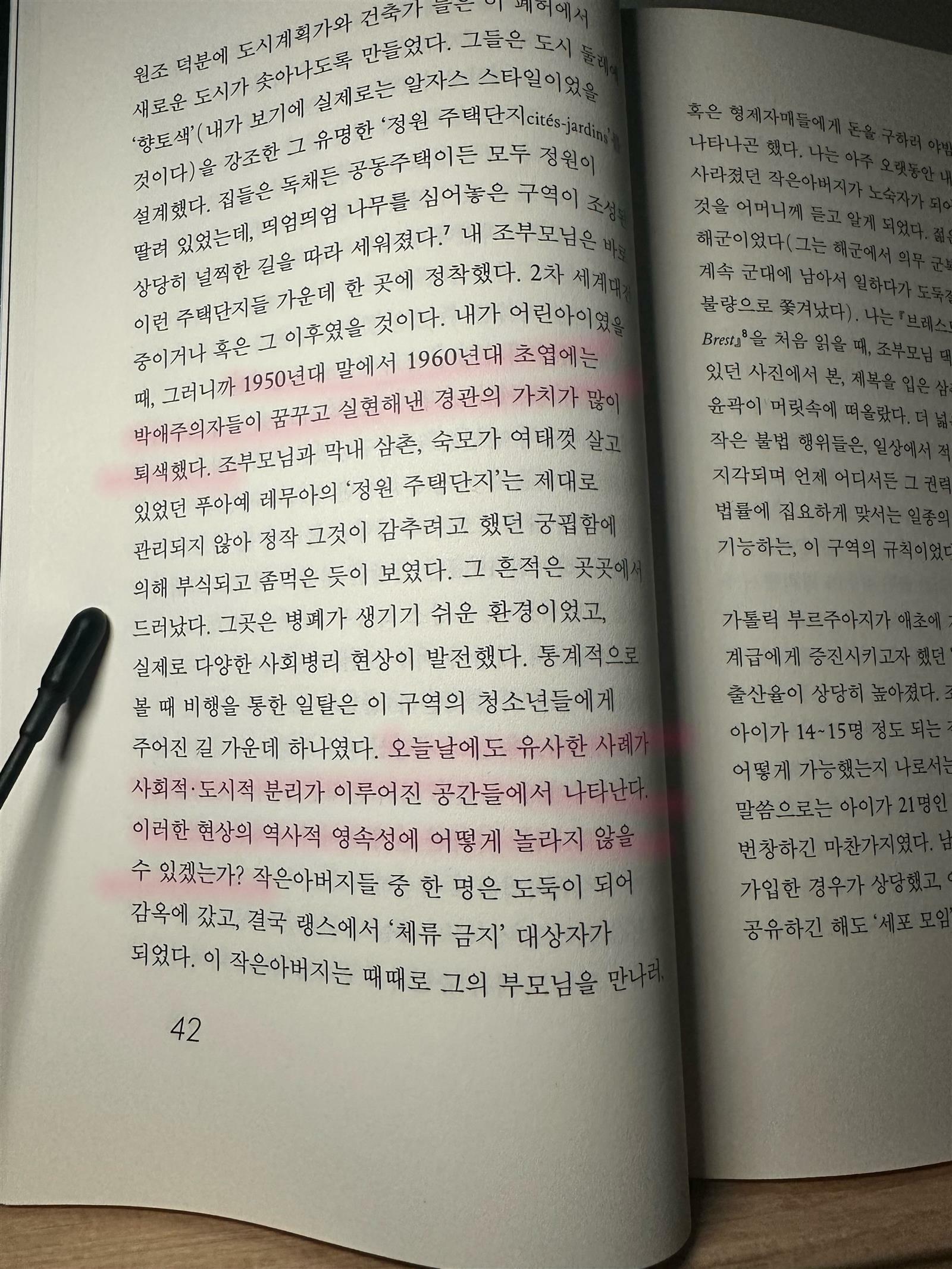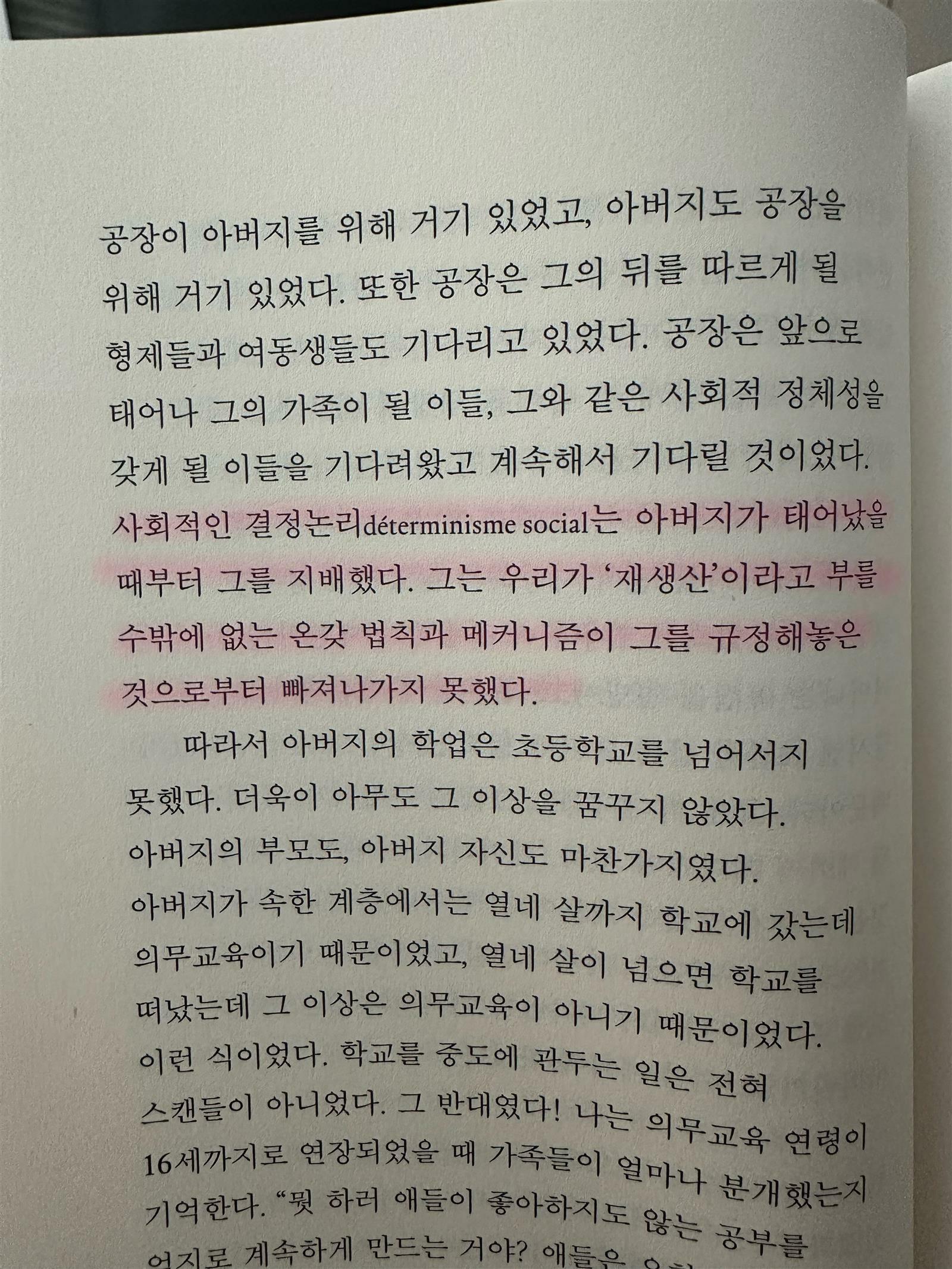<랭스로 되돌아가다>
이 책의 저자인 디디에 에리봉의 대해 내가 가진 정보는 없었지만 알라딘 홈페이지 책소개를 읽고 몇 주 전에 바로 구매를 하였다. 그에게 ’랭스‘란 현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찬 벗어나고 싶은 곳이다. 성소수자이자 노동자 계급의 집안으로써 느꼈던 수치심 등을 떠올리게 하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내 고향.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근원이 되는 곳은 결국 랭스다. 평생 가족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돌아가서 사회적 운명이라 여기며 살았어야 했던 삶 속 고통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며 깨닫고 반성하는 자기성찰도 담은 책인 것 같다.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은 날 끌리게 만든다. 가족과의 행복한 삶이 나의 가장 큰 삶의 목표이자 살아가는 이유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난 늘 ’독립‘을 갈망하고 있다. 예전부터 내 친구들은 “왜 독립을 안해?”라고 당연히 해야되는 것을 안 하는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고 답답해하며 물어볼 때 무슨 대답을 해야할지 너무 난감했다. 나는 독립을 안 하는 것일까? 못 하는 것일까...후자에 가까운 상황으로 ’가족‘이란 나를 사랑과 애정으로 품어주는 존재인 동시에 날 막힌 새장 안에 가둬두는 존재이기도 하다. 물론 그럴만한 사정은 있다. 평생 와닿지 못 할 이별로 인해 부모님 가슴에 구멍이 뚫려 그 상실감을 나누고 애정으로 채워드려야 하는 의무를 (누구도 내게 그 의무를 짊어준 건 아니다)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스스로 만들어 낸 결과이기도 하다. 아마 부모님에게는 나의 손길이 애정으로만 다가오겠지만 그 안에는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손가락 한 개, 두 개 정도는 접을 만큼의 포기에서 얻은 공허함까지 포함되어 있다. 누구도 알면 안 되는 소중한 보물을 꽁꽁 묶어 놓듯이 난 그렇게 철저하게 내 보물을 감출 줄 알았고 숨기는데 성공했다. (물론 자식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부모님이시지 않을까?)
이 책을 읽다보니 나도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해하지 못 하는, 이해하기 싫은 그 무언가들을 단순히 내가 부정적으로 단정지어 버리기에는 내가 그 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몰입하고 따라가다보면 처한 상황이 다르고 경험하지 못 한 것들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공감을 자아내게 하는 책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가 랭스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자기만의 ‘진짜’경험(살아온 집으로 돌아간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듯이)을 가진 이들이 더 ‘진짜’의 제대로 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었다. 1부를 다 읽어가는데 다음 장도 너무 궁금하다. 글을 너무 잘 쓰고 몰입도가 상당하다. 저자와 부모님 사이의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가로막혔던 그 막이 자신이 과거에 인식하지 못 한 것들을 깨닫는 자기성찰을 통해 서서히 열리게 하는 그 감정선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서 그의 여정이 너무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