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눈 뜨자마자 내 눈(眼)이 되어준 안경을, 이제야 벗고 잘 준비를 한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몸속에 있던 어떤 울음이/ 더듬이 길게 빼고 연신 어디 먼 별 쪽으로/
제 소리를 송신하고 있었던 게다/ 내 몸이 울음의 집이었던 게다/ 한 심재휘 시인의 '울음의 집'
을 읽다가 ,
그리고/ 머리는 떼어 그냥 머리맡에 놓은 채/ 달아오른 프라이팬 옆에 놓여 있어도 꿈꾸지 않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시/ 저 달걀 같은 잠을 자보고 싶다.. 처럼
나도 오늘밤은 '달걀 같은 잠'을 자고 싶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설익게 술을 마시고/ 서투르게 노래방에 들렸다가 돌아와/ 깊게 잠든...
밤이 올것인가.
유빙流氷, '흐르는 방'과 "심재휘 시인을 생각하면 소슬한 '적산가옥' 한 채가 떠오른다는"
이홍섭 시인의 말을 떠올리며, 나는 또 '달걀 같은 잠'을 기다린다.
오늘도 '그림자와 이별하다' 처럼, 전나무 숲속의 자작나무 한 그루, 같이 하루를 살았다.
내일은 아니, 다시 오늘은 또다시.. 효과 빠른 종합 감기약 같은 하루를 살 것이다. 그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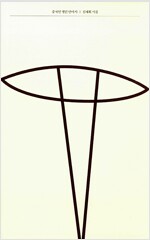
접힌 부분 펼치기 ▼
꿈도 없이
-북쪽마을에서의 일 년
밤새 오한으로 몇 개의 뼈가 차고 서럽더니
새벽쯤 되어서야 몸이 따뜻해진다
그때쯤 얼핏 꿈에 들었겠지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았구나
만화경 속처럼 피었다 지는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 날 불러 서둘러 돌아보니
머리맡 알람이 운다
빌린 잠을 잔 듯 어릉대는
어수선한 꿈 얘기는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아직 창밖은 희미하여 옛날 같은데
잠자리에 누운 채 눈을 떠보면
식지 않은 몸만 내 것인양
물위로 오롯이 떠오르고 있다
꿈속의 그 많던 사람들 물 밑 아득히
가라앉으며 멀어지고 있다
어느 먼 바람에 잔물결이 잠시 일었다 자고
끝도 없이 넓은 어둠의 수면 한가운데 모로 누워
내 검은 손 하나 오래 쳐다보는 새벽
북쪽마을의 봄나무
-북쪽마을에서의 일년
간혹 북쪽마을에까지 다다른 나무들이 있다
어느덧 그곳에서 숲을 이룬 나무들이 있다
봄이 와도 꽃을 피우지 않는 나무들이 있다
며칠 어지간히 따가운 봄볕에도
쉬 꽃을 내놓지 않는 나무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길의 끝을 묻지도 않는 나무
한 차례 더 몰아칠 눈 폭풍의 봄들을
이들은 얼마나 지나왔던 것일까
서둘러 피운 꽃들을 잃고 돌아서서
몇번이나 울었던 것일까
북쪽마을에는 오월이 와도
꽃을 피우지 않는 나무들이 있다
묽지도 않고 깊지도 않은
연둣빛 그늘에 슬픔의 뿌리를 묻고
두리번거리며 가슴속의 꽃을 매만지기만 하는 나무
얼음 평원
-북쪽마을에서의 일년
따뜻한 공중을 그는 왜 떠났을까
거미 한 마리가 자작나무 숲 속 물웅덩이의
얇고 투명한 살얼음 위를 걸어
건너편 기슭으로 가고 있다
그가 걷던 허공에도 물웅덩이가 있고
때로는 살얼음이 얼겠지 하지만 저 거미
오늘은 지상의 얼음 평원을 건너가고 있다
물의 일기를 쓰듯
가다 서고 가다가 돌아보고
깨어질 것 같지 않은 후회의 평원을 걸어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긴 두려움의 문장
저녁이 온다
더욱 밝아지는 자작나무 숲 어딘가의
이제 막 불이 들어올 집을 나와
그는 왜 아직도 얼음 평원 위를 걷고 있나
흐르느라 바쁜 물 같은 목숨들은
얼고 나서야 투명하게 제 속을 드러내지
훗날 얼음 한 조각이 녹듯
외로운 영혼이 가족들 곁을 맴돌지라도
지금은 물웅덩이를 다 건너
삐걱거리는 계단을 밟고 올라
드디어 끈끈한 저의 영토에 들기 전까지
거미에게 세상의 모든 길은 살얼음이리라
징검돌 위에서
맑은 날인데
개울물이 뜻밖에 빠르고
징검돌들은 얼굴을 가린 채 젖어 있다
상류 쪽 먼 산기슭에는 언젠가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왔겠다
종내에는 비도 그치고 세월은 흘렀겠다
한데 어찌하여 그날의 빗소리는 이곳까지 흘러왔나
눈 감은 징검돌 사이에서 왜 소리 죽여 울고 있나
지나간 어느 먼 날에
처음 발 앞에 돌을 놓으며
개울을 건너가려던 한 사람 있었겠다
마음을 점점이 떨어트리고
기어이 개울을 건너간 사람이 있었겠다
서로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징검돌 사이의 쓸쓸한 간격을 따라갈 때
어느덧 익숙한 보폭 아래로
사무치도록 투명한 물이 흘러갈 때
지울 수 없는 물의 무늬들만 흘러가지 못할 때
이런 날은 내 가슴속에도
물을 건너가던 사람 하나
자꾸 그리워지겠다
옛사랑
도마 위의 양파 반 토막이
그날의 칼날보다 무서운 빈 집을
봄날 내내 견디고 있다
그토록 맵자고 맹세하던 마음의 즙이
겹겹이 쌓인 껍질의 날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마르고 있다
중국인 맹인 안마사
상해의 변두리 시장 뒷골목에
그의 가게가 있다
하나뿐인 안마용 침상에는 가을비가
아픈 소리로 누워 있다
주렴 안쪽의 어둑한 나무 의자에 곧게 앉아
한 가닥 한 가닥
비의 상처들을 헤아리고 있는 맹인 안마사
곧 가을비도 그치는 저녁이 된다
간혹 처음 만나는 뒷골목에도
지독하도록 낯 익은 풍경이 있으니
손으로 더듬어도 잘 만져지지 않는 것들아
눈을 감아도 자꾸만 가늘어지는 것들아
숨을 쉬면 결리는 나의 늑골 어디쯤에
그의 가게가 있다
-심재휘 詩集, <중국인 맹인 안마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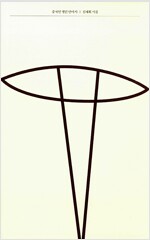

'문예중앙시선' 32권. 낭만적이고 쓸쓸한 목소리로 기억에 얽힌 시 세계를 노래해온 심재휘 시인이 7년 만에 새 시집을 묶었다. 1997년 「작가세계」 신인상으로 등단, 현대시 동인상 수상 시집 <적당히 쓸쓸하게 바람부는>과 <그늘>을 펴내며 '유년 시절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애착과 그리움을 그려냈다'는 평을 받아온 심재휘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도 특유의 소슬한 기풍이 돋보이는 시편들을 선보인다.
새 시집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장면들은 낯선 이국의 풍경들이다. 이번 시집의 절반은 시인이 캐나다에서 체류할 때 쓴 '북쪽마을' 연작시로 이루어져 있다. '참 알 수 없는 것들로만 가득한 머나먼 하늘 아래'에서 시인은 '집 없는 자의 눈처럼 좁고 깊은' 우물에 비친 풍경을 써 내려간다.
이 이국적인 풍경을 담은 시편들을 두고 해설을 쓴 이홍섭 시인은 "이국 풍경 속에서만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시인이 현재 몸담고 있는 현실과 불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 평하며 "그를 생각하면 소슬한 적산가옥 한 채가 떠오른다."라고 덧붙였다.
점령지에서 적국 사람들이 살던 집을 뜻하는 적산가옥은 숙명적으로 이중국적을 껴안은 건축물이다. 오랜만에 새 시집으로 찾아온 심재휘의 언어는 적산가옥과도 같은 이국적이고 투명한 슬픔의 정서로 빛난다.
가끔씩 내 귓속으로 돌아와
둥지를 트는 새 한 마리가 있다
귀를 빌려준 적이 없는데
제 것인 양 깃들어 울고 간다
열흘쯤을 살다가 떠난 자리에는
울음의 재들이 수북하기도 해
사나운 후회들 가져가라고 나는
먼 숲에 귀를 대고
한나절 재를 뿌리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열흘 후는
울음 떠난 둥지에 아무것도 남아 있질 않아
넓고 넓은 귓속에서 몇 나절을 나는
해변에 밀려 나온 나뭇가지처럼
마르거나 젖으며 살기도 한다
새소리는
새가 떠나고 나서야 더 잘 들리고
새가 멀리 떠나고 나서야 나도
소리 내어 울고 싶어진다
―「지저귀던 저 새는」
시인의 말
세월이 많이 지났다
모든 것이 다 한곳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슬픈 눈을 지닌 개를 데리고 걸어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미안할 따름이다
펼친 부분 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