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간은 이야기가 된다 - 시간이 만드는 기적, 그곳의 당신이라는 이야기
강세형 지음 / 김영사 / 2017년 11월
평점 :




예나
지금이나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라디오'이다. 라디오를 끼고 살던 청소년기 시절을 지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일 땐 라디오를 품지 못했지만,
다시 라디오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도 주방에서 뭔가를 하거나 책상에 앉아 일을 할 때에도 항상 라디오를 틀어놓는
'라덕'이다.
그래서 김동률, 테이,
스윗소로우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라디오작가'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난 이미 강세형 작가의 팬이었다. 그리고 예전에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라는, 강세형 작가의 첫 번째 책을 보고 인상깊었던 기억이 있다. 글을 참 덤덤하게 잘 쓰는구나, 잘 읽히는구나, 소위
'뽐'내려고 쓴 글이 아니구나 싶었다. 그런 글이 참 좋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시간은 이야기가 된다>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작가가 본 영화와 책,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적은 에세이. 원래 이런
류(?)의 책을 좋아하지 않았다. 영화나 책을 본 느낌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감동의 포인트도 다를 것인데, 과거에는 그런 '감정을
강요'하는 책이 꽤 많았기 때문에 이런 책은 피했다. 자신만이 그 감정을 느낀 것처럼 '유레카'를 연발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럴싸하게 써내려간 글들에 지쳤는지도 모르겠다.
강세형 작가의 글은 전작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기름기'를 빼서 좋다. 누가 봐도 영화를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본 사람인 '티'가 나지만, 그걸 자연스럽게 교통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고수라는 생각을 했다.
책은 영화와 책에서 느낀
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자신의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인상적인 건 고1 말까지 의대를 준비 중인 예비 이과생이었지만, 어느
순간 한 책으로 인해 문과로 오게 되고 국문학을 전공하고 라디오작가를 거쳐 전업작가가 된 과정을 거품 없이 이야기해서 흥미로웠다. 아마 나와 한
두 학번 차이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녀의 생각에 공감하는 것도 같은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은 아닐까 감히
추측해본다.
특히 작가가 인상깊은
구절이나 대사를 직접 인용한 문구들이 나에게도 큰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이런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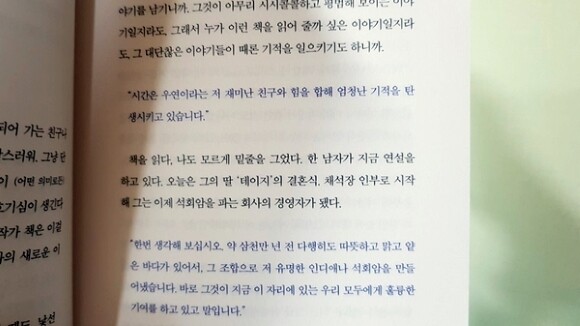
시간은 우연이라는 저
재미난 친구와 힘을 합해
엄청난 기적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거의 읽히지
않는,
분명코 큰 소리로 읽히지
않는
그런 페이지가 있기
마련이다.
사노 요코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은 언제나 부업을 더
좋아했다고.
.
(중략)
.
그러니까 본업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싶어서였다.
그 마음, 나도 너무 알
것 같았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작품들인데도
몇 개월을 취미로서의
독서는 금지당한 채
직업으로서의 독서만
계속했더니, 솔직히 나는 좀 지쳤던 것 같다.
그래서 더 기다려졌나
보다. 이 휴가가.
지금 내 마음을 들킨
것처럼 뜨끔했다. 나는 지금 본업이 무척 바쁜 시기이다. 회사 다니며 한창 밤샘했던 그 시절보다 요즘은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프리랜서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니며 미팅을 하고, 몇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다보니 책을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그럴수록 책을 더 읽고 싶었던 거다. 이 책을 읽는 이 새벽에도, '본업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잘 꼬집어낼까.
책에 나온 영화와 책을
모두 본 것은 아니기에, 작가의 글만으로 그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작가의 느낌에 따라 '보고 싶다, 보기 싫다'가
구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는 내내 '아, 이 책 보고 싶다, 이 영화 찾아봐야겠군.'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특히 홀로 있는 아이
문제를 다룬 '우리들'이라는 영화와 책에 소개된 몇 편의 일본 영화들을 꼭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고나서 느낀
점은, 감정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것과 책은 뽐내고 잘난 '척'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뜬금포일 수도 있겠지만, 글을 읽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강세형 작가가 담담하게 써내려간 겸손한(?) 글들을 보며, 스스로 내린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