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바라만 봐도 닳는 것
임강유 지음 / 읽고싶은책 / 2022년 8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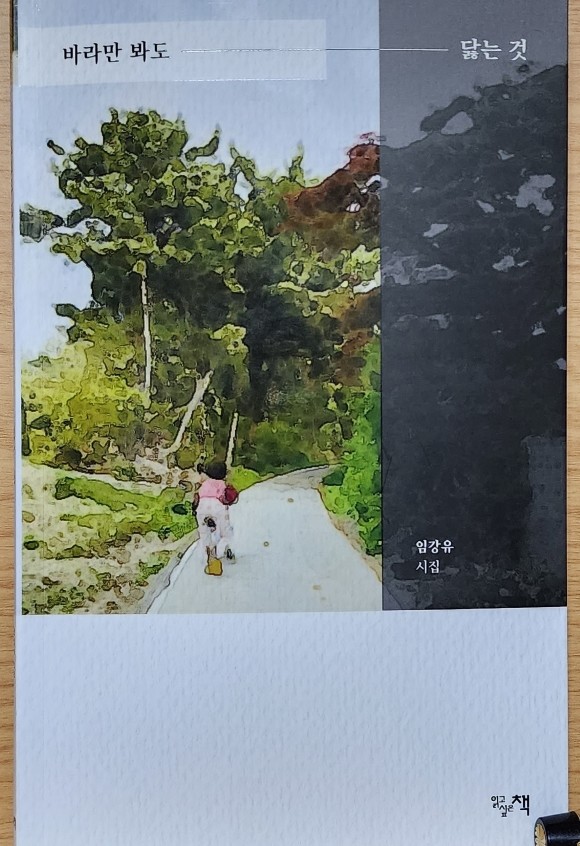
이 시집 『바라만 봐도 닳는 것』의 시(詩)들은 아스라한 기억 속에 있는, 애닯지만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낸다. 기억 속의 것들뿐만 아니라 현재도 함께하지만 늘 조금씩 닳아가는, 늙어가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슬픔을 신비로움으로 승화시키기도 한다. 시인의 시선이 멈추는 것은 주변의 가까운 것들이다.
이는 아스팔트처럼 무생물인 것도 포함되지만 할머니처럼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서도 느낀다. 그리고 시인의 감정에 일체화한다. 강아지도, 첫사랑도 시인의 눈에는 관념적이지만 아름다움으로 각인된 것들이다. 독자들은 아름다움으로 각인된 모든 것들에 대한 시인의 기억이 점점 닳아가는 것 같은 애잔함과 아름다움이 시인의 언어로 재탄생돼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도 한다.

표제작인 「바라만 봐도 닳는 것」에서 시인의 눈에는 세상 천지 그 어떤 것이든 가치를 갖는다. '인생', '세월', '시간'들이다.
시인은 노래한다. '만인에게 가장 공평한 것은 세상이란 호수처럼 흐르는 시간과도 같다.' 이 때문에 '맑은 호숫가에 몸을 맡기고 이리저리 흐르게 할지언정 흐르지 않게 할 수 없듯이' 그것들을 거스를 수는 없다.
시인의 '이마에 나이테가 하나 둘 생길 때마다 오히려 할머니는 닳는 것 같아 나이 먹기 되레 두려워진다.' 할머니가 금지옥엽 바라만 봐도 닳는 자신을 키우느라 닳아버린 허리를 보며 할머니의 고마움으로 자신도 닳아간다고 말한다.

'무언(無언)'에서 시인은 나뭇가지를 태우며 생각의 관념에 빠진다. '헤아린다 하여 헤아릴 수 있었다면 그 추운 날의 재가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나뭇가지의 소멸도 나뭇가지가 원해서라기보다 낙엽을 떨어뜨릴 때부터 이미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본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다시 필 새순을 보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더 크다. 나뭇가지는 재가 되는 선택의 기로에서조차 '누군가의 추위'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시인은 '낙엽의 희생으로 오늘이 올 수 있었다.'는 점을 깨닫는다. 시간, 세월, 인생이 어제가 가고 오늘이 오는 것처럼 순리적이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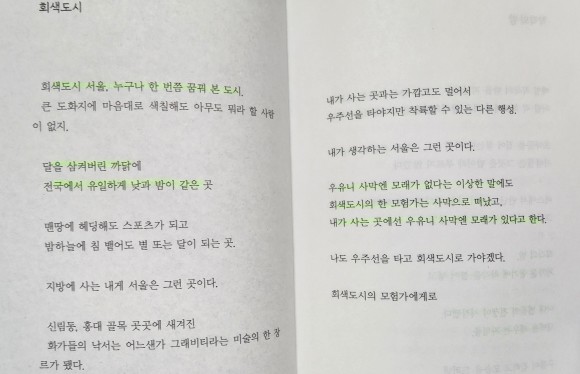
2부 〈슬픈 뒤 아픔〉의 「회색도시」에서 서울은 회색도시이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 본 도시 서울은 시인의 눈에는 '달을 삼켜버린 까닭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낮과 밤이 같은 곳'이란 표현을 한다.
지방에 사는 시인에게 서울은 그렇게 회색의 빛을 띤 채 달도 못 보고, 사람들이 뱉은 침방울 모여 별이 되고 달이 되는 그런 곳이다. 그러나 서울은 '아무리 몰라줘도 젊음의 고생을 용기로 쳐주는 섬'이다. 시인이 사는 곳과는 가깝고도 멀어서 우주선을 타야지만 착륙할 수 있는 다른 행성, 서울이다. 그래도 시인은 서울을 향한 기대를 접지 않는다.
우유니 사막엔 모래가 없다는 이상한 말에도
회색도시의 한 모험가는 사막으로 떠났고,
내가 사는 곳에선 우유니 사막엔 모래가 있다고 한다.
시인은 이래서 '우주선을 타고 회색도시로 가야겠다고 결심한다. 회색도시의 모험가에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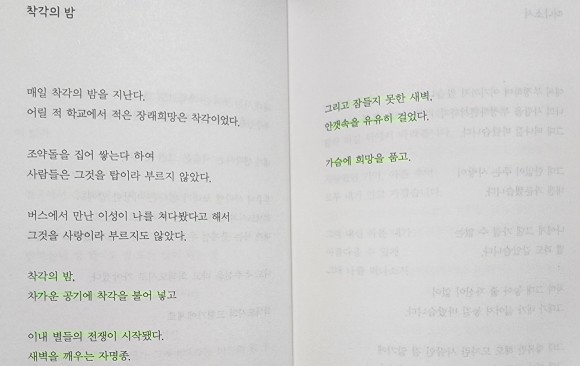
시인은 「착각의 밤」을 통해 자신의 희망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가늠한다.
'조약돌을 집어 쌓는다 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탑이라 부르지 않았다.
버스에서 만난 이성이 나를 쳐다봤다고 해서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시인은 '별들이 전쟁'을 하는 착각의 밤을 지나 '잠들지 못한 새벽, 안갯속을 유유히 걸었다. 가슴에 희망을 품고.'

시인은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위로와 격려를 준다.
힘겨운 하루를 살아간다.
이른 새벽 누군가는 무거운 법전을 들고 가방을 메고
또 누군가는 자신보다 큰 콘크리트 폼을 등에 진다.
몸이 힘들지언정 요령 피울 순 없다.
경쟁이 빈번한 사회의 한 축에는
오롯이 땀과 노력만이 성공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의 목적지가 다른 것처럼 삶의 지표와 목표도 제각각이지만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
'인생이란 책의 하루라는 한 장을 넘긴다는 것.'

사람의 감정은 물감이다. 좋게 말하면 빛이 나는 무지개일 수도 또는 불필요한 변덕일 수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시(詩)를 통해 위로를 건넨다.
아픔이 잊히도록
슬픔에 음표를 넣어 노래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슬픔과 고통은 새로운 시작의 전 단계.
사람은 언젠간 혼자가 된다. 새까만 검정처럼.
- 「저자의 말」 중에서
저자 : 임강유
1993년 6월 경기도 작은 도시 평택에서 태어났다. 죽백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평택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동일공업고등학교에 입학 후 설비과를 졸업했다. 15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꿈이 굳이 직업이 될 필요가 있을까? 자기위안 삼고 도전조차 하지 못한 20대 초반을 보내고 25살. 독립출판을 통해 작가로 데뷔하고 총 4권의 시집을 출판했다. 한 권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국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하였다. 글로 누군가에게 단 1g이라도 기쁨이 된다면 성공한 작가지 싶어요. 제 글이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가 힘이 된다면 제 글에 머물렀다 가세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