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랑스어의 실종 ㅣ 을유세계문학전집 95
아시아 제바르 지음, 장진영 옮김 / 을유문화사 / 2018년 10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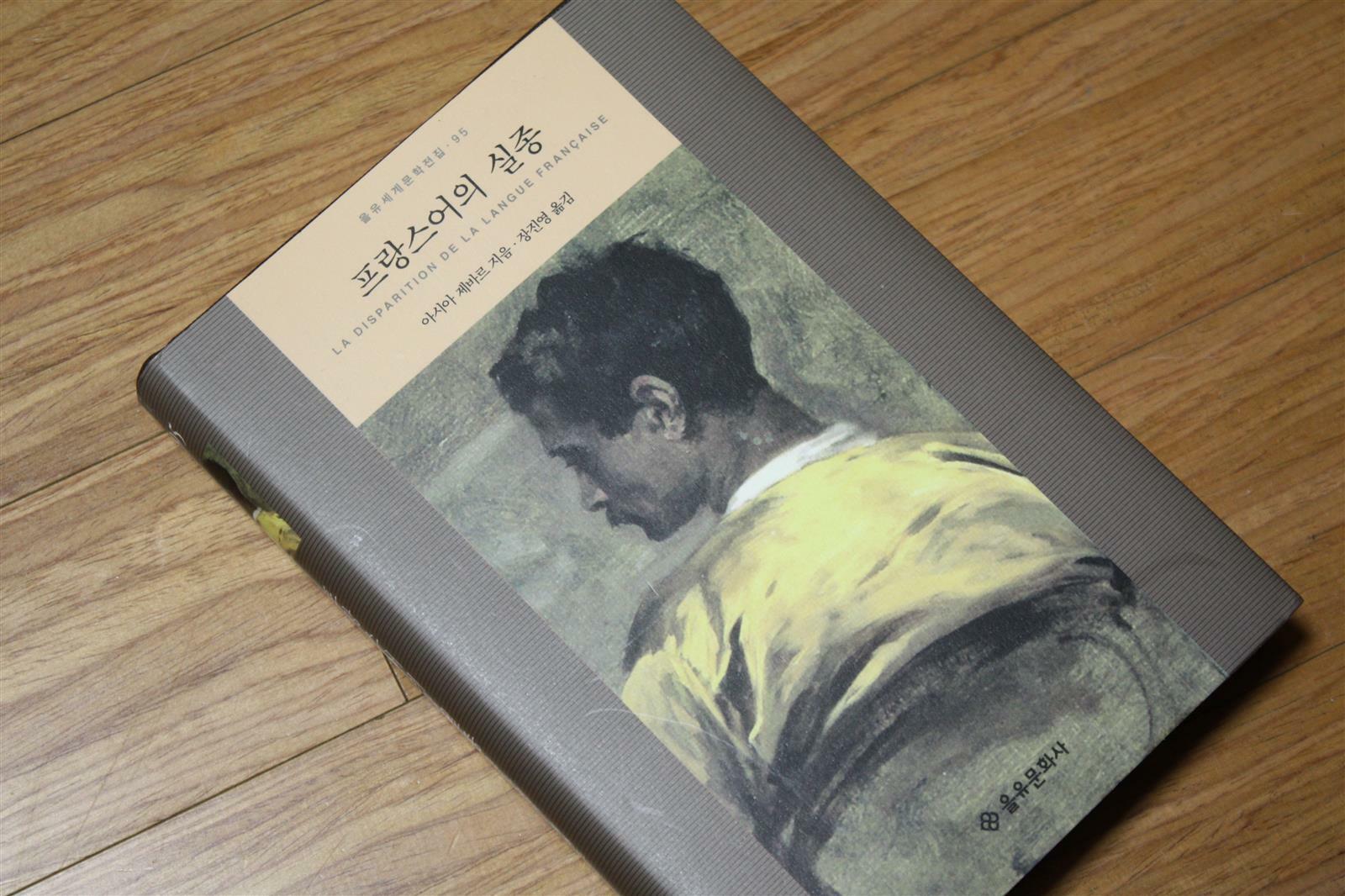
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신청해서 책을 빌렸다. 책을 채 펴보지도 못하고 결국 반납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중고책으로 구입해서 읽게 됐다. 그전에 시작한 아시아 제바르의 <사랑, 판타지아>는 절반 정도 읽었나. 그 책도 읽어야 하는데.
내가 만난 알제리 출신 프랑스 작가 아시아 제바르의 책 <프랑스어의 실종>은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설이었다. 그 중심에는 고향 카스바로 귀향한 주인공 베르칸이 있다. 한 45세 정도라고 추정하면 될까. 망명지 프랑스 파리에서 공무원으로 생활하던 베르칸은 연극 배우 애인 마리즈로부터 이별 통고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별-귀향의 수순을 따르게 된 것이다.
마리즈와 사랑을 하면서도 모국어인 아랍어를 구사할 수 없어 고통스러워 하던 남자는 발 밑의 바다와 정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엇보다 글을 쓰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땅으로 귀향한다. 귀향이라는 이미지 속에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원어민처럼 프랑스어를 구사하면서도, 사랑의 절정에 순간에 내뱉는 말들을 상대방에 전달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마리즈는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베르칸의 귀향은 합리적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저자는 독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베르칸은 마리즈에게 붙이지 못할 편지들을 쓰기 시작한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도무지 쓸 수 없었던 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니 그야말로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는 말일까. 소설 <프랑스어의 실종>은 지극히 사적인 감정과 관계로부터 출발하지만, 곧 지난 시절 알제 전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한다. 어린 시절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프랑스 학교에 다닌 베르칸은 프랑스의 삼색기 대신 알제리를 상징하는 초록빛 깃발을 그렸다가 교장 선생님에게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한다. 그리고 2차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군인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베테랑 아버지도 소환을 당한다. 프랑스의 알제리인가 아니면, 알제리의 알제리인가.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소설에서 다루는 핵심적 주제다. 대다수 피에 누아르들은 프랑스의 알제리를 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베르칸을 비롯한 대다수 알제리 민중은 알제리의 알제리를 원했다. 알제 전투가 시작된 1954년 프랑스는 지구 반대편 베트남의 디엔비엔푸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하지 않았던가. 베트남과는 또 다른 상황이었던가. 지중해 연안의 마그레브 제국과 고대 갈리아는 로마의 속주라는 역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알제리는 베트남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식민지였다. 그 속사정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무리다. 그나마 베트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파병한 적이 있고, 다양한 저술들이 소개되었지만 알제 전투에 대해서는 접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다.
소년 베르칸이 과연 알제 전투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프랑스 낙하산 부대원과 그의 맞수 알제리 민족해방전선(FLN)의 대의를 얼마나 알고서 거리로 뛰쳐 나갔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와 형이 체포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했던 소년 베르칸은 ‘정숙한 집’의 여성과 관계하고 어른이 되어 간다. 인쇄소 견습공 베르칸은 결국 프랑스 낙하산 부대원에게 포로가 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한다. 동생 드리스는 그런 형을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많이 다르지 않았던가.
아시아 제바르는 나지아라는 미스터리한 여성을 투입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든다. 방문객이었던 나지아는 베르칸과 격렬한 사랑에 빠진다. 베르칸의 옛 애인 마리즈와는전혀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다. 좀 더 원초적이었고, 모국어인 아랍어를 사용하면서 두 개체는 완전한 합일의 경지에 도달한다. 마리즈와의 사랑이 이종교배 같은 성격이었다면, 나지아와의 사랑은 완벽의 현현이었다고나 할까. 여기서 베르칸은 스스로를 늙은 오르페우스라고 불렀던가.
어쨌든 조국 알제리의 정치적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프랑스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지는 몰라도, 그 후에는 해외파와 국내파의 치열한 정쟁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뒤에는 혹독한 방식의 독재가 대기 중이었다. 늙은 오르페우스를 기다리고 있는 건, 현세의 행복이 아니라 이별과 그리운 옛 시절에 대한 향수 정도였다. 그렇게 해서 나지아는 베르칸을 떠나고, 베르칸 역시 실종된다.
<프랑스어의 실종>은 어제 감기몸살에 걸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읽어내렸다. 해설을 보면 이 소설은 페미니즘적 글을 다수 발표한 아시아 제바르의 성향과는 많이 다른 느낌의 글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남자 주인공 베르칸의 시선에서 소설이 전개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마리즈나 나지아 모두 주체적인 모습보다는 외부의 타자로 보이는 것도 어쩔 수가 없다. 마리즈는 알제리과 아랍어를 모르는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고, 나지아 역시 두 개의 여권을 가진 이중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아시아 제바르의 <프랑스어의 실종>은 나에게 알제 전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지적 욕망을 촉발시켰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과 노서경 작가의 <알제리 전투> 그리고 2년 전에 사두고 묵힌 알렉스 제니의 <프랑스식 전쟁술>도 읽어야지 싶다. 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는 끝이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