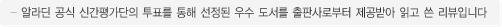[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음식 그 두려움의 역사
하비 리벤스테인 지음, 김지향 옮김 / 지식트리(조선북스) / 2012년 8월
평점 :

절판

먹는 것을 워낙에야 좋아하는 나로서는 선뜻 이 책을 펼쳐들기가 어려웠다. 제목에서도 연상되다시피, 어떤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는 류의 경고문이 가득 적혀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두려움으로 책을 펴드는데 이게 웬 걸. 책은 분명 일침을 가하고 있기는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류의 경고문은 아니었다. '음식' 그 체가 아니라, '음식을 둘러싼 여러 루머'에 대한 경고를 설득력있게 서술한 이 책은 음식을 둘러싼 과학, 역사, 경제, 심리학 등 다양한 방면을 두루 다루며 그 근거를 구축해놓았다.
독약으로 치부된 화학적 식품 첨가물, 영양덩어리에서 건강을 해치는 악덩어리가 된 우유, 생명연장의 묘약이던 야구르트의 물거품이 된 꿈. 등 이 책에서 다루는 식료품들은 소비자들의 열광을 끌어오기도 했지만, 반대로 위협적인 공포를 심어주기도 했다. 어떤 때는 건강을 부르는 식품으로, 또 어떤 때는 건강을 해치는 식품으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움직이는 음식들, 과연 무엇이 문제인걸까?
이 책은 '음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음식, 그 자체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음식을 어떻게 요리할까를 궁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정확히 말하자면, 어떻게 이 음식을 요리해서 소비자들의 돈주머니를 열게 할까에만 초점을 둔 각계 각층 이해관계자들의 담합, 즉 그들의 꼼수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급자족으로 음식을 손수 마련했던 옛 시대의 사람들에게 음식은 곧 믿을 수 있는 것이었다. 자신의 논과 밭에서 기르고 수확한 곡물들과 이웃들로부터 산 식재료들이 그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신뢰'를 바탕에 두고 있었다. 한 마디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들의 식탁은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식재료로, 베일에 쌓인 유통, 조리 과정으로 올라온 식탁의 음식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아니,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무감각해져버렸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무감각해진 혀와 둔감해진 뇌는 미국인 특유의 청교도적 죄의식과 만나 쉽고 편하게 조리된 음식에 대한 죄의식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완벽한 조합이 음식공포를 탄생케 한 것이다.
소위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견해 한마디에 소비자들은 공포에 떨며 혹은 안심하며 음식을 끊고 다시 산다. 그것도 같은 음식들에 대해서. 입에 들어가는 음식조차도 믿을 것이 못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의 '뻔한' 그 말한마디였고, 그것은 언론을 타고 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 하비 리벤스테인은 고로 독자에게 말한다. 전문가와 언론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꼼수를 부린 그 말 한마디에 빨리 반응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말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자세로, 끈기있게 기다리다보면 음식공포를 조장한 루머들이 걷히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런 저런 충고들과 조언에 지치시거나 혹은 슬슬 짜증이 날 법도 한 독자가 읽으면 그야말로 통쾌함을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것, 그리고 음식은 무엇이든 '적당히' 정신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하고 경계야 할 것이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둘러싼 배후에 있는'공포조장자'들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폭로해 준 이 책에 나 같은 호식가들은 감사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