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의 혁명 -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
존 미클스웨이트 외 지음, 이진원 옮김 / 21세기북스 / 2015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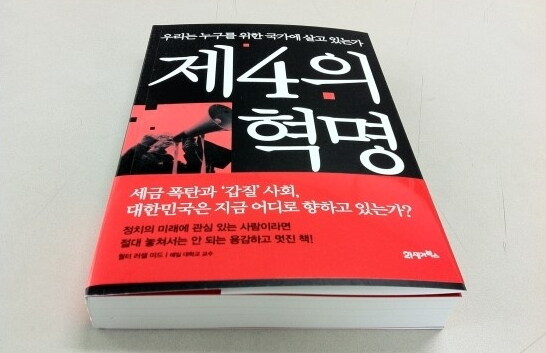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도 벌써 3년 차다. 그동안 잘한 일이라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 세금 폭탄에 툭하면 종북 딱지 붙이기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 같다. 세월호 참사를 거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를 보면서 국가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빠졌었다.
<제4의 혁명>이라는 책은 ‘우리는 누구를 위한 국가에 살고 있는가’라는 표지에 있는 문구가 읽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이 책을 통해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알고 싶었다. 한계에 부딪혔다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과연 정부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해답을 보고 싶었다.
책에 따르면 근대 서양정부가 지금까지 3차례 반에 걸쳐 위대한 혁명을 겼었다고 한다.
제1의 혁명은 유럽이 중앙집권적 국가를 세운 17세기를 말한다. 국민국가가 처음에는 대항해시대의 교역제국이 되었다가, 다시 기업가 정신이 느껴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됨을 말한다. 이때 정부의 형태는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 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 괴물이다.
제2의 혁명은 프랑스와 미국의 혁명이 일어난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시기다. 존 스튜어트 밀로 대변되는 자유주의자들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를 전복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야경국가, 정부는 최소한의 규모를 지향한다.
제3의 혁명은 웹 부부가 창시한 근대복지국가의 태동을 말한다.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노동자와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의 시기다. 19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의 등장이 반쪽의 혁명이다. 일부 민영화는 성공했지만, 정부의 규모를 줄이기는 실패했기 때문에 반쪽인 것이다.
저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현재 상황. 즉 오늘날 전 세계는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졌다는 것. 보편적 복지로 인해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기존의 정치 체계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4의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였던 셈이다.
두 명의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세 가지다. 소유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산을 매각하는 민영화의 부활이 첫째고, 부자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확보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보조금의 삭감이 두 번째다. 그리고 셋째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진정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다.
처음부터 숨이 막혔다. 무려 32쪽에 달하는 서문이 읽기가 절대 수월하지 않음을 대변했다. 한편으로는 맥이 빠졌다. 결국, 두 명의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이 양극화를 부추기는 신자유주의를 완성하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세제 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부자들에게 줄줄 세는 보조금을 막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해결책이 내 생각과는 많이 다르지만 두 저자 모두 나름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므로 결론에 대해서는 더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된다. 대신 책 읽는 내내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어쩌면 미래의 정치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어 인용한다.
플라톤은 유권자들은 장기적인 신중함보다 단기적인 만족감을 더 중시할 것이며, 정치인들은 뇌물을 주고라도 권력을 잡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비판했다. -p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