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눗방울 퐁
이유리 지음 / 민음사 / 2024년 11월
평점 :




이토록 사랑스럽고, 명랑한 이별의 언어들이라니!
이별을 이야기하면서 끝내 사랑을 말하는 이유리 작가의 작품 속으로 경쾌하게 다이브할 것!
나 오늘 비눗방울 되는 약 먹었어.
표제작 「비눗방울 퐁」에는 세상으로부터 사라지고 싶어 기어이 비눗방울이 되기로 결심한 유현과 이제 혼자 남겨질 연인, 수정이 등장한다.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퐁, 하고 사라지고 싶다던 유현 앞에서 어안이 벙벙해진 수정은 고통스럽지만 다툼과 미움으로 얼룩질 이별이 아닌 평화로운 이별을 선택하기로 한다. 게다가 생애 마지막으로 옛 여자친구였던 혜령의 부모님이 보내주셨던 달큰한 참외를 꼭 다시 맛보고 싶다던 유현을 위해 혜령을 수소문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예정된 이별, 언제 어느 틈에 사라질지 모를 이별의 시간을 무용한 듯 무용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 참외를 먹으러 강릉으로 향한다.
문득, 사랑은 ‘계속해서 비눗방울을 부는 것’이라던 누군가의 말이 기억난다. 부풀고 부풀어 오르다 기어코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 비눗방울처럼, 애초에 이토록 불완전한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비눗방울을 불고 싶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눗방울 퐁」에서 수정은 유현이 언제 비눗방울이 되어 사라질까 전전긍긍하는 대신 혜령을 도와 감자밭에서 묵묵히 감자를 캔다. 이 남자와 다 하지 못한 사랑을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감자를 삼키며 뜨거운 것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집중한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그저 경쾌하게, 퐁. 이별은 ‘너를 쓴 문장들을 삭제하고도 다시 완연해진 서사로서의 나를 save하는 이야기’라던 박서련 작가의 발문처럼, 작가 이유리는 이별이 이처럼 명랑한 것일 수 있다면 새롭게 써 나갈 나의 이야기도 더없이 명랑해질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게 한다.
유현도, 혜령 씨도, 곧 벌어질 일들과 찾아올 슬픔도 모두 사라지고 단지 이 땅속에 파묻힌 감자들과 나만이 있었다. 여름 내내 혜령 씨와 이 땅이 구슬땀을 흘리며 함께 키워 낸 감자알을 캐내는 일, 그것만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었다. 나는 눈도 깜박이지 않고 일했다. 어느새 쨍쨍해진 햇빛이 푹 숙인 목덜미를 달달 굽는 것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기쁜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의 목덜미를 갖게 될 거야. 올해 내내 새까만 목을 당당하게 내보이며 다닐 거야. / 「비눗방울 퐁」 중에서 272p
그야말로 경쾌하게도, 퐁.
참, 말도 없이 가네요.
혜령 씨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분명 들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응 이제 됐어, 하고 낮게 중얼거리는 유현의 목소리를.
네가 됐다면 나도 됐어.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찐 감자를 입안 가득 물었다. 볼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뜨거웟지만 꾹꾹 씹어 꿀꺽 삼켰다. 뜨거운 것이 배 속에 가득 차는 기분, 그것이 지금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 「비눗방울 퐁」 중에서 27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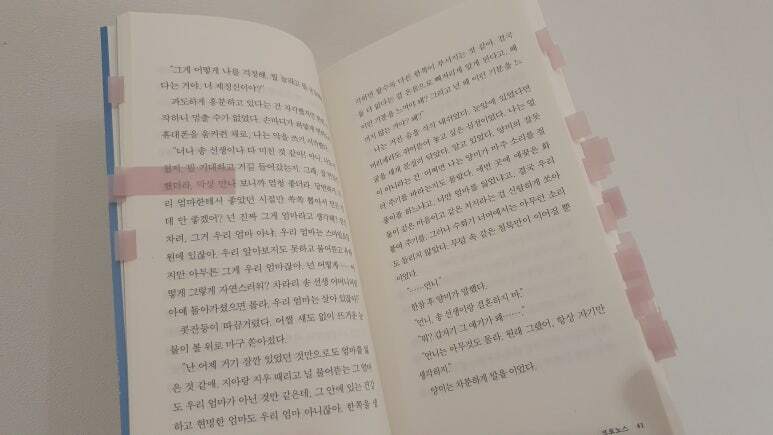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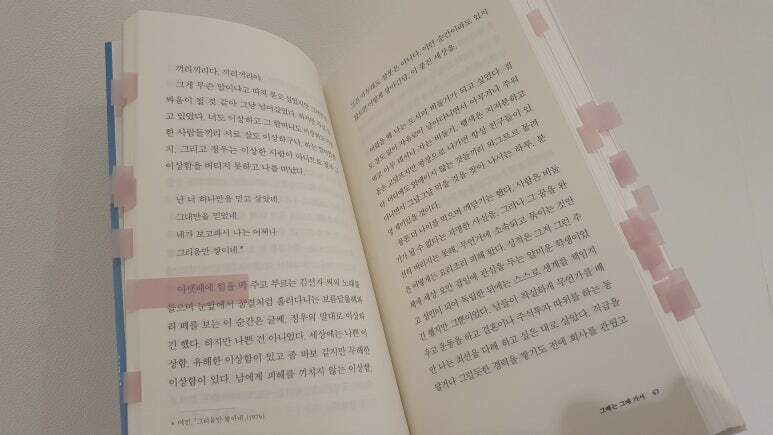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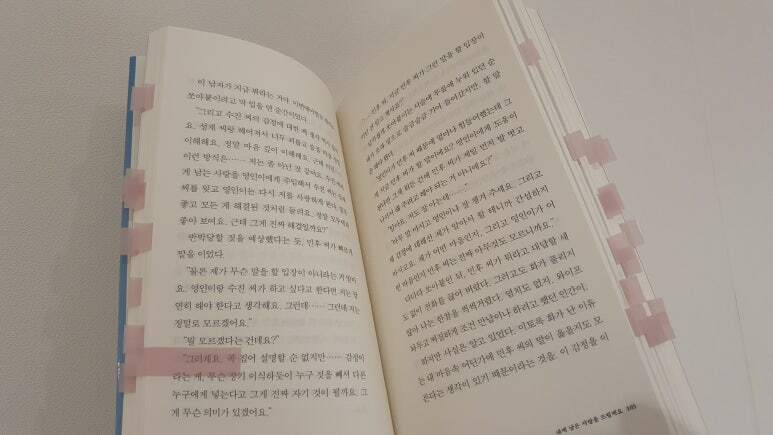
『비눗방울 퐁』 속에 수록된 여덟 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별’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가장 흔한 이야기를 전혀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유리 작가의 매력인 듯하다. 개인적으로 ‘기억-담금주’라는 독특한 설정의 소설 「담금주의 맛」이 인상적이었는데, 남편의 외도로 고통과 아름다운 기억이 뒤엉킬 때마다 스스로 유리병에 들어가 술을 담그듯 기억을 그 속에 녹여냄으로써 상처를 회복하는 여성의 이야기다. 시간이 흘러 지난날의 상처가 조금은 덤덤해졌을 즈음, 주인공은 오랜만에 담금주를 떠올리고는 그 속의 오묘하고도 신비한 빛깔과 무늬에 감탄하며 뜨겁게 한 잔 마신다. 그때 그녀가 자각한 건 내가 통과한 모든 순간들의 무늬였다. 이 아름다운 빛깔에서 내 삶을 다시 구원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포착해내는 작가라니, 아… 이 작가 좋다!
구멍이었다. 그저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가슴 한가운데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고 그 사이로 드나드는 시리고 싸늘한 바람까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당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얼굴이 축축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 보고서야 알았다.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신호라도 되듯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이 터졌다. 나는 흑흑 흐느끼다가 종내는 끄억끄억 흉한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중에서 116p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그것들이 저마다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몸서리쳐지게 싫다는 거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동시에 아름다웠다. 그것들이 각자 지닌 무수한 색깔과 온기와 냄새, 그것은 모두 사는 동안 두 번은 가져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잡아 둘 수 없으나 잡아 둘 필요도 없는 그런 찰나의 반짝임들. 그 하나하나들은 사라지지만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존재하던 곳에서 잠깐 불려 나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에 가까웠다. 내가 평생 들여다볼 수 없는 저 뒤편 어딘가에 영원히 남은 나의 일부들. 잊고 싶고 버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그럴 수가 없는 조각들, 부드러운 내면에 깊은 흔적을 새기며 끝내 나름의 무늬를 만들어 내는 까끌까끌한 알갱이들. / 「담금주의 맛」 중에서 173p
그거면 됐다.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바랄 수도 없다. 방법이 없다면 찾지 않으면 된다. 최소한 찾지 않는다는 것만은 스스로 정할 수 있으니까. 나는 서랍장 속에 굴러다니는 혜원의 안경을 볼 때마다 그런 말을 되뇌며 윗옷 앞섶을 길게 뺀다. 언제 혜원이 그걸 찾을지 모르니, 안경알을 잘 닦아 두려는 것이다. / 「보험과 야쿠르트」 중에서 200p
거길 돌아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미 한번 배제당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그런데 이제 네 얘기를 들으니 알겠다. 나는 돌아가서 내 눈으로 보겠어. 시스템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그리고 옳지 않았다면, 싸우겠다. / 「달리는 무릎」 중에서 21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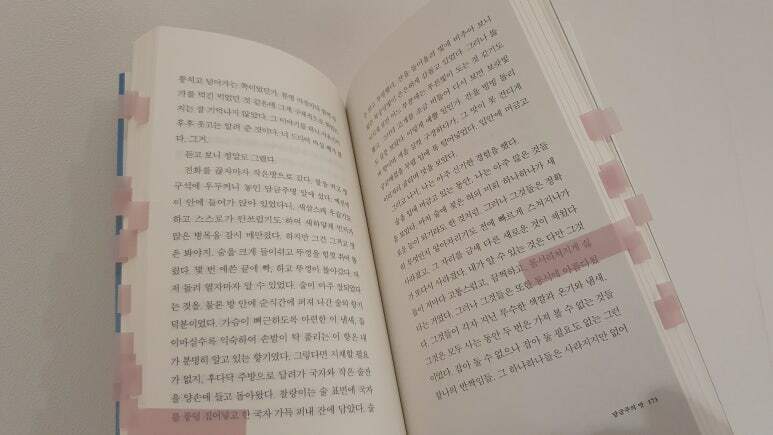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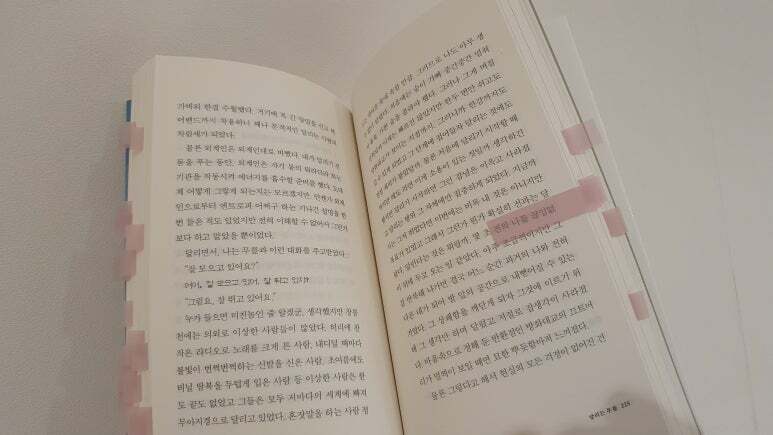
이토록 사랑스럽고, 명랑한 이별의 언어들이라니. 이별을 이야기하면서 끝내 사랑을 말하는 이유리 작가의 작품 속으로 경쾌하게 퐁, 다이브해보시길 바란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았으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