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엄마의 마른 등을 만질 때 -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엄마 그리고 나
양정훈 지음 / 수오서재 / 2024년 3월
평점 :




사랑하는 이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
지난 주, 엄마에게서 치매예방영양제를 대신 주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치매를 한참 앓다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병력이 자신에게 미칠까 염려가 되는 모양이었다. 치매만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던 엄마의 바람이 어느 덧 죽음이라는 시간의 경계에 가 닿아 있는 것 같아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는 자신이 두 번 겪은 암이 나에게도 미칠까 매사 조심하라고 단속하며 동시에 미안해했다. 나의 병력이 자식에게로 이어질까, 자식의 삶을 발목 잡을까봐 미안해지는 마음. 외할머니가, 엄마가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니었을 텐데 어째서 아픈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걸까. “정훈아, 미안해.” 『엄마의 마른 등을 만질 때』 속에서도 죽음을 앞둔 엄마가 고르고 골라 남긴 말은 ‘미안해’였다. 그 마음이 나의 엄마와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만 펑펑 울어버렸다.
엄마와 함께 한 마지막 시간들
“생을 관통하는 슬픔과 통증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엄마와의 시간을 남긴다.”
이 책은 유방암에 이어 자궁내막암이라는 두 번째 암 선고와 함께 시작된 엄마의 투병기이자, 엄마와 함께 한 마지막 시간을 담아 쓴 에세이다. 자궁 바깥에 퍼져 주변 장기까지 작은 씨처럼 빽빽하게 돋아난 파종성 전이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어버리고만 순간과, 항암치료와 요양병원을 오가며 서로 사랑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체감하며 먹먹해지고 마는 감정들이 섬세한 언어로 담겨 있다. 가만히 옆에 앉아 여윈 엄마의 등을 쓰다듬다, 울툭불툭 튀어나온 등뼈를 어루만질 때마다 슬픔을 삼켰을 아들의 애틋한 마음이 매만져진다.
엄마는 여전히 내면이 텅 빈 것처럼 보였다. 몇 번 울고, 이모들을 봤을 때는 신인지 운명인지 모를 대상을 원망했다. 그러나 대부분 말없이 세상에 문을 닫아버린 사람 같았다.
당장 서울로 올라갈 짐을 싸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할까? 다시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 걸까? 어느 것 하나 예측할 수 없었다. / 26p
삶을 잠시 마비시킬 만큼 압도적인 시간이 안개처럼 희뿌옇다. 허물어지지 않기 위해 기억할 힘마저 마음이 다 가져다버텼기 때문일지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온 힘으로 단 하나의 희망을 건져 올리고 싶어 다른 건 까맣게 놓아버렸는지 모른다.
그렇게 남은 말이 수술하자는 말이 되었다. 수술하면 돼. 이제 싹 고치면 돼. 나는 어제오늘 이 말만 되풀이한다. 계속 말하면 반드시 그리될 것 같았다. / 33p
엄하고 단단하던 사람은 어떻게 이 작고 무른 노인이 되었는가. 엄마도 그때 외할아버지의 낡은 몸을 한참 만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제야 그날의 엄마를 알 것도 같고 여전히 모를 것도 같고 날카로운 칼 같기도 하고 해진 책의 모서리 같기도 하였다. 엄마의 주름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외할아버지의 손목도 실은 그랬던 건지 모르겠다. / 6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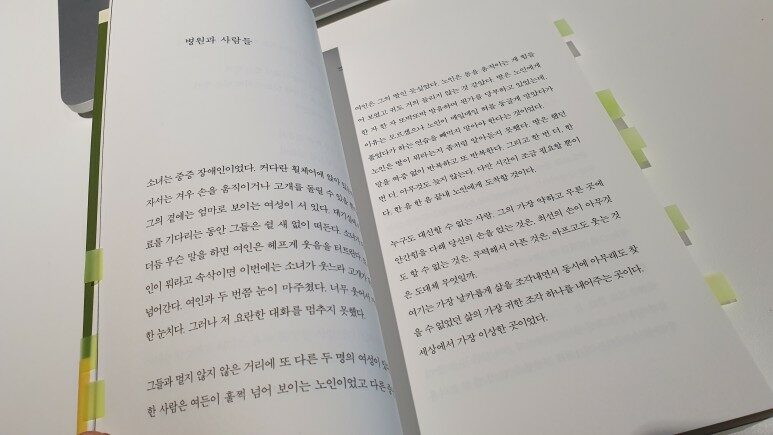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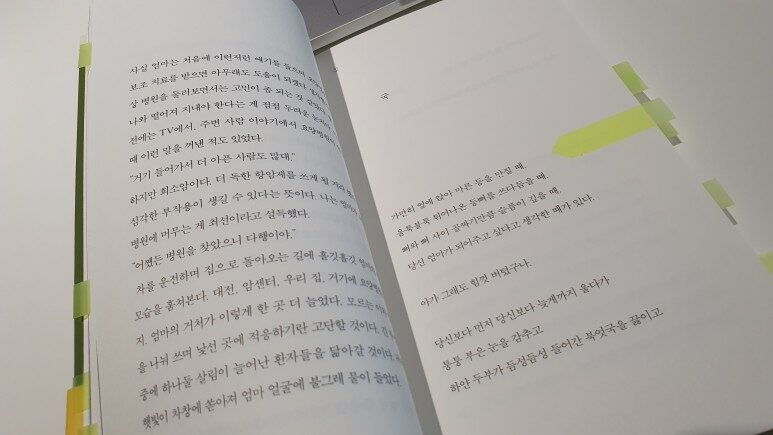
‘여기는 가장 날카롭게 삶을 조각내면서 동시에 아무래도 찾을 수 없었던 삶의 가장 귀한 조각 하나를 내어주는 곳이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곳이었다.’ 양정훈 작가는 병원을 이렇게 표현한다. 피곤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어제와 비슷한 메뉴로 적당히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 답답한 병원 공기를 피해 잠깐이나마 햇빛을 보러 나왔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한 시선들. 병원이라는 공간 속에 있다 보면 사랑하는 이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유독 눈에 밟힌다.
양정훈 작가 역시 엄마와 함께 병원을 자주 드나들며, 비슷한 듯 저마다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시선이 자주 가 닿았던 것 같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여든 넘은 노인에게 중년의 딸이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모습, 항암 주사를 맞는 여덟 살 아이와 아빠, 중풍에 걸린 아내의 걸음에 맞춰 산책하는 남편…. 덕분에 아픔은 결코 아픈 사람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나아가 저마다의 아픔과 거친 일상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더 친밀한 시선으로 보듬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다른 듯 닮은 슬픔. 당신의 저림을 알 것도 같아서 우리는 함부로 위로하지 않는다. 서로에 반사되는 고통이 있었다. 통증은 아무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작아지지도 않는다. 단지 아픔과 아픔을 이을 뿐. 슬픔에 슬픔을 포갤 뿐. 모두 다 아픈 것을 알고는 마음의 모서리 하나가 몽톡해졌다. 눈 덮인 밤의 숲을 서로 발자국을 겹치며 나란히 걷는 기분이었다. / 149p
사랑이 사랑인 이유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삶이 아름답고 눈부신 이유는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재활병원 모퉁이에서 아픈 아버지가 아픈 딸의 몸을 닦는다. 닦아도 닦아도 사랑이었다. / 20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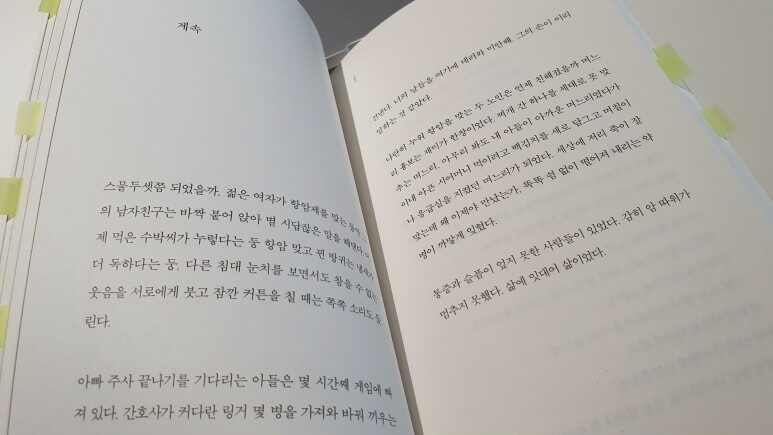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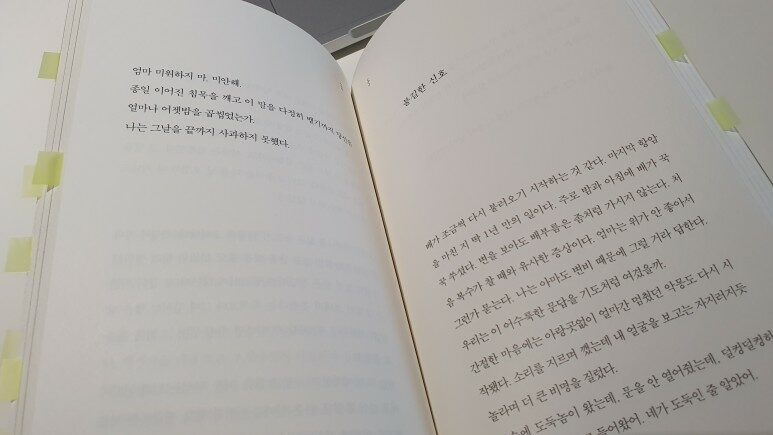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있다고 한다. 우리는 무지하고 사랑할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 한정 없이 사랑하는 이의 등을 쓰다듬을 시간이, 눈을 들여다보고 같이 웃고 울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또 모른다. 부디 늦게, 알아버렸다고 후회하지 않기를. 사랑하는 내 사람과 함께 할 시간을 더 많이, 더 자주 그려보기를.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았으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