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헤어지기 좋은 시간
김재진 지음 / 고흐의별 / 2023년 10월
평점 :




아무리 돌고 돌아 헤매어도 별이 빛나고 있는 한 나는 돌아올 수 있어!
비애의 그림자가 밟히는 계절이다. ‘꽃들의 체온이 그리움의 온도로 바뀌’(「수상한 계절」)고, 낙하하던 잎사귀의 마른자리가 지천에 가득할 즈음이면, 온 세상이 상실의 내음으로 코끝을 먹먹하게 채운다. 그러나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란’ ‘기쁨과 아픔이 절반씩 몸을 섞는 일’(「회상」)이라던 김재진 시인의 시처럼 이왕이면 상실이나 소멸이 아닌, 헤어지기 좋은 시간이라 달리 쓰고 싶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로 애끓던 시끄러운 마음들과 작별하고 이제는 차분하게 내려앉은 그림자와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좋은 계절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
떠나는 모든 것이 상처인 듯 아리다 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음대에 진학했다 방송사 피디로 젊은 시절을 보낸 뒤 40대 초, 홀연 직장을 떠나 바람처럼 떠돌다 지금은 아틀리에에서 책 쓰고 그림을 그리며 명상하는 삶을 살고 있다던 시인. 그래서인지 김재진 시인의 시를 읽고 있노라면, ‘눅눅한 사연을 실어 나르는 바람’(「바람의 시·1」)을 맞으며 ‘유리조각 밟듯 살아왔던 지난날’(「여름의 안부」)을 떠올리는 어느 고독한 자의 옆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생의 뒤편으로 물러나 존재의 비애를 마주하고, 울음과 고독 속에 놓여본 이라면, 그런 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의 시가 가득 와 닿을 것이다.
가을이 내게 쓴 몇 줄의 편지
(중략)
늘 안에서만 아픈 이빨과
이빨 대신 아프지 못해 질근거리는 세월과
언제나 바깥을 떠돌기만 하던 나의
오래되어 힘 잃은 바람기야,
늙어서 미안하다며 울먹이는
문 밖의 저 계절을 보아라.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가르쳐주지도 않는다며
투덜거리며 지나가는 아픈 날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짐들아,
하늘 향해 열어놓은 저 창문 좀 보아라.
바람 불면 덜커덩거릴
여려서 자주 아픈 마음 좀 보아라. / 4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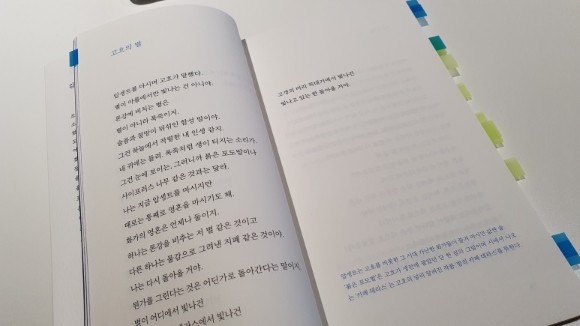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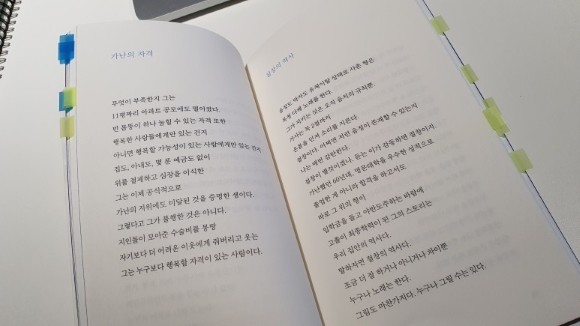
또 한편으론 이쪽 가지에서 저쪽 가지로 날아가는 새와 마찬가지로, 생의 이별 앞에서 나는 그저 ‘저 별에서 이 별로 여행하러 온’(「새의 이유」) 것이라 초연히 마음을 가다듬는 자의 뒷모습을 엿보게 되기도 한다. 시 「문지리 천사의 시」에서 진짜, 라는 말에 속지 말라 ‘너는 언제나 내게 부재의 존재’라 단언했던 것처럼, 내 안에 의미의 세계를 비워냄으로써 단단해지려는 시인의 여문 마음이 시집 곳곳에서 느껴진다.
뻐꾸기
나는 째깍거리고
너는 두근거리지.
나는 늙었고
너는 젊다는 말이야.
그냥 그것뿐이야.
벽에 걸린 저 시계가 우리를
똑같이 만들 거야. / 16p
그러나 아무리 초연해지려 해도 기어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온 마음을 다해야만 간신히 가 닿을 수 있는 존재들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란 것이 있기에, 그것을 헤아리는 시들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너를 향해 다가가는 나의 보행은/ 직립이 아니라 반半직립이다./ 허리 숙여 바닥에 닿는/ 키 작은 꽃잎처럼/ 낮춰야 흐를 수 있는 시냇물이다./ 네게로 가지 뻗는 나의 나무는/ 뿌리째 무릎 꿇는 투항이다.” 시 「투항」은 미처 온전한 마음으로도 다 전할 수 없어 뿌리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애타는 마음들을 들여다보게 한다. 그렇게 시는 우리에게 물어온다. 기꺼이, 너는, 누군가에게 네 온 마음을 바쳐본 적이 있느냐고.
일생
한 평생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겨울 아침
들판에 눈보라 휘몰아치는 소리
바람이 매달려 있는 풍경을 때리고 가는 소리
낙엽이 서로 살 비비는 소리
추락하는 고드름이 쨍그랑거리며
햇살과 부딪히는 소리
누가 혹시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리라.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득한 항아리를
아직 비우지 못했다고. / 15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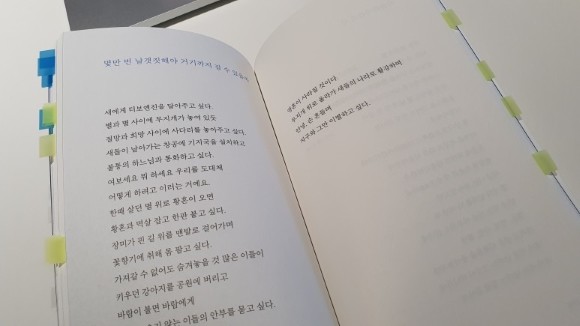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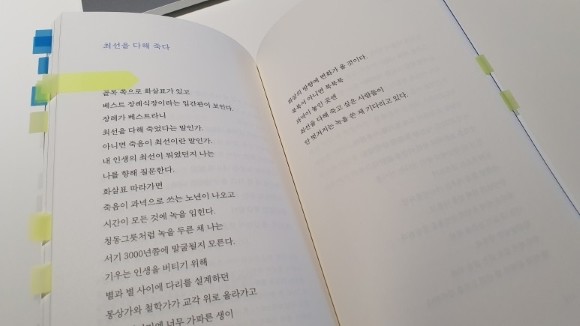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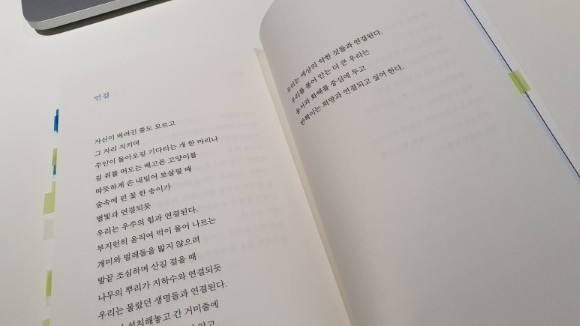
찌르고 또 찔리며 연명하는
삶이라는 형벌은 누가 쓰는 무기인가
발문에서 윤일현 시인은 이렇게 쓴다. “세상을 살아보면 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초롱불을 들고 마중 나와 주고, 두렵고 먼 미지의 곳으로 떠날 때, 괜찮다고, 잘될 것이라고 말해주며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다.” 김재진 시인은 상실과 비애, 생의 파고를 넘어 절망과 죽음을 통과한 언어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약한 것들과 연결’된 마음과 ‘우리를 품어 안는 더 큰 우리’(「연결」)를 감각케 한다는 점에서 삶이란 마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준다.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뭔가를 그린다는 것은 어딘가로 돌아간다는 말이지./ 별이 어디에서 빛나건/ 그것이 카페 테라스에서 빛나건/ 고갱의 머리 꼭대기에서 빛나건/ 빛나고 있는 한 돌아올 거야.”(「고흐의 별」) 아무리 돌고 돌아 헤매어도 별이 빛나고 있는 한 나는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로 그래야만 내 안에 드리워진 오랜 비애의 그림자와 작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김재진 시인의 시를 읽으며 나에게 깊이 물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았으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