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물에 대해 쓰려 했지만
이향규 지음 / 창비교육 / 2023년 6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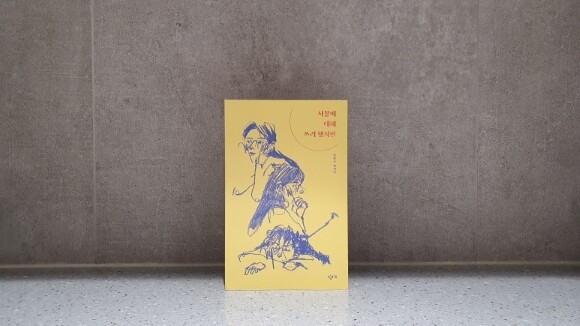
사물로 하여금 기억의 문을 열어젖혔더니 사람이 보이더라!
다정한 연결, 돌봄의 의미를 어루만져보게 되는 참 따뜻한 시선!
사물에 담긴 따뜻한 물성을 매만지고 있는 듯한 감각. 이향규 작가는 사물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 가장 친밀한 감정을 먼저 발견한다. 덕분에 나 역시 사물 너머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넉넉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만든다. 오늘 내가 사용하고, 매만지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내고 있는 것들이 건네 오는 말에 귀를 자주 기울여봐야겠다. 그 잠깐의 귀 기울임에 잊고 있었던 추억의 한 페이지를 펼쳐볼 수 있다면, 그리운 얼굴을 떠올려볼 수 있다면, 나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저 그런 듯했던 나의 일상이 좀 더 풍요로워질 테니까.
사물에게서 사람을 읽는 이야기
고사리나물, 미역국, 김치로 채운 작은 밥상이 엄마의 밥상을 떠올리게 하는 위로 음식일 때가 있다. 가을 산에 널린 것이 도토리요, 시장에서 헐값에 팔리는 게 도토리묵이라 어릴 적에 엄마가 도토리라 부를 때면 괜히 흔하고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졌는데 자라고 보니 동그랗고 야무지고 단단한 것이 제법 귀엽게 느껴진다. 이렇듯 아주 일상적인 사물은 때때로 기억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나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음을 깨닫곤 한다. 이향규 작가는 자신의 책 『사물에 대해 쓰려 했지만』을 통해 사물이 기억의 문을 열어젖히니, 잊고 있던 순간과 묻어 두었던 마음이 하나둘씩 드러나더라고 고백한다.
그러고 보니 라면이 먹고 싶어 물을 올렸더니 냉장고에 김치가 없는 게 아쉬운 오늘 아침이었다. 김치통에 배추 밑동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게 은근 서글펐다. 어릴 적, 김장철이 되면 외가댁 식구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달라붙어 빨간 대야에 배추를 절이고, 씻고, 양념장을 만들고, 양념을 버무렸는데도 그날 하루를 꼬박 다 써버려야 할 때가 있었다. 다들 허리 아프다, 몸살 나겠다 투덜대면서도 온 가족이 나눠 먹을 김치를 야무지게 담갔다. 한 통, 두 통 차곡차곡 그날 만든 김치를 살뜰하게 챙겨 넣어 각자의 집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세상 뿌듯해 보일 수 없었다. 김치가 뭐라고 다들 이 야단인지, 나는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도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오늘은 김치 한 쪽 없는 냉장고가 유독 텅 비어 보였다. 어찌 김치 한 쪽이 없어서 아쉬웠겠나. 그 시절, 발 디딜 틈 없이 시끌벅적했던 부엌 풍경이 그리웠던 것은 아닐까.
어릴 적 살던 집 마당 한구석에 개나리 나무가 있었다. 마당이래야 손바닥만 했으니 한편에 있던 나무가 얼마나 컸으랴마는, 기억 속에 있는 그 나무는 뒤에 숨으면 아무도 찾지 못할 만큼 크고 빽빽했다. 꽃이 피면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달달하고 따뜻한 냄새가 났다. 지금도 개나리 향을 맡으면 머릿속에 아지랑이가 핀다. 내 가장 오래된 기억은 엄마가 작은 트랜지스터라디오를 개나리 나뭇가지에 걸고 그 아래에서 음악을 듣는 모습이다. 그런 여유는 일하면서 아이 넷을 (거의) 혼자 키웠던 엄마가 자주 누리던 호사가 아니었을 텐데, 한복을 입고 노란 꽃 아래 앉아 있던 그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다. 참 고우셨다. 그래서 나에게 개나리는 엄마의 나무가 되었다. / 79p
빨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든다.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는, 예컨대 햇볕과 바람도 빨래를 통해 그 형체를 드러낸다. 그건 물 잔이 물의 형태를 잡아 주는 것과 비슷하다.
빨래는 이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곁에 불러오기도 한다. 그것도 바람이 매개하는 일이다. 노랫말이 그 사실을 알려줬다. 「천 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한국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곡으로 널리 알려졌다) 덕분에 나는 엄마도 아버지도 할머니도 내 곁에 부는 바람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안다. / 9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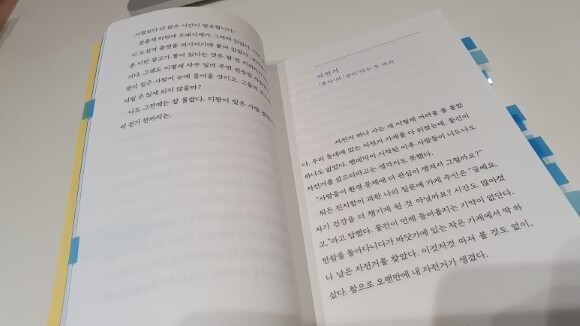
이향규 작가는 영국에서 이주민으로, 두 딸의 엄마로, 돌봄 노동자로 살아가며 겪은 소소한 일상과 그 안에서 다정한 연대 그리고 돌봄의 의미를 되새김하기도 한다.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웃들이 함께 서로를 돌보며 마음을 나눈 일화들은 우리에게 작지만 소중한 ‘연결’의 의미를 돌이켜보게 한다. 안 쓰는 물건을 서로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나누며 가끔은 기부 활동도 하는 등 이 아름다운 연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작가는 말한다. 누군가를 보듬는 일은 그저 자신이 가진 게 넉넉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처음 이 일을 시작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는 오늘날, 문밖을 걸어 나가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섬세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는지.
노숙자를 돕는 자선 단체 ‘셸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신발이 50켤레나 필요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누구든 머무를 집 한 칸은 필요하다.”
애린과 시내에 있는 가게들을 순례하듯 돌아다니면서, 그 옛날 유모차를 밀며 가게를 기웃거렸던 젊은 엄마가 떠올랐다. 이 가게들이 그 시절 나를 지탱했다. 나는 이제 중고 냄비를 사면서 하나도 슬프지 않고, 어른이 된 애린은 힙한 빨간 바지를 고르고 기뻐한다. 채리티 숍, 내가 영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다. / 128p
한편, 무례한 사람들에게도 배우는 것이 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에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무엇에 화가 나는지, 무엇을 피하고 싶은지, 무엇이 불편한지, 어떻게 갈등을 다루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그들이 탄 기차에서 내린 뒤에 찾아온 안도와 자유를 경험하며 비로소 알게 된다. / 23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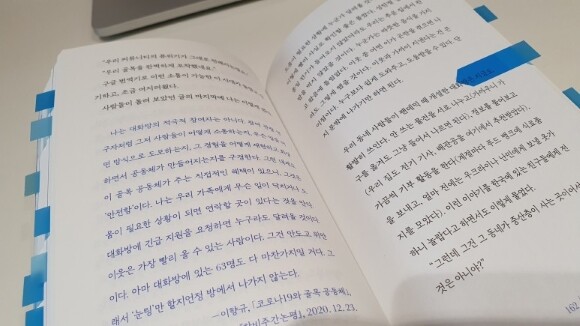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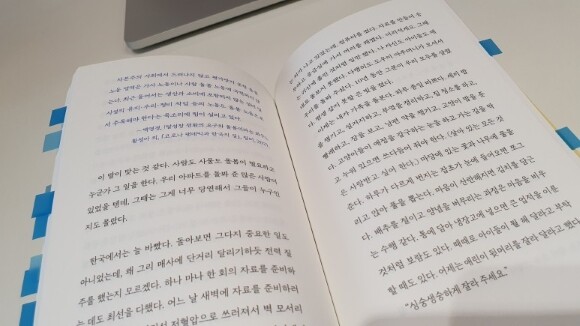
이향규 작가는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기쁘거나 슬프거나 안타까웠던 삶의 어떤 순간들, 내 감정과 시간이 농축되어 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내는 것은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것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전한다. 어쩌면 그러한 고마움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을 때, 나아가 우리 사회의 연약한 자리를 보듬어보는 시선도 넓어지리라 생각한다. 서로가 거기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이 따듯한 기록이 모두에게 좀 더 다정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았으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