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 나를 수놓은 삶의 작은 장면들
강진이 지음 / 수오서재 / 2023년 5월
평점 :




우리의 삶 어느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소소하지만 따뜻한 풍경들!
이 책을 읽고 나면 오늘 내 하루의 모든 것이 위안이 된다!
어린이날이라고 야구장에 가고 싶다던 아이들이 열흘 전부터 야단이었다. 야구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룰도 잘 모르지만 엄마와 아빠가 보는 야구TV를 시청하며 무턱대고 ‘파란 팀’을 응원하던 아이들은 그저 야구장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났는가 보다. 시끌벅적한 야구장에서 신나게 응원가를 부르며 맛있는 치킨 먹는 재미에 푹 빠진 아이들은 다음에 또 가자고 벌써 또 난리다. 마침 연달아 어버이날도 있으니 양가 어르신들 뵙고 그 주의 휴일을 바쁘게 보내고 났더니 지치긴 했나보다. 우리 부부가 덜컥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도 40도까지 열이 들끓어 밤새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이며 갖은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지독한 A형 독감에 가족 모두가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다. 새삼 ‘가정의 달’이니 뭐니 하는 것들이 다 번거롭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꼬박 일주일을 아이들과 집에서 요양을 하고 나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5월도 어느 덧 중순에 이르렀다.
오랜만에 두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나자 집안이 고요하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시려니 이 시간이 참 귀하고 달다. 내친김에 오랜만에 햇빛 좀 보자고 산책길로 걸음을 나서니 어느 새 초록 풀잎사귀가 무성하다. 벤치에 앉아 독감 때문에 그간 손에 잡히지 않던 책을 펼쳐 한 장 두 장 넘기는 이 여유로운 시간이 오늘따라 더 고맙고 다정하다.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 아파보고 나니 이 시간도 무척이나 귀한 것이었음을 느끼게 된다.
마침 읽은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란 책에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삶의 매 순간을 그저 흘려보내거나 놓치지 않길. 겨울이 지나면 봄마다 새롭게 꽃이 피듯, 더러 구름이 끼어 보이지 않아도 365일 매일매일 밤하늘에 별이 빛을 발하고 있듯, 삶 속에는 늘 사랑과 기쁨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길.” 애써 찾지 않아도 내 삶의 곳곳에 만발해있는 행복과 감사할 일들을 그저 놓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이미 풍요로운 것이 된다. 그러다 혹여 오늘 내 하루에 무심했던 듯한 기분이 들 땐 이 말을 떠올려보는 거다.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이렇게 행복이 있는데,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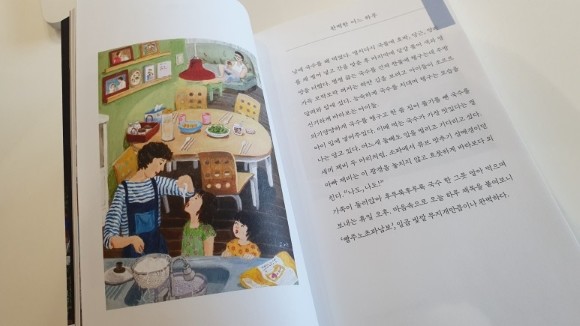


아이야, 행복에 특별한 조건을 달지 말렴.
이것만 있었어도, 이것만 없었어도.
삶이 힘겨울 때도
뭔가 비범하고 대단한 해법을 찾지 말렴.
공기와 물처럼, 나무와 바람처럼
소중한 것은 언제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것들이란다. / 14p
나를 수놓은 삶의 작은 장면들을 담아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는 소소하지만 그 속에서 비범한 행복을 발견하게 하는 화가 강진이의 그림일기책이다. 소박하고 자잘한 날들의 기쁨을 채집하듯,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 폭의 그림과 자수로 담아내 엮어냈다. 어린 시절 사이사이를 누비던 골목길의 풍경, 평상 위에 둘러앉아 한 그릇씩 가득 받아 입도 손도 옷자락도 빨갛게 수박 물을 들이며 먹던 그 날의 맛, 인형 하나 제 이부자리에 틈을 내어주고 곤히 잠든 아이들의 모습, 향긋한 오이소박이 냄새, 족집게로 하나하나 정성들여 뽑아낸 외할머니의 흰 머리카락까지… 우리의 삶 어느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풍경들이 잔잔하지만 따뜻하게 글과 그림 속에 녹아있다.
의기양양하게 국수를 헹구고 한 줌 집어 물기를 뺀 국수를 아이 입에 넣어주었다. 이때 먹는 국수가 가장 맛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어느새 둘째도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섰다. 새끼 제비 두 마리처럼. 소파에서 큐브 맞추기 삼매경이던 아빠 제비는 이 광경을 놓치지 않고 흐뭇하게 바라보다 외친다. “나도, 나도!”
가족이 둘러앉아 후루룩후루룩 국수 한 그릇 말아 먹으며 보내는 휴일 오후.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 제목을 붙여보니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빛깔 무지개만큼이나 완벽하다. / ‘완벽한 어느 하루’ 중에서 21p
안방 한가운데로 볕이 가득 들어차는 날이면 조그만 낮잠 베개를 베고 누운 외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뽑았다. 철부지 내게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은 양 볼 부풀려 불던 달콤한 풍선껌 같았다. 족집게로 꼭 집어 올리면 쏙 뽑히는 머리카락. 힘없이 빠지는 흰 머리카락들은 동그란 거울 위에 잡초처럼 붙여두었다. 여덟 살 땐 한 개에 십 원, 열 살 땐 열 개에 오십 원. 재 작은 손이 족집게에 익숙해질수록 할머니 머리 위 흰 눈은 더 많이 쌓여갔다. 족집게로는 미처 잡을 수 없었던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다. / ‘흰머리 뽑던 날’ 중에서 27p
봄에도 여름에도, 겨울을 향해가는 가을에도 자연은 급한 것이 없다. “익어가는 것들은 숨 가쁘게 달리지 않는다”고 박노해 시인은 가을을 노래했다. 노란 잎도, 촘촘한 열매도 이내 떨어져 이리저리 나뒹굴다 흔적만 남겠지만,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람을 느끼는 나무는 의연하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자연은 서로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제 생긴 그 모습대로 잘 익어가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걸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 ‘익어가는 것들’ 중에서 4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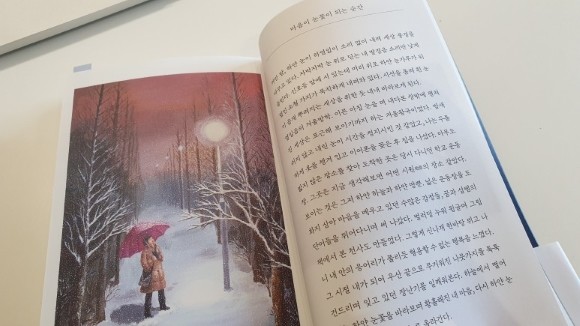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모이처럼 덥석덥석 받아먹고, 동네 친구들과 땅따먹기와 소타기말타기를 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난 시절의 내가 있었으니, 또 내 아이들의 뱃속에 하나하나 맛난 음식들을 채워주고 토닥토닥 잠자리를 봐줄 수 있는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리라. 그렇게 별 것 아닌 것들이 수놓은 일상이 내가 살아간 힘이었음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일상도 모든 게 위안이 된다. 그러니 조급해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아야지. 오늘 내가 양손에 쥔 두 아이의 손과 남편의 다정한 배려에 감사해하며 나의 일상을 사랑해야지, 하고 나를 다독여본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았으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