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와 내 사람들을
이해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외로워질 때,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 가슴 따듯한
이야기!
어느 TV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어쩌다보니 나도 어른이 되었다. 스무 살 때만 하더라도 서른 살을 넘기면 번듯한 직장과 유능한 직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서른 중반을 넘어선 지금도 여전히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기는 마찬가지고, 감정에 너덜거리고 팍팍한 현실에 몸과 마음이 뒤숭숭해지기는 매한가지다. 눈 깜짝할 사이 서른셋이 된 영오 역시
그랬을지 모르겠다. ‘삶의 길목마다, 일상의 고비마다, 지뢰처럼 포진한 질문이 당장 답하라며 날 다그쳐.’라고 쓴 그녀의 글귀처럼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당하는 정답들에 이렇다 할 해답을 내어놓지 못한 채 살아가기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어른들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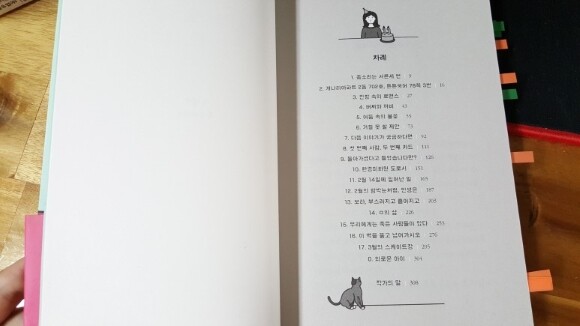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불빛이 있기에
올해로 서른셋이 된 주인공 영오는 중고생용 참고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편집자다. 새 학기를 앞두고 서점에 쫙 깔려야 할
참고서를 만들기 위해 새해 첫 날까지도 야근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다. 어느 날,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을 발견했다는 집주인의 전화를 받는다.
엄마의 압력솥이다. 뜻밖에도 그 안에 얇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홍강주, 문옥봉, 명보라 라는 낯선 이름과 연락처만 적혀 있을
뿐이다. 그간 폐암으로 엄마가 죽은 게 담배를 달고 살던 아버지 때문이라고 여기며 데면데면하게 굴었던 그녀로서는 수첩 속의 이름들을 외면해도 될
일이지만,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했던 학교의 교사인 홍강주를 만나게 되면서 뭔가에 이끌리듯 그와 함께 다른 두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한편 소설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미지는 문제집을 풀다가 재미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편집자인 영오에게 매일 전화를 거는 호기심 많은
소녀다. 그녀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린 아빠와 함께 엄마로부터 낡은 개나리아파트로 내쫓긴
상태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와의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공포감에 수시로 사로잡히곤 하는데, 그나마 영오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소소한 위안을 얻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미지는 옆집 할아버지인 두출의 고양이가 비상
가벽의 구멍을 통해 자신의 집에 드나드는 일을 계기로 몸이 불편한 두출을 대신해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게 되면서 세대를 넘나드는 우정을 조금씩
쌓아하게 된다.
소설은 영오가 아버지의 유품에 남겨진 낯선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나가는 여정과 미지가 두출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세상 밖으로 나서는
과정을 정교한 교집합처럼 엮어나간다. 그러면서 서른세 살이 된 영오를 통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팍팍한 삶과 고된 일상, 단절되었던
관계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며 그것을 하나씩 회복해나가는 과정을 그려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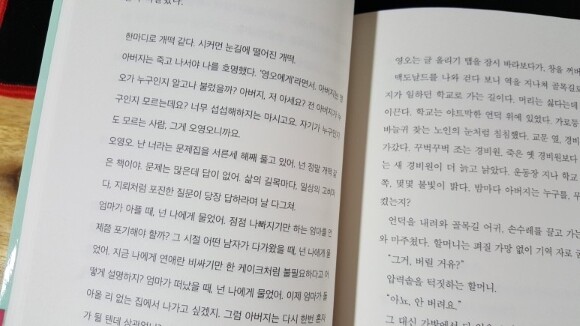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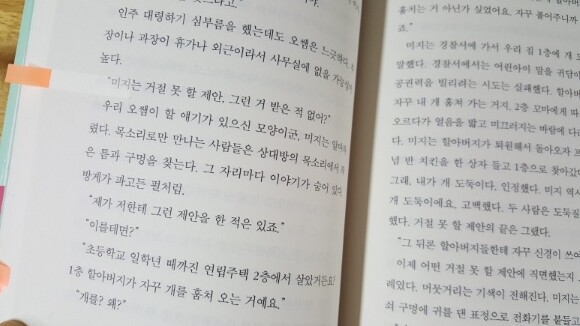
반면 미지라는 소녀를 통해서는 어른들의 분절된 세계를 특유의 유쾌함과 감수성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마련한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옆집에서 누가 죽어도 모를 이 세상에, 며칠째 인기척이 없는 두출네 비상벽을 과감하게 뚫고 미지가 옆집으로 넘어가는 장면은 이
소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가만 보면 서른셋이나 열일곱이나 이제 막 죽을 날을 앞두고 있다는 할아버지나 다들
저마다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아픈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이 없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인생에는 답이 없다고, 그 대신 사람들이 있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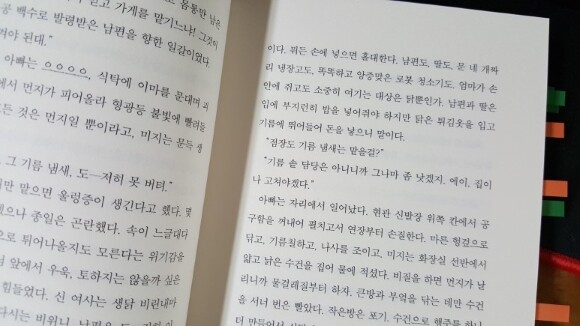
엄마는 삼 년을 더 살았다. 삶이라기보다는 투병이었고 사람이라기보다는 병자였다. 치료와 재발, 전이와
항암제, 고통과 구토. 최후의 몸무게는 33킬로그램. 영오는 3시 3분이나 3시 33분에 시계를 보게 되면 기분이 가라앉았다. 33번 버스가
싫었고 텔레비전에서 33번 채널을 삭제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서른셋이라는 나이가 싫다. 잊지 못했나 보다. / 38p
어찌 되었든 이렇게, 오늘도 돌아왔다. 열쇠를 신발장 거울에 붙은 조그만 고리에 걸었다. 이 하얀
플라스틱 고리를 샀을 때, 비닐 포장에는 200그램 이하의 물건만 걸라고 적혀 있었다. 영오는 가끔 고리를 살펴본다. 떨어지거나 망가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고리와 거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는 모른다. 영오는 그 작고 가벼운 플라스틱 쪼가리가 꼭 자기 자신 같았다. /
54p
“상처 없는 사람 없어. 여기 다치고, 저기 파이고, 중을 때까지 죄다 흉터야. 같은 데 다쳤다고 한
곡절에 한마음이냐, 그건 또 아닌지만 같은 자리 아파본 사람끼리는 아 하면 아 하지 어 하진 않아.” / 17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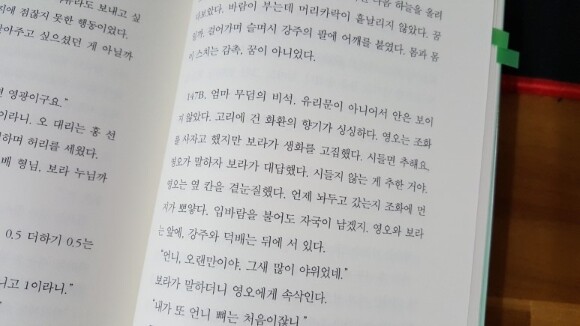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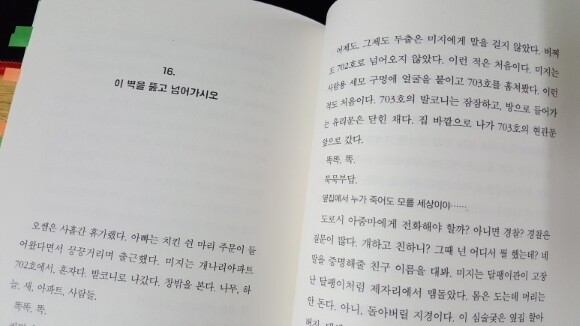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낯선 이름을 따라가는 데서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틈새를 서로가
메우는 과정에서 삶에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어쩌면 영오의 아버지는 자신이 채워주지 못한 부정을 다른 인연들로 하여금 채워주려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덕분에 참 오랜만에 착한 소설을 만난 기분이다. 소설을 읽으며 나의 부모와 내 이웃과 내 사람들을 여러 번 떠올렸다. 무심한
시선과 한 마디에 멀어졌던 관계들도. 사는 게 숨이 가빠서 잊었던 관계들에 가끔이라도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