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을 향한 애정과 업을 향한 신념의 글쓰기로 쌓은 자전에세이!
당신의 이야기이자, 나의 이야기기도 한,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대학시절, 나는 조교 언니로부터 한 가지 일을 의뢰받은 적이 있다. 60대가 되는 어르신인데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남겨보고
싶다며 대신 글을 좀 써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자서전을 출간하고 싶으신 건가, 당시만 하더라도 자서전은 잘 읽지 않는 편이라 막막하긴
했지만 일단 만나보겠노라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마치 우리네 고모 같은 인상의 어머니가 나를 반겨주어 흠칫 놀랐다. 게다가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서른 장 정도 되는 페이지에 짤막하게 몇 문장 쓴 자신의 이야기를 그럴 듯하게 정돈해달라는 정도의 가벼운 일이었다. 하지만 쉽게 수락했던 그
일이 생각보자 만만치 않음을 금세 느꼈다. 일면식도 없었던 누군가의 서사를 내가 함부로 재단하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 어쩐지 어쭙잖았던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꼭 책으로 내어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다던 어르신의 표정은 아직도 생생하지만 그 뒤에 정말로 책을 남겼는지는 알 수
없었다.
삶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기록하여 남긴다는 것은 ‘열린 자아’, ‘의식하는 자아’를 필연으로 마주하는 일이다. 비록 문장은 서투르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의 나열이었으나 그것을 오롯이 글로써 남기고 싶었던 어르신 역시 글을 쓰는 동안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기 결심을 여러 번 다짐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성장과 생애의 경험들을 써내려간 이낙진 저자의 <달나라로 간 소신> 역시 그러한 자기
발견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스스로는 서문에서 “책으로 책 잡힐 일을 벌인” 것이라는 우스갯소리에 “뭐 이런 걸 책으로까지 냈느냐?”고 타박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 겸손을 구하지만 이 글이 ‘나의 이야기 같아서’ 혹은 ‘나와는 다른 이야기’라서 기뻐하거나 아파하는 사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 것처럼 마치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나의 아버지가 떠오르는 이야기 같기도 해서 내내 마음이 그윽해지는 기분이었다.
각별하고 또 각별한 일상의
흔적들
총 15장으로 구성된 이낙진의 <달나라로 간 소신>은 저자의 유년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상을 기억하고 기록한
자전에세이다. 책의 각 장 앞부분은 2007년 가을에 쓴 글을, 뒷부분은 2018년 봄에 새로이 써 쓴 글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인생의 흐름과
의미를 하나의 표상으로 나타내려 한 듯 5장씩 나누어 ‘moderato', 'ritardando', 'a tempo'와 같이 박자의 빠르기
정도를 가리키는 음악 용어로 구분해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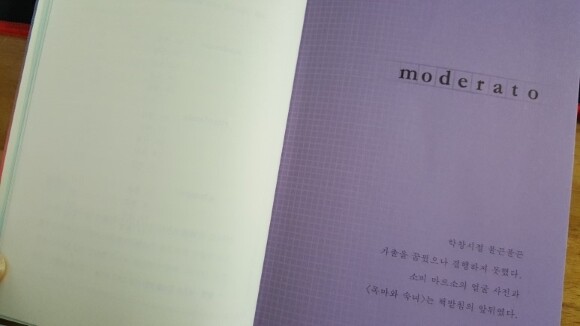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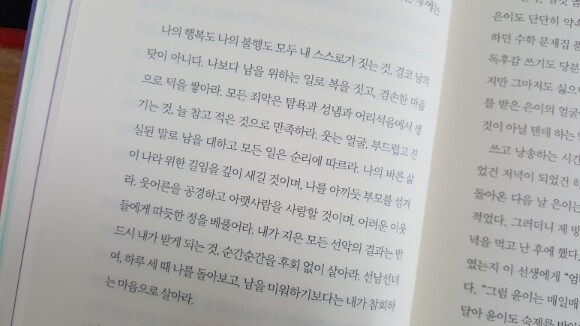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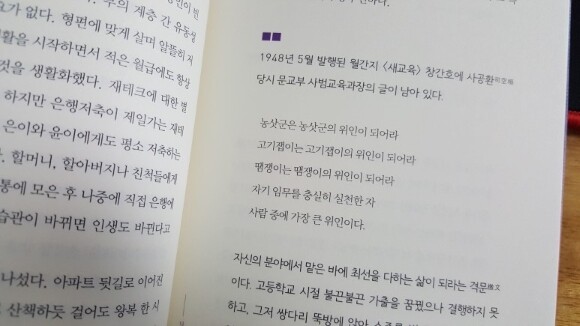
‘보통 빠르기로’라는 음악 기호를 나타내는 moderato 장에서는 두 딸과 교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와 공유했던 시간들, 가족이라는
정서가 전달하는 애틋함과 친밀함,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던 깡촌 고향에서 자연을 누볐던 유년의 추억들, 한국교총에서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 편집국장으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엿보이는 일화들을 술회한다.
그 중 이제 곧 두 아들의 엄마가 될 나의 입장에서는 두 딸을 기특하게 키워낸 아빠로서의 감정이 드러나는 에피소드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온다. 방학이란 것이 우리 시절과 같은 방학이 아니라 고단의 시간이 되어버린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 하나, 영어 문제 하나 더 풀게 하기보다
《법구경》을 외게 하여 어쩌면 평생을 아로 새길 구절 하나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준 이 부부의 결심이 대단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가 구절을 외울 때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고, 처음에는 삐뚤었던 글씨나 글자 크기가 점차 바르게 정돈되어 가는 과정을 보며,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나 역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아침부터 은이의 《법구경》 외는 소리가 우렁차다. 지난 휴가 때 화엄사에서 손수건만 한 크기의 보자기에
적혀 있는 <나를 다스리는 법>을 하나 사주었다. “매일 한 번씩 쓰고,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이번 방학의 숙제다. 대신 학원은
하나도 안 가도 된다. 실컷 놀아라.” 이 선생은 은이에게 다짐을 받았다. 은이도 단단히 약속을 했다...(중략)...일주일 정도 지나자 은이의
글씨가 훨씬 반듯해졌다. 처음 베껴 썼을 때는 글씨 크기도 울퉁불퉁 다르고, 줄도 안 맞았는데 많이 좋아졌다. 열흘 정도가 지난 후부터는 은이의
낭송시간이 되면 가족 모두 바르게 앉아 들어주기로 했다. 은이와 윤이는 바른 자세와 큰 목소리로 번갈아 낭송했다. / 33p
‘점점 느리게’를 뜻하는 ritardando 장에서는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던 저자의
고백처럼 딸들을 키워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에피소드와 부성애, 조상에 대한 뿌리 의식과 할머니에 대한 향수, 라면에 대한 각별한 추억들을
떠올린다. 잊히지 않고 내 안에서 천천히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에피소드들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할머니에 관한 일화는
8남매 중 막내였던 아버지 덕분에 항상 나를 끼고 주무셨던 할머니가 떠올라서 읽는 내내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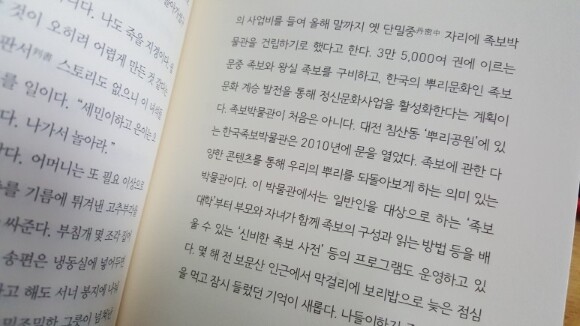
끝으로 ‘본디 빠르기로’를 가리키는 a tempo 장에서는 전두환 정권 시절, 대학생이자 학생기자로 활동하던 그가 데모와 투석전에
참여했다 유치장에 갇혔던 일화에서부터 처음 아내를 만나 그녀와 나누었던 편지들을 통해 오갔던 감정들, 교권회복운동에 대한 기자로서의 소회와 업에
대한 신념들을 기록한다. 비록 제목의 그것처럼 자신의 소신이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못하고 달나라로 가서 이상으로만 남아버렸음을 고백하지만, 아직도
불의에 저항했던 청년 시절의 의식을 잊지 않고 또 시류에 얽매이지 않으며 현실을 냉철하게 통찰할 줄 아는 기자 정신을 여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 나는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박탈당한 자유, 한 발짝
너머에는 있을 것 같은 자유가 그리웠다. 이념도 사상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철창 밖으로 한 발만 옮기고 싶었다. 3일째 되는 날은 울
지경이었다. 경찰관을 나지막하게 불렀다. “아저씨, 10초만 나가 있게 해주세요.” 자유는 쉽게 오지 않았다. 낮에는 그나마 조사를 받고,
조서를 쓰기 위해 이리저리 불려 다니니 견딜 수 있었다. 경찰들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나 《8억 인과의 대화》를 읽었느냐고 여러 번
캐물었다. 매뉴얼대로 묻는 경찰이 딱해 보였다. 3일 밤에 지나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저러한 죄목이 붙어 구류 5일을 먹었다. / 14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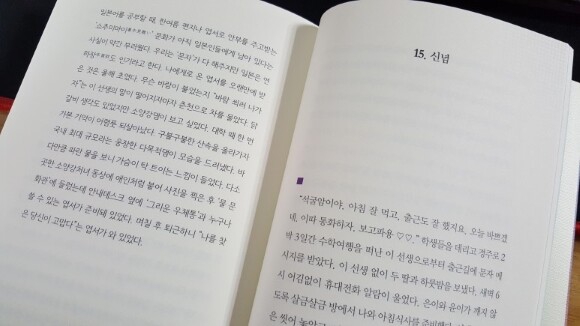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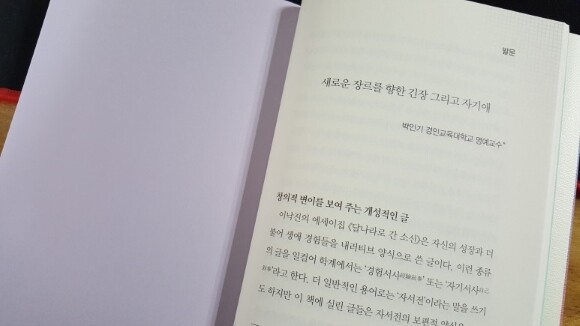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한 찰리 채플린의 말이 아니더라도 조바심 내지 않고 한 발 떨어져 보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다’던 저자의 말처럼 삶을 살게 하는 건 역시 양식처럼 채워나갔던 추억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록 삶은 팍팍하고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하나 없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웃고 울고 했던 기억들, 돌이켜보면 그게 다 아름다웠던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그 수많은
일화들이 나의 전부와 다름없었던 것이다.
<달나라로 간 소신>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과정 전부가 어쩌면 그 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내 이야기를 찾고 기록하는 일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기회가 있을
때 많이 읽으시라고, 많이 써보시라고 덧붙여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