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을 쓰는 이에게 삶은 늘
펜을 들어 '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상의 모든 통증에게 전하는 안부와 위로의 산문집!
백지, 그 무한한 영토 앞에서 나는 한없이 무기력해졌던 시절이 있었다. 글을 쓰는 것이 재미있어서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한 나는 불과 1년 만에 글을 쓰는 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프란츠 카프카와 알베르 카뮈 그리고 로맹 가리처럼 작품의 진폭을 넘나드는 생을
살아낸 것도 아닌 다음에야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야만 밋밋한 삶의 밑천으로 넉넉한 이야기를 일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기민한 감각으로
시류를 읽어내는 촉수 또한 날카롭지 못해서 늘 헛헛하기만 한 것이었다.
당시의 나는 글을 쓰는 이에게는 결국 '경험'이라는 것, 어머니 혹은 죽음으로 대변되는 원체험 같은 것은 동력들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또 절망했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가 함정임은 '소설가란 단 한 순간도 쓰지 않으면
사는 데 의미가 없다고 자각한 사람들이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것은 작가만의 운명이 아니다. 모든 인간의 속성이되, 대부분 쓰지 않을
뿐이다.'고 말한다. 어쩌면 나는 써야만 한다는 목표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내 단조로운 삶의 가벼움에 집착한 나머지 사사로운 삶 속에서 빛나는
혹은 뜨거운 그 어떤 순간마저도 간과해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 후회가 밀려들었다. 내가 펜을 들어야 했던 모든 순간이 곧 삶이었음을 나는 왜 진작
알지 못했던 것일까, 하는 그런 후회 말이다.
뜨거운 것이 목울대까지
맺혀 올라와 혀끝에 매달릴 때마다
<괜찮다는 말은 차마 못했어도>는 작가 함정임이 꾸준히 세상과 소통하면서 느끼고 쓴 것들을 엮은
산문집이다. 이사 갈 집을 볼 때, 서재와 책상의 위치를 정할 때, 열차를 타고 먼 곳으로 떠나고 돌아올 때, 그리고 누군가와 카페 또는 식당에
앉을 때, 늘 창의 위치와 창밖의 형편을 살핀다던 그녀의 고백처럼 그녀는 이쪽의 삶과 저쪽의 방향성을 살피며 세상과 관계한다. 세상과 소통하려
했던 수많은 예술가들과 조우하고, 창작자의 소명을 생각하며, 때로는 성난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한다. 암울한
시국과 각종 재난, 재앙이 몰아닥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광장으로 모여드는 광경 앞에서 '쓰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괜찮으냐고 묻지 않아도 마음으로 아는 일이고, 누군가의 손에 내 마른 손을 얹는 일이고, 누군가를 품고 순리대로 떠나보내는 일이라고'
여기며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보듬어 안아주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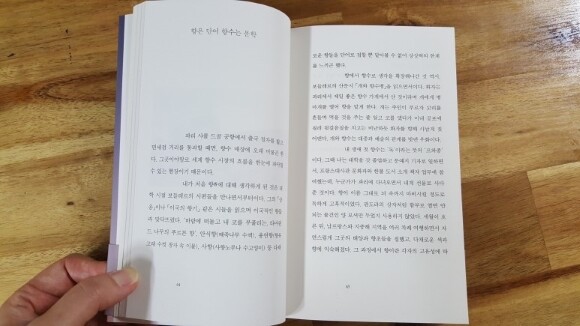

저자는 세월호와 촛불 혁명을 기점으로 한국 소설계에 유독 참사와 재앙, 애도의 서사가 많이 생산되는 모습을
눈여겨본다. 그 중 김애란 작가의 단편 <물속 골리앗>에서 '장마는 지속되고 수박은 맛없어진다. 전에도 이런 날이 있었다. 태양
아래, 잘 익은 단감처럼 단단했던 지구가 당도를 잃고 물러지던 날들이. 아주 먼 데서 형성된 기류가 이곳까지 흘러와 내게 영향을 주던 시간이,
비가 내리고, 계속 내리고, 자꾸 내리던 시절이, 말하자면 세계가 점점 싱거워지던 날들이 말이다'라는 문장을 인용하며 재앙과도 같은 현실과 재난
같은 시절의 서사를 그려낸 이 젊은 작가의 감각에 주목한다. 마찬가지로 알베르 카뮈는 <페스트>를 통해서 집단적인 공포와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반항 정신을, 편혜영은 <아오이 가든>에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광경을 극렬하고도 기형적인 공간으로 그려냈던 것처럼 한
편의 소설이, 한 명의 작가가 세상에 떨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통찰하게 한다.
부조리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엄연히 존재하나
마비되어버린 체제의 무능과 악화가 일으킨 총제적 난국은 <페스트>나 <아오이 가든>의 비인간적인 현실을 성난 눈으로
돌아보게 한다. 메르스 이후, 어떤 소설이 우리 삶의 부조리한 치부를 드러내 보여줄 것인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진실이라면, 아픈 눈으로
새겨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은, 제발 이번으로 족하다. / 73p
작가란 그저 이야기의 재미(오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의 맥락
속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과 흘러가는 시간에 맞서는 예술의 의미를 소설을 통해 던지는 존재이다. 뭇사람들의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어긋나고 응어리진 현실을 풀어주고 어루만져주는 존재가 작가이고, 소설이다. / 7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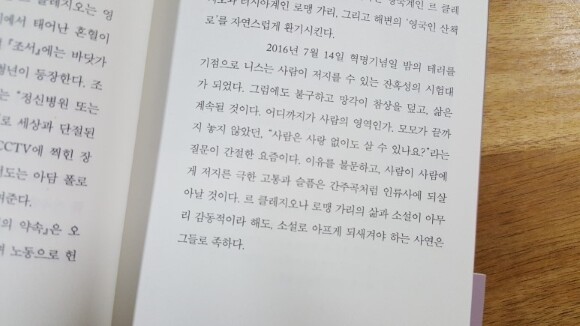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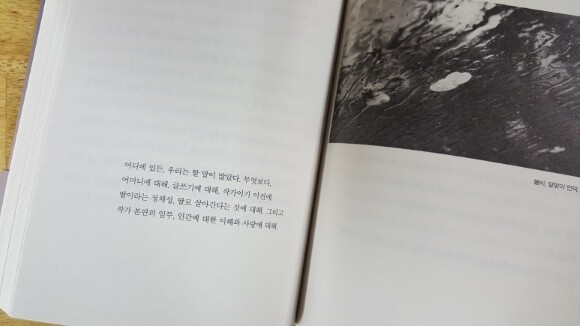
저자는 '현대의 속성은 견고한 것들이 촛농처럼 녹아내리고, 깃털처럼 부유하는 세계이다. 21세기의 시공간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기에 어떤 것도 고유하지 않다.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신문 지면의 힘은 인터넷 매체 환경에서 산산이 흩어졌다. 오로지 문학만이
덧없음에 맞서 내가 겨우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이 때로 아름답다는 것을 되새겨줄 뿐이다.'고 고백한다. 이제는 다양한 매체와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어디서든 쓸 수 있고 어디서든 자신의 글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문학'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여전히 치열하게 살고 싶고, 그
안에서 존재감을 찾고자 하는 소설가의 고뇌가 유독 나의 마음을 두드린다. 너도 그런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문학을 하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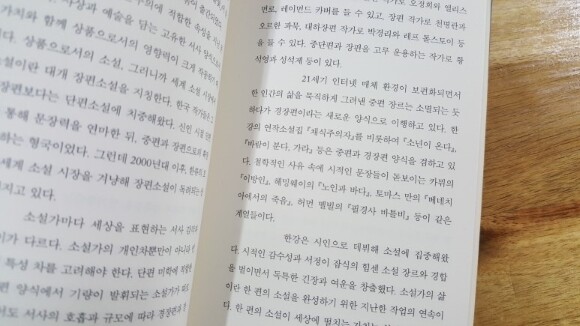
달맞이 언덕에서, 톨스토이 무덤에서, 포틀랜드행 열차에 오르면서 그녀가 사유한 것들과 기록한 문장들을 들여다보는
일이란 건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니지만,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단어 하나 감정 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나만의 속도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괜찮다는 그 말 하나 뒤에 나는 또 얼마나 수많은 감정들을 삼켰을지, 그때마다 나도 나를 위해 한 번 글로 써보자고,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