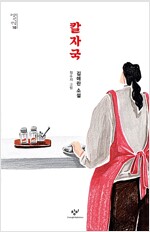말 잘 하거나 글 잘 쓰는 사람을 두고 ‘언어의 연금술사‘라 이름 붙이기도 한다. 소설가 김애란이라면 그 칭호를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 가난과 남루도 그녀의 문장을 거치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난다. 헐렁하고 구멍난 메리야쓰 난닝구마저, 눈물 닦아주는 보송보송한 면 손수건으로 바꾸는 솜씨.
어머니가 오랫동안 꾸린 국수 가게에서 먹고, 자고, 자랐다는 김애란이 단편소설로 그 가게를 되살렸다.
˝어머니의 칼끝에는 평생 누군가를 거둬 먹인 사람의 무심함이 서려 있다. 어머니는 내게 우는 여자도, 화장하는 여자도, 순종하는 여자도 아닌 칼을 쥔 여자였다.˝
˝나는 어머니가 해 주는 음식과 함께 그 재료에 난 칼자국도 함께 삼켰다. 어두운 내 몸속에는 실로 무수한 칼자국이 새겨져 있다. 그것은 혈관을 타고 다니며 나를 건드린다. 내게 어미가 아픈 것은 그 때문이다. 기관들이 다 아는 것이다. 나는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물리적으로 이해한다.˝
˝아버지는 웬 뜨내기 여자와 커플링을 하고 다녔다. 그녀는 나이 많고 몸매 좋은 때밀이였다. ... 이웃 여자는 말했다. 그 집 아저씨, 때밀이 여자 퇴근할 때마다 문 앞에서 ‘히야시‘된 바나나 우유를 들고 서 있는다 하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