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좁은 문 ㅣ 열린책들 세계문학 243
앙드레 지드 지음, 김화영 옮김 / 열린책들 / 2019년 10월
평점 :




좁은 문
앙드레 지드 | 김화영 옮김 | 열린책들
세계문학 / p.264
👩 제롬! 네 곁에서 나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행복을 느끼고 있어……. 하지만 정말이지, 우리는 행복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 인간의 영혼이 행복보다 더 바랄 수 있는 것이 뭐지?
👩 성스러움…….
나의 모든 행복이 날개를 펼치고, 나에게서 벗어나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다. p.140
인간의 뇌는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작동하다가 단 한 번 뇌가 멈출 때가 있다고 한다. 그건 바로 사랑에 빠졌을 때! 그만큼 사랑에 빠지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게 아닐까? 온전히 그 사람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오래 함께 있고 싶어하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콩깍지가 씌이는 마음.
그런데 이 두 남녀는 사랑하는 사이가 맞는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 누구보다도 제롬을 사랑한다는 알리사였지만 서로 떨어져 지내며 온전히 서로의 마음을 편지로 주고받으며 보이던 알리사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엔 그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고통받는 제롬을 보며 그녀가 가스라이팅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녀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린 시절, 제롬의 외숙모이자 알리사의 어머니가 불륜으로 집을 가출하고, 그 사건으로 비통함에 젖어 있는 알리사를 위로하던 제롬은 세상 모든 공포와 악과 삶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리라 결심한다. 그렇게 둘은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공부와 노력, 자선 등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바치는 그를 알리사는 사랑함과 동시에 거부한다.
그의 약혼을 피했고, 떨어져 지낼 때 자신을 보러 오겠다는 그에게 다시 만나는 즐거움을 위해 너의 여행을 단축하지 말라며 우리는 서로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만약 그가 자신에게 온다면 자신은 도망쳐 버릴 것 같다고까지 말했으며, 나중에 자신의 여동생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그를 포기하려 했다. 그리고 편지에선 그를 사랑한다던 그녀가 막상 그를 만날 날이 다가오면 불안해하며 두려움을 느꼈고, 만남이 이루어진 자리에선 다른 사람 없이 둘만 남겨지길 거부했다.
무엇보다 자수정 십자가를 건네주며 자신에 대한 추억을 간직했다가 그의 딸에게 주라고까지 말하던 그녀.
그가 그녀와 결혼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와 결혼을 한단 말인가? '정말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실제 하는 알리사와 편지에서의 알리사의 괴리감이 점점 커질수록 '도대체 왜?'라는 의문도 함께 커져갔다. 그리고 이 의문은 후에 그녀가 남긴 일기장을 통해 풀린다.
왜 그녀가 자신에게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이루어졌을 때 왜 행복감을 느끼는 듯했는지, 그러면서도 왜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누가 복음에서 빌려온 것으로 어려운 구원의 길을 뜻한다. 구원이 덕을 쌓은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라는 준엄한 도덕에 바탕을 둔 종교적인 가르침을 함축하는 제목으로 이 소설의 이야기 많은 부분 작가 자신의 자전적 경험이 녹여져 있다.
가톨릭이었다가 개신교도가 된 노르망디 쪽 혈통인 모계와 개신교인 남프랑스 쪽 부계의 혈통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집안에서 자란 저자는 극도로 엄격한 청교도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그의 영혼과 육체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다고 한다.
육체의 혐오, 덕목 자체에 대한 숭배를 하며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킴으로써 모든 삶의 기쁨을 없애던 개신교. 희생정신이 폭군처럼 존재를 지배해나가던 알리사의 모습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는 건 그래서 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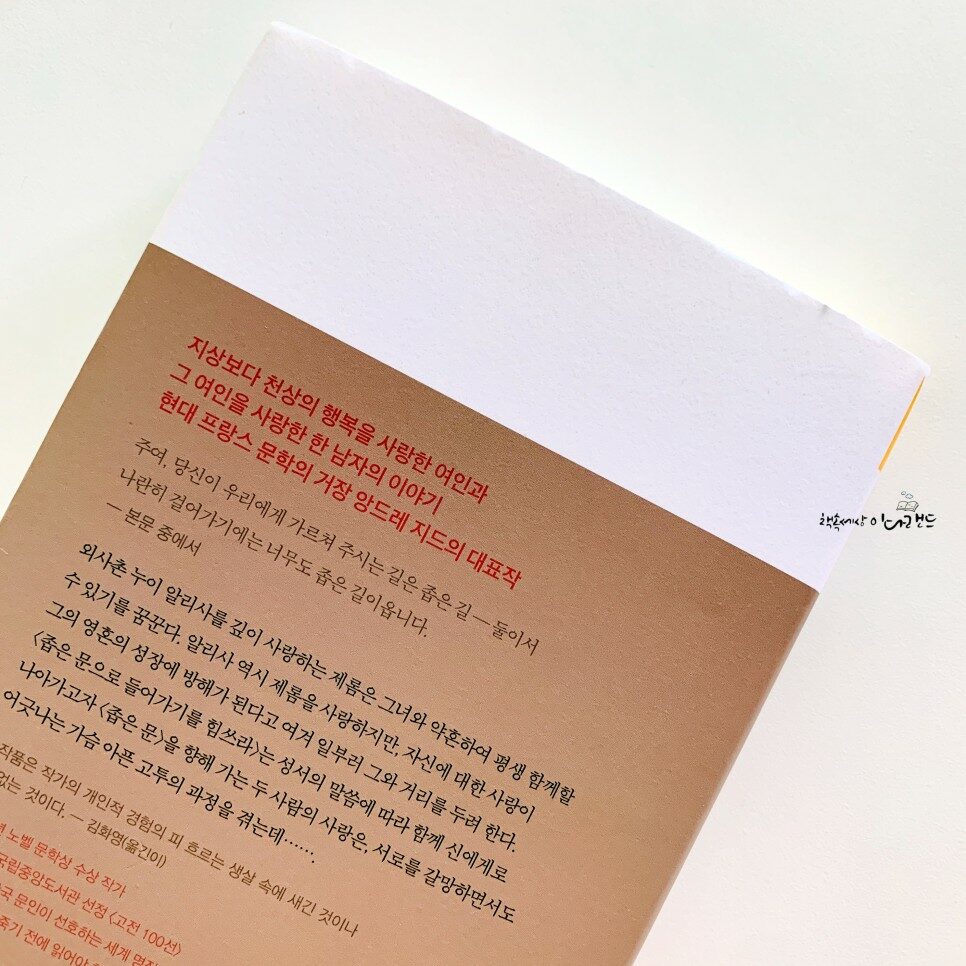
살아오며 끊임없이 기독교와의 인연은 있었으나 여전히 무교인 나는 그 세계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 절실한 믿음 앞에 응답을 들었다는 사람들을 볼 때도 딴 나라 이야기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에 대입해 보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꼈던 게 더 컸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어느 한 쪽으로도 끌어가지 못하던 제롬마저도.
단지 종교를 떠나 그를 만나기를 거부하면서도 그와의 사랑은 이어가던 알리사가 정신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실제는 단념할 수 있다 믿었던 그녀가 그저 안쓰럽다. 그녀는 지상 세계나 육체의 세계와 멀리 떨어진 하느님 안에서 진정으로 그를 만날 수 있었을까?
어머니의 불륜에서 오던 죄의식과 종교 윤리의 벽에 갇혀 자신의 희생으로 그의 행복을 더 바랐던 그녀의 힘들었을 고행이, 모순된 행동들이 저자에 의해 섬세하게 묘사되면서 그 심리에 푹 빠져 읽었던 이야기. 정말 재독, 삼독해보고 싶었던 이야기였다.
맨 처음엔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이 그를 하느님께로 기울어지게 했지만, 지금은 그 사랑이 그것을 방해한다. 그는 내 곁에서 머뭇거리고, 나를 더 좋아한다. 그리하여 나는 그가 덕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우상이 되고 있다. 우리 둘 중에서 한 사람은 거기에 도달해야 한다. 비겁한 제 마음속에서 저의 사랑을 극복할 가망이 없사오니, 하느님, 제발 그에게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도록 가르쳐 줄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러면 저의 공덕보다 비길 데 없이 더 나은 그의 공덕을 당신께 바칠 것이오니…….
오빠는 참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래, 언제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을 거야?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 때까지.
무엇을 곧 잊고 싶은데?
언제까지나 잊고 싶지 않은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