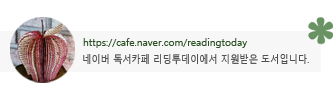죽은 사람들
제임스 조이스 | 열린책들
세계문학 중단편 / p.121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 모두 망령이 되어 가고 있었다.
나는 세트에서 책을 읽는 순서를 정할 때 책 제목에 가장 많이 좌우되는 거 같다. 그렇게 처음에 ‘행복’이라는 단어에 이끌려 ‘행복한 왕자’를 읽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읽게 된 「죽은 사람들」은 순전히 제일 먼저 책 사진이 그럴듯하게 찍혀서 선택된 책이다.(책 사진이 없음 책을 펼치지 못하는 이 현실ㅋㅋ)
아마도 책 제목만 보고 선택이 되었다면 제일 마지막에 읽었을지도... 죽음론을 읽으며 한 발자국 나아갔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를 멈칫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랬나?! 정작 책을 읽을 때 내가 ‘죽은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이야기가 끝나고 작품 해설을 보고 나서야 ‘아... 나 죽은 사람들 읽고 있었지’ 했던 이야기. 너무나도 숨 쉬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유독 죽음만 외면받으며 뒤늦게서야 그 속에 품고 있던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 담겨있던 '죽은 사람들'이었다.
크리스마스 날 매년 열리던 모컨 자매의 연례 무도회에 갔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그곳에서 들은 노래로 옛 죽은 사랑을 떠올리고 울음을 터트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오늘따라 아름다워 보였던 아내에게 정욕을 불태우려 했던 그는 아내의 태도에 처음엔 질투를 하다 슬픈 사연을 듣고 관용의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가 살아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은유적 암시가 주어진듯한 이야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일까? 과거 아내의 옛사랑? 지금 현재의 주인공 또는 파티에 모였던 사람 혹은 미래의 나? 어쩌면 저자가 말하는 '정신적으로 마비'된 모든 현대인들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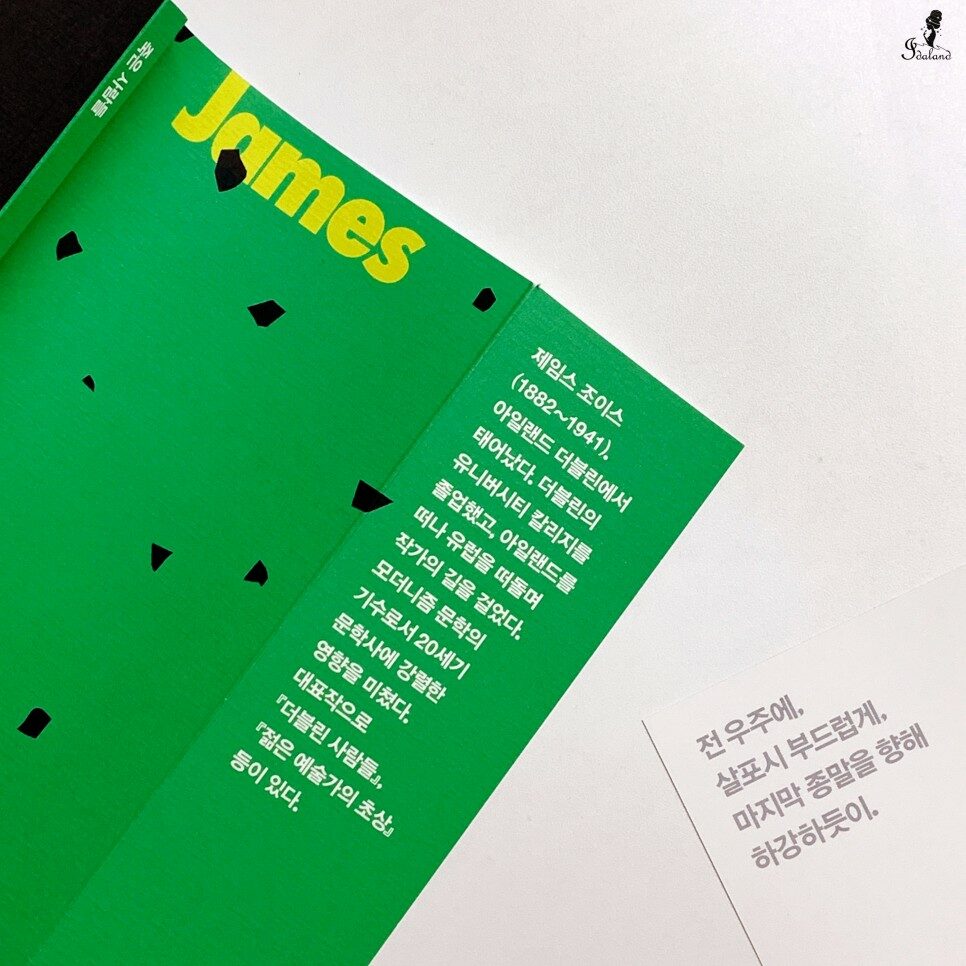
이 책의 저자 제임스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소설가이자 시인으로 37년간 망명인으로서 국외를 방랑하며 아일랜드와 고향 더블린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집필했고, '더블린의 사람들'과 '율리시스' 등의 대표작을 가지고 있다. 이번 「죽은 사람들」을 포함해 수록되어 있는 3편 모두 '더블린의 사람들' 단편집에 수록된 작품이라고 한다.
이웃집 누나를 짝사랑을 하는 소년의 마음이 뜨겁게 느껴졌던 첫 번째 이야기 애러비. 첫 이야기부터 급전개로 이야기를 끝내며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함께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 왜 이런 거예요?’라고 물어보게 만든 이야기였다.
여러 사람의 의견과 이야기를 여러 번 되짚어 보니 내가 그 소년의 나이를 잊은 채 어른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읽었다는 걸 깨닫는다.
그녀의 이름은 나의 어리석은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소환장 같았다.
학교 수녀원의 피정 일정으로 자신은 가지 못하는 애러비 바자에 너는 가냐고 처음으로 그녀가 그에게 물어왔다. 그 말에 그는 가게 되면 그녀에게 선물 하나 사다 주겠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가기 위해 숙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당일 숙부님을 기다리며 돈을 받아야만 갈 수 있었던 소년이었다.
그래, 소년! 그래서 그가 허영심에 속고 놀림당한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괴로움과 분로로 타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당일 기다리던 소년을 잊고 늦게 들어온 숙부님으로 인해 거의 끝나가던 바자에 도착해야 했고, 열린 상가에 갔으나 선물은 사진 못했던 그 소년에게 이 모든 상황들은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맛보게 된 좌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괜히 그 앞에서 서성이던 그 소년의 짝사랑이 이렇게 끝이 난 거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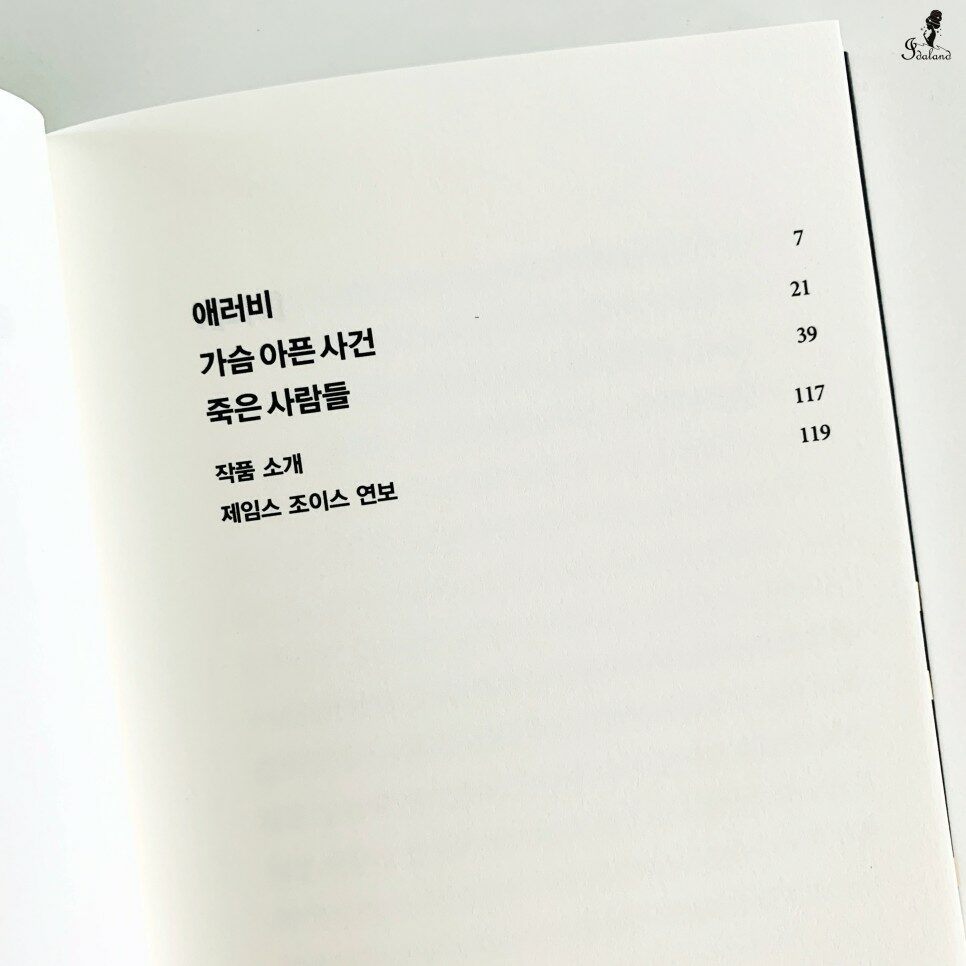
왜 그녀에게서 삶을 빼앗았던가?
왜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던가?
동료도 친구도 종교적 신조도 없이 자신의 정신적 삶을 살아가는 고독한 인물 더피씨, 그가 유일하게 즐기는 것은 오페라나 음악회에 가는 일이다. 그곳에서 시니코부인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된 첫날 이후 우연이 계속되자 그녀에게 만날 것을 제안한다.
그는 그녀에게 책을 빌려주었고 생각을 제공했으며 그녀와 자신의 지적 인생을 공유한다. 외래종 식물을 위한 따뜻한 토양 같았던 그녀가 어느 날 정열적으로 그의 손을 잡고는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갔다 되면서 이 관계는 끝이 난다. 더피씨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 정신적인 교감만을 원했던 그.
하지만 둘을 묘사하는 부분(그녀는 종종 등불을 켜지 않은 채 그들에게 어둠이 그대로 내리 덮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둡고 은밀한 방, 그들만의 고립된 상황, 그들의 귀를 울리던 음악 소리가 그들을 결합시켰다. p.29) 들에서 더 진도가 나간듯한 느낌을 받았던 나.(음란마귀가 씐 것인가ᄏᄏᄏ)
그리고 몇 년 후의 그녀의 죽음을 신문으로 접하게 된 그는 불쾌감을 느끼며 그녀를 문명에 짓밟힌 패배자 중 한 명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곧 그녀의 죽음에 자신이 준 영향을 되돌아보며 4년 전 그녀와 함께 걸었던 길을 찾아가 걸으며 그녀의 목소리를 그녀의 손이 자신의 손을 잡는 것처럼 느끼고선 자신의 도덕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낀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유부녀였던 그녀를 사랑할 수 없었고, 자신이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았던 그는 자신에게 용기 내어 먼저 다가온 그녀를 거절하며 끝내는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 자신이 불행하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 못했던 그를 보며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만든 굴레 속에서 안주하며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건지 생각해 보게 만든다.
그는 자기 인생의 청렴함을 곱씹어 보았다. 그는 자신의 삶의 축제에서 추방되었음을 느꼈다. 한 인간이 그를 사랑했었던 것 같았지만 그는 그녀의 삶과 행복을 거부했다. 그녀에게 불명예, 부끄러운 죽음을 선고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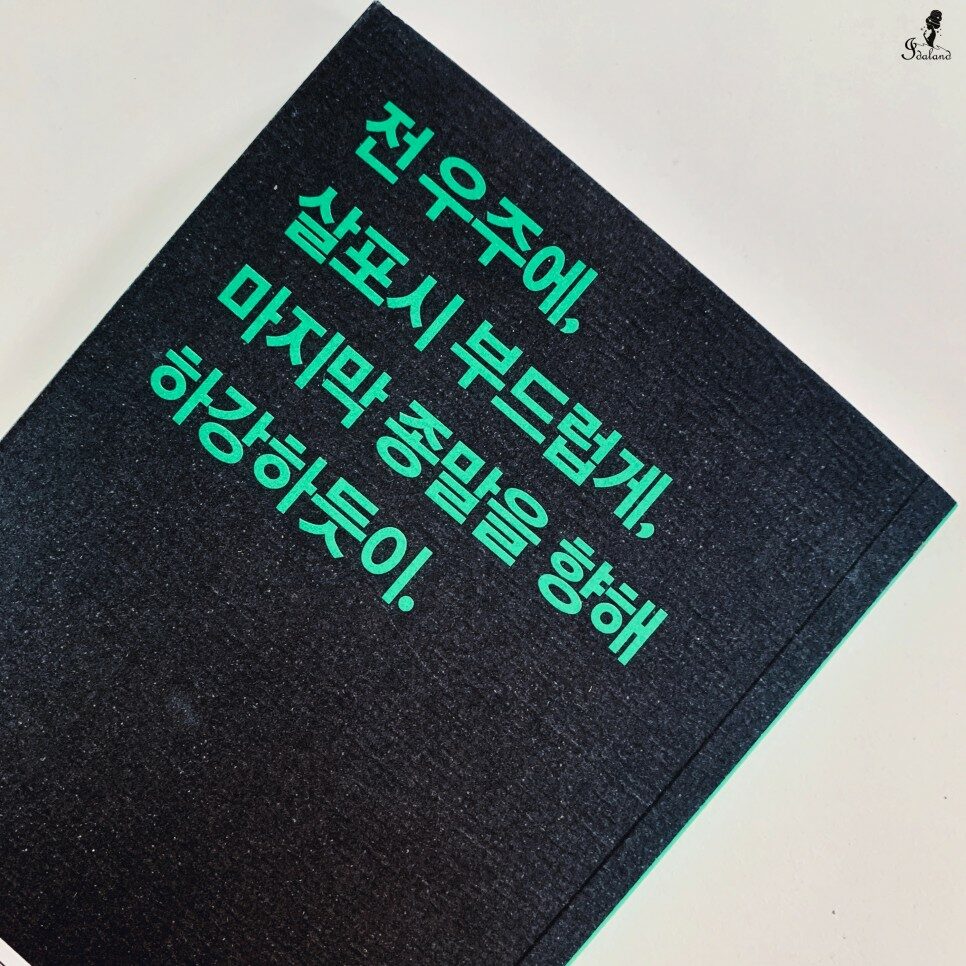
뛰어난 묘사력에 각 이야기마다 온전히 빠져 읽었다. 앞서 읽은 두 단편은 한편이 끝날 때마다 임팩트가 강해 그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전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마지막 이야기 ‘죽은 사람들’은 임팩트가 약하게 느껴져 아쉬웠다.
저자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삼부작으로 불리는 '더블린 사람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율리시스'에는 동일한 등장인물이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세 편을 이어 읽으면 좋다는데... 어떻게 책을 읽어갈수록 읽어야 할 책이 추가가 계속되는 기분이다. ㅋㅋ 언젠가 또 읽을 거라며 우선 읽을 목록에 추가를!^^
ps. 저자 제임스 조이스는 14세 처음으로 더블린 사창가를 드나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해방감과 죄의식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에 빠지기도 했다는 그가 두 번째 이야기 ‘가슴 아픈 사건’에서 엿보이는 건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