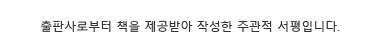-

-
집이 거울이 될 때 - 옛집을 찾았다. 자기 자신을 직접 이야기한다. 삶을 기록한다. 앞으로 걸어간다.
안미선 지음 / 민음사 / 2021년 6월
평점 :




새벽에 깻잎에 간장을 바르던 어머니가 기대어 있던 벽,
자다 깨어 우는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쳐다보던 벽,
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다가 마주 보게 되는 벽,
새벽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는 벽,
그 벽 안에는 무슨 말이 켜켜이 있을까?
벽이 모두 거울이라면 여자들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
책을 읽기 전 그리고 초반에는 살아왔던 집에 대한 추억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래서 처음 작가가 태어난 집을 찾아가 추억을 회상하는 부분에선 나 또한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집을 떠올렸다.
재래식 변소를 만났을 땐 '아! 정말 그땐 그랬지!' 지금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거라며 혼자 재밌는 상상을 하기도 했고, 동네 꼬맹이들 그리고 언니, 오빠들과 편을 먹고 ‘꽃 찾으러 왔단다’부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방구’, ‘피구’ 등 매일 함께 놀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집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집을 보러 가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온전히 담겨 있는 그곳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카메라를 들고 집을 찾아 나섰다는 저자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마주보기 시작한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집’, 나의 삶이 온전히 담겨 있는 ‘집’, 그곳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외면해왔던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책, 왜 제목이 「집이 거울이 될 때」였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어릴 적 보았던 제비가 그때와 지금을 이어주는 객체가 되었듯, 그림자 또한 그때와 지금의 저자를 이어주는 객체가 된다.
정전이 되면 촛불을 켜놓고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서 나비나 개 모양을 만들며 만났던 그림자를 어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끊어졌던 유년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이어주는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세월에 지친 자신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은 거 같았던 그림자에서 자신 속에 감춰진 여전히 꼿꼿하게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한다.
또한 냉장고 문에, 의자 팔걸이 아래쪽 금속 테두리에, 문 손잡이에, 샤워기에, 냄비 등 집 곳곳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알지 못하던 얼굴들을 마주 보게 된다.
그림자와 집 곳곳에 비추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저자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읽다 더해진 사진을 보다 보면 나 또한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힘들어했을 어렸을 때의 저자와 최근 북토크로 만났던 저자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인지 더 마음속으로 다가왔다. 특히 추천하고 싶은 대상에 대한 독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며 눈시울을 붉히던 저자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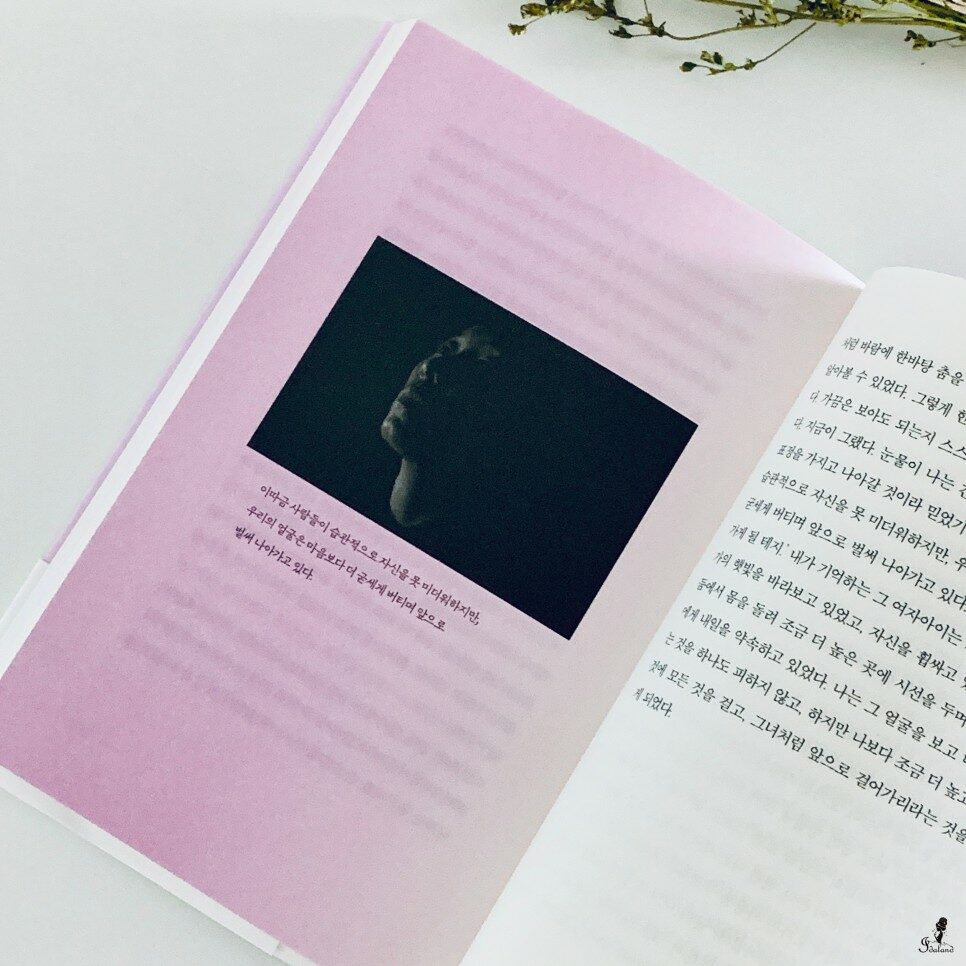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고,
그 손을 잡고 바로 이 계단을 내려오고 싶었다.
그 어두웠던 계단을 같이 후다닥 뛰어 내려오고 싶었다.
그 손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달아나고 싶었다.
내가 버리고 온 나에게 그걸 해주고 싶었다.
나는 충분히 아름답고,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그 말을 해주고 싶었다.
그 말을 스스로 믿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너무 늦게 찾아왔다고, 미안하다고 말해 주고 싶었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던 난, 고2 때 서울로 올라와 살게 되었다. 여름이면 걸어서 바다를 볼 수 있었던 그 동네, 학생 시절에 매일같이 출석 도장 찍었던 책방이 있던 그곳을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결혼하고 전국 일주할 때 한번 다녀온 적이 있다. 피구할 때마다 공이 넘어갔던 담벼락부터 어두울 때 무서워 조마조마한 맘으로 뛰어다녔던 골목길 모든 것이 그대로였으나 그 책방이 사라져 아쉬워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나의 시야가 달라져 그 세상이 달라 보였다. 이곳이 이렇게 작았었나?!
내가 살았던 그 특정한 시대 속 나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곳을 찾았을 때의 느낌은 그저 이것이 다였던 거 같다. 그래서 저자가 ‘집’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손을 내밀던 이 이야기는 나에게 너의 어린 시절은 괜찮았냐고, 네가 살아오면서 지나쳐온 집들에 담겨있는 삶은 어떠냐고 물어오는듯했다.
나의 삶이 온전히 담겨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언젠가는 과거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집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나와 함께 했던, 하고 있는, 할 집들 속에 내가 담고 싶은 삶은 무엇일지 생각하며 저자처럼 나도 내가 돌보지 못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본다.
저자와 함께 잠깐이나마 떠올려봤던 집과 동네에 대한 추억에 슬며시 웃음도 지었던 이야기 그리고 집을 통해 나의 내면을 마주해볼 수 있었던 힐링의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