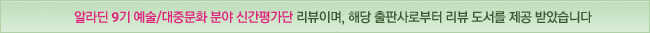[우리 기억속의 색]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우리 기억속의 색]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우리 기억 속의 색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권장도서
미셸 파스투로 지음, 최정수 옮김 / 안그라픽스 / 2011년 8월
평점 :



‘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시각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색이란 정상적인 시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색이라는 것이 단지 시각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눈을 감고도 느끼는 색감과 오감을 통해 다르게 느끼는 색감, 기억 속에서 달라지는 혹은 모노톤이 되어버리는, 이 모든 현상에서의 색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기억 속의 색,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색의 다양한 이미지를 글로 재현한다. 그 개인적인 경험과 이 노장의 연구가만이 할 수 있는 당시의 색에 대한 사회적인 시점을 짚어낸다. 오래전 저자의 어린시절 이야기들이 흥미롭기도 하지만 꽤 버라이어티 했던 세계사 안의 특히 저자가 거주했거나 여행했던 곳에서의 다양할 수 밖에 없었던 색의 의미, 즉 색의 역사 정도가 그의 에세이에 담긴다는 점에서 단연코 색 연구가의 글임도 잊지 않는다.
색의 의미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르니 보편적인 색의 의미에 대한 글 따위는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가 색이라는 소재로 책을 쓸 때 개인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글쓰기 작업이었을 것이다.
또한 저자의 말대로 색에 관한 책에서 색을 가진 이미지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것도 저자의 색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작업이었다. 저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색이란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시대, 지역 뿐 아니라 각각의 개인 안에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다. 우리가 똑같이 본다고 절대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의 기억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역사책을 보는 듯도 하고 할아버지 옛 시절 얘기를 듣는 하여 흥미로웠는데 저자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더 실감이 나고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다. 특히 컬러영화의 등장에 대한 엄격한 자본가들의 경박하다는 평가들이 있었다는 게 흥미롭고 이해가 갔다. 관음증적 매체인 영화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컬러를 가질 때 관음적 대상으로서는 더 노골적이 된 것일테니 말이다. 보수적인 이들에게는 이는 어떤 광경이건 간에 엿보고 있다는 죄책감을 가중시켰을 것이다. 이는 영화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했다. 무의식적인 도덕적 거부감과 이유없어 보이지만 상스럽게 여긴 이러한 시각매체의 성격을 색의 여부와 결부지어 생각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또 우리나라의 어휘가 굉장히 색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 오감으로 함께 표현되는 단어들에 대해 저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해졌다. 매우 흥미로워하지 않겠는가. 그가 설명하는 프랑스 혹은 유럽에서의 다양한 색에 관한 표현들(영어 보다는 훨씬 많은 듯해보였다)보다 더 풍부할 것이 분명한 한국어의 매력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시각과 촉각, 후각과 미각, 청각... 우리 말은 시적이어서 공감각적 색 표현으로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색을 말로 전달할 때 형용사는 기본이고 여러 조사들을 붙여서 느낀 색을 전달할 수도 있다. 물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색이란 보여줘도 각자가 느끼는 색감이 각각 다를 것이고 또 다르게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색의 정확한 시각적 제시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색상표 또한 그렇고 이는 컴퓨터로 이미지 작업 혹은 같은 색을 공유해야 하는 공동작업에서나 유효한 것이며 결코 같은 느낌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책을 덮고 나 또한 색에 대한 에세이를 써본다. 내 기억 속의 색과 당시의 사회적인 색은 어떤 차이와 접점이 있었을까. 내 기억 속의 색은 완전한 것인가. 빛바랜 사진과 같은 혹은 흑백사진이 되어 버린 장면들의 본래 색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기억의 간극을 나는 색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메꿔간다. 색인지 글자인지 모를 것들로 가득 채워진 하나의 에세이가 머리 속에 쓰여지는 듯 하다. 온도와 기후와 같이 있는 사람 혹은 주변의 사물, 나의 건강과 컨디션... 이 모든 것이 기억 속의 색을 자꾸 변화시킨다. 기억 안에서 색들은 매번 다른 색이 되고 어떤 색에 대한 선호도도 자꾸 뒤바뀐다.
몇 년 전에 색에 대한 책을 찾다가 독일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한 색의 느낌, 색에 대한 감정과 이성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당시의 그 사회의 선호되는 색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있는 책을 보게 되었다. 우리가 색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정도이다. 좋아하는 색, 긍정적인 색, 어떤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색이라고는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밝힐 수 없다. 무의식적으로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테니 말이다.
하지만 분명 이 개인적인 경험이란 또 결코 개인의 것만은 아니어서 보편적인 색의 선호 또한 가능해진다. 사회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강요되는 색이 분명 존재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호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뿐 아니라 상업적인 상품과 광고 노출의 정도만으로도 이러한 색의 선호도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자의 에세이는 색채연구가로서의 색의 이데올로기성을 에세이라는 형식을 통한 것만으로 증명하는 작업이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책이다. 아마도 색 이라는 분야에서 오랜 시간 연구한 거장만이 할 수 있었던 작업임에는 분명하다. 글의 흥미로움을 떠나서 색의 이데올로기성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시각적 이미지로는 불가능한 일일테니 말이다.
이런 색에 대한 에세이 방식과는 다른 저자의 저서일, ‘악마의 무늬, 스트라이프’ 와 블루와 블랙에 대한 색의 역사라는 책이 무척 궁금해진다. 하지만 그 색의 역사에 관한 책보다는 이 ‘우리 기억 속의 색’이 한평생 색채 연구에 시간을 쓴 노장 연구가의 색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는 책일 것이라는 데는 확신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