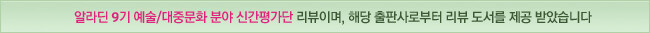[우리 기억속의 색]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우리 기억속의 색]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우리 기억 속의 색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권장도서
미셸 파스투로 지음, 최정수 옮김 / 안그라픽스 / 2011년 8월
평점 :



오감 중에 최초의 기억을 자극하는 감각이라면 역시 시각일 것이다. 나는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장면을 '흰색'이라는 강렬한 이미지로 기억한다.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서 고아가 된 것 처럼 막 울고 있던 나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서 처럼 카메라가 360도 트래킹을 하며 나를 내려다보는 것으로 이미지화 되어있다. 기억은 어떻게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틀어지고 변형되는 듯하다. 어렴풋하지만 목이 터져라 울던 내 울음소리, 이윽고 손에 백원을 쥐어 주던 '흰색' 옷을 입은 아저씨의 음성이 강렬하게 남아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흰옷을 입은 사람은 의사였던 것 같다. 상냥하게 ‘왜 우니?’라고 물어와 준 의사 덕분에 나는 이내 울음을 그쳤고 내가 생각하는 '흰색'의 이미지는 '황량함과 외로움'인 동시에 날 구원해준 '상냥함'의 색이다.
우리가 본다는 것에 대한 인상은 인지체계에 거의 모든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듣고 알게 되는 감각은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시각의 전형을 빌릴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감각들도 마찬가지다. 시각은 여느 감각에 비해 가장 사실적이고 있는 그대로의 ‘바라봄’을 우리 뇌리에 옮겨 심는다. 물론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대로의 변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에 따른 변형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인간적인 매력 가운데 하나이지 싶기도 하다. 어쨌든 시각으로 우리는 거의 모든 이미지로의 '앎'을 그려내어 살아간다.
<우리 기억 속의 색>은 프랑스 색의 학자 미셸 파스투로가 전 생애를 걸쳐 바라본 색의 향연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기억하는 최초의 기억부터 해서 거의 모든 삶의 전반을 돌아보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색을 통해 관통하는 인생의 이색적인 회귀를 보여주는 한편 색에 깊이 관여하는 역사, 문화적인 색의 고찰을 깊이 성찰한다. 크게 일곱 챕터로 나누어 기억을 위한 색이라는 주제로 의복, 일상생활, 예술과 문학, 스포츠, 신화와 상징, 취향, 단어들에 이르는 총망라된 색의 모든 것을 다뤄낸다. 아닌 게 아니라 이토록 색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 일이 있었던가 싶게 기억에 입힌 색을 만져보고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였던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준다. 특히 알지 못했던 색에 얽힌 역사적 일이라던가, 상징하는 색의 서로 다른 의미, 명명함의 애매함 등을 알게 된 것은 색의 또 다른 이면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정보다.
색에 대한 이론을 전달하는 방식 대신 그의 어법은 내내 그 개인의 삶에서 배어나온 색의 향기를 맡게 해주는 식이다. 그래서 그의 산문을 읽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쉽고 경쾌한 보폭으로 같이 걸어가는 느낌을 준다. 어떤 특정 색을 통해서 삶을 알고 역사와 시대와 문화를 알게 해주는 것, 분명 이색적인 삶의 성찰이다. 사실 이 책은 색을 구분 짓거나 각각의 인상을 말하려하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색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여 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색이 서로 엉키고 다른 둔탁하다거나 부드럽거나 한 다른 감각들과 어울러져 기억하게 한다. 색은 어느 나라에서고 통용될 수 없는 ‘다름’을 본질로 한 저마다의 정의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셸 파스투로가 보는 색은 언제나 ‘차이’를 강조하는 색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없음’에 근거하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어떠한 색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만 색조가 있을 뿐이고 그것은 ‘아마도’와 ‘완전히 아닌’ 사이의 숭고함으로 삶의 색을 말하고자 함이다.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의 색감들이 내 인생의 색을 어떻게 물들이게 될 지, 내 옆의 수많은 인생들의 색이 나를 좀 더 풍요롭게 발현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 그런, 짙은 가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