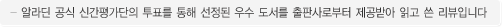[사이언스 이즈 컬처]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사이언스 이즈 컬처]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사이언스 이즈 컬처 - 인문학과 과학의 새로운 르네상스
노엄 촘스키 & 에드워드 윌슨 & 스티븐 핑커 외 지음, 이창희 옮김 / 동아시아 / 2012년 12월
평점 :

절판

이것은 나인가? 이것은 내가 아닌가? 내 주변의 세계에 내가 남기는 흔적, 이 고고학적 발자국은 나인가. 아니면 어떤 2차적인 것인가? 내가 사용하고 소유하는 대상은 나를 구성하는 일부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사용하는 물건인가? 나는 어디서 끝나고 세상은 어디서 시작되며, 한 개인으로서 나는 사회 문화적 네트워크에 어떤 식으로 흩어져 있는가? -p242
18세기부터 시작된 이런 고전적인 질문들은 21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역사가 인문과 과학이라는 분야를 철저히 분리하여 역사를 써오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는 인문과 과학이 마치 한 몸인 듯 묶으려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거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최근에는 과학과 인문을 같이 묶어 ‘인간’을 다시 보려는 의지처럼 보인다. 최근 브뤼노 라투르의《과학인문학 편지》에서도 ‘과학이 없는 인문학은 이전에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 할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과학인문학이라는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
《사이언스 이즈 컬처(Science is Culture)》는 금세기 최고의 지성,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최근에 엣지 재단의 탄생으로 인해 더욱 유명해진 방식 같다. 이러한 서술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어떤 하나의 대상을 채취하여 수집한 연유에 진한 ‘농축액’을 만들어내는 효과에 탁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과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 지성인들을 한 방에 몰아넣은 다음 서로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엣지 방식으로 ‘과학’을 수집한 후, ‘과학 인문학’이라는 진한 농축액을 만들어내었다.
이런 엣지 방식은 과학을 탐구하는 것에 그치치 않고 진화철학이나 의식의 문제, 시간, 설계, 기후, 전쟁과 기만, 꿈, 음악 , 형상, 인공물, 건축, 윤리 , 자유의지, 진화, 창의력, 미래. 소셜 네트워크, 물리학, 인프라 등 인간의 생생한 삶 속에 녹아 있는 살아있는 학문인 문화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제목처럼 과학이라는 바탕위에 문화라는 키워드의 절묘한 조화는 생물학자와 철학자가 만나 진화, 인류, 종교의 기원을 말하고, 심리학자와 소설가가 만나 인간의식의 문제를, 환경운동가와 기후학자가 만나 사진과 객관성, 진실의 시학에 대하여, 우주학자와 소설가가 만나 진실이라는 주제에 다가가는 형태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이들이 말하는 과학이라는 ‘레알 사전’ 속으로 들어가보면,
철학자 대니얼 데넷에게 과학이란 ?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라는 두 척의 배가 나란히 서서 밧줄로 서로를 묶으려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서로 상대편 배에 밧줄을 던지기는 했지만 배는 아직도 서로 삐걱거리며 부딪치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밧줄을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일 것입니다. 두 분야가 워낙 오랫동안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해온 터라 상호간에 불안감이 존재하는 건 당연하죠. 일단 서로 단단히 묶이기만 하면 괜찮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 두 척의 배는 심하게 흔들리면서 서로 부딪힐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레베카 골드스타인에게 도덕성이란?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 눈뜨고. 여기에 뛰어들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눈뜨고 뛰어들고 공감하는 것, 이것이 도덕성이죠.’
다른 사람들도 나 자신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의식이 바탕이 되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도덕 감정이 현대에는 인간 정신에 내재하는 공감능력이 문학이나 역사, 리얼리즘 픽션으로 인해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확장은 스토리텔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끔찍한 고통에 관한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은 윤리와 직결되는 않으나 윤리의 그림자라 할 수 있다. 남의 삶을 느끼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무용수이자 교육자이자 안무가인 앨런 라이트먼에게 시간과 예술이란?
“예술이란 대부분 이처럼 문제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보다 의문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데 더 익숙한가 봅니다.
과학과 예술 사이의 큰 차이 중 하나는 과학은 답이 있는 의문, 그러니까 확실성을 다루는 반면, 예술에서는 답이 없는 의문을 다루는 경우가 더 많죠.

고고학자 섕크스에게 과학이란 ?
오늘날 존재하는 요소 중 우리가 미처 눈을 돌리지 못한 것들이 미래에 재작업되고 재혼합될 수 있는 있습니다. 역사상의 거창한 이야기도 아니고 승리자나 권력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도 아닌 것들 말이죠. 삶을 삶이도록 해주는 일상의 이야기,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이죠.
물리학자 트라우스가 말하는 과학은 ?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사실은, 과학은 어떤 것이 진실임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학은 그저 어떤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다.'
그것이 과학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혁은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과학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능력이죠. “그건 쓰레기야.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마."
저술가이자 풍자 작가인 셸프에게 인간이란?
“일단 걷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말해 걷기 시작하면 누구나 수렵채취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수학자 망델브로가 말하는 건축이란?
“현대 건축이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한쪽에는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은 건축가의 욕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건물을 완성하여는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저술가이자 언론인인 톰 울프가 말하는 자유의지란 ?
“인간의 뇌는 워낙 복잡해서 이해는커녕 상상하기도 어렵다. 인간은 이 분야의 연구에서 몇 킬로미터를 전진한 것이 아니다. 몇 센티미터를 움직였을 뿐이다. 나머지는 다 허구다.”
역사학자 피터 갤리슨에게 현대의 과학이란 ?
이제 과거에는 알 수조차 없던 일들이 갑자기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과학 외부와 내부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지금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대 생물학자 러브 조이는 과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학은 원래 그렇게 돌아간다.”
이들의 대화는 과학과 문화에 대하여 모두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고 재치있게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면모들은 아마도 자신의 분야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까지 과학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해왔고 멀기만 한 분야라고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이들이 말하는 과학은 우리의 일상과 다름없는 생생한 삶속에 스며들어 있는 과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진 모든 것들은 이제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어쩌면 학문으로만 존재했던 과학은 일상에 파고들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혁명을 시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매우 재미있고 즐거운 과학자들의 레알사전은 지금까지의 과학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가르쳐 줄 것이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고 과학자처럼 생각하고 과학자처럼 볼 수는 없지만, 잠깐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한번쯤은 우리의 삶에 '왜?'라는 질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과학인문학'을 체험하는 순간이라는 것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