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 90년대까지였을까. 가정마다 있었던 전집의 시대가. 이후로는 그렇게 활발하게 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사업하는 내내 책정된 월급 외에는 집에 가져온다는 개념이 없었던, 지금와서 보면 왜 사업을 했는지 늘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우리 아버지 덕분에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특히나 할부로 살 수 있었던 전집들은 우리집 뿐만 아니라 대체로 당시 자식들에게 책을 읽히려던 어머니들에게는 인기가 많았던 것 같다. 물론 좀 있는 집들이면서 책에는 관심이 없던 분들도 거실에 떡하니 한 질 정도 박아놓을 장정본을 갖추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었으니만큼 출판사마다 소위 외판원으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었고 인터넷은 커녕 PC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신기하던 당시에는 door-to-door sales에 그리 거부감이 없었기에 우리 집에는 늘 이런 저런 판매원들이 다녀가곤 했었다.
아이들마다, 아니면 집마다 선호하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보통 한번 인연을 맺으면 계속 같은 선을 통해 책을 들여놓게 되었기에 우리집에는 금성출판사의 책이 많이 있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국과 세계로 나눈 위인전기시리즈, 공상과학소설시리즈, 만화한국사시리즈, 그리고 백과사전시리즈가 있었고, 이들 외에는 예전에도 말한 과장광고에 속아 멋진 책장을 받을 줄 알고 한꺼번에 구했던 계림문고시리즈가 대략 우리집의 85년부터 92년 사이의 독서를 책임지고 있었다. 여기에 누나가 중학생이 되면서 구한 멋진 판본의 세계문학시리즈도 있었는데 이들은 그림이 멋진 나의 '이야기성서'시리즈와 함께 아직도 우리집에 남은 당시의 흔적이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문학전집의 경우 font size가 무척 작은데 책만큼은 아직도 탐이 날만큼 멋진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만큼 책을 많이 읽는, 하지만 소유에는 욕심이 덜한 누나에게서 이 전집을 넘겨 받지는 못하고 있다. 나름 장서가를 자처할 만큼 많은 책을 갖고 있게 되었고, 리스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과거의 책들은 다시 구할 수도 없거니와, 돌아올 수 없는 한 시절 우리의 모습과 그만큼의 추억의 대상이라서 볼 때마다 85년부터 92년 사이를 살던 그때가 기억난다.

구구절절하게 예전의 생각이 떠오른 건 무료한 저녁을 달래기 위해 집어든 이 책 때문이었다. 책에서 묘사된 정경과 사건, 사람들이 얽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이나 개발에 대한 생각도 했고 뭔가 잘 정리되는 건 아닌 많은 것들을 떠올렸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연애소설'을 읽는 노인, 그렇게 precious하게 책과 책의 이야기를 대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책을 읽을 때 이야기를 듣고자 더 크게 읽어달라던 주변인물을 보니 다이 시지에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책이 귀하던 시절, 지금처럼 도처에 즉각적이고 즉시적인 entertainment가 넘쳐나지 않던 시절, 책 한 권을 돌려 읽으면서 스토리를 즐기던,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품위와 품격이 느껴지는 그때의 향수. 남미의 생태나 자연주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작가가 심취해있던 사상이라고 하며 그런 의미를 풍기는 부분을 보면서도 사실 나에게 다가온 가장 큰 건 책을 읽고 깊이 공감하면서 귀하게 대하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중남미의 이야기는 동서남북유럽이나 아시아와도 많이 다른데 구전과 전설, 백인과 선주민, 역사, 단절, 침략, 혼란, 그리고 그 무질서하지만 따뜻하고 즐거운 민족성에서 오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덕분에 어쩔 땐 아주 쉽고 즐겁게 읽히지만, 책이나 작가에 따라서 무척 혼란스럽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마르케스나 보르헤스, 그리고 또 몇은 예전에 읽었는데 본격적으로 남미문학을 탐방하려면 다시 찾아서 봐야 할 것 같다.

무라카미 하루키 하면 이젠 '노르웨이의 숲', '해변의 카프카' 같은 초기의 걸작부터 나중에 구해 읽은 중편,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1Q84', '색체가 없는 다자키...'나 '기사단장 죽이기' 같은 책을 떠올리는데, '반딧불이'에는 이런 책들에서 좀더 구체화된 이야기들이 습작의 냄새를 풍기면서 모여 있다. 하루키의 책은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서 봤다고 생각하는데, 한 시기에 몰아서 읽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6년 정도 지난 지금에 와서는 내용이 가물가물하다. 에세이모음이야 워낙 겹치는 책도 많고 이리 저리 짜집기해서 출판사마다 따로 낸 것들이 많아서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지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나뉘는 대표적인 작품들의 경우 너무 건성으로 읽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만큼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연초에 잠깐 초기작 몇 권을 읽었는데, 이런 이유에서 꼭 어쩌다 한번씩은 다시 몇 권을 읽어보게 되는 것 같다. '태엽감는 새'하고 회전목마의 데드히트'가 아마도 다음 타깃이 될 것이다. 진짜 내용이 떠오르지 않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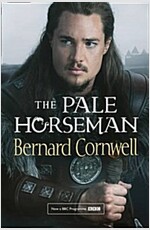
이 시리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드커버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시리즈의 첫 권인 'The Last Kingdom'을 제외하고는 중고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두 번째인 'The Pale Horseman'과 다음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이야기는 하드커버로 아마존에서 주문을 했다. 물론 'The Pale Horseman'까지는 페이퍼백으로 다 읽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트레드 라그나손, 색슨왕국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선 주로 우트레드 우트레드슨이나 베번베르그의 우트레드로 칭하는, 주인공의 이야기. 여전히 젊고 거칠며 치밀하지 못하고 감정과 순간의 격정에 결정을 맡기는 바람에 공을 세우고도 아무런 댓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인 사고뭉치. 이 책을 읽고서 몇 가지 비교를 위해 다시 드라마를 빨리 돌려가면서 봤더니 드라마에서는 시즌 1에 첫 두 권을 다 때려넣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등장인물들 다수도 여럿의 캐릭터를 한 명에게 부여하는 등 각색이 상당했던 것 같다. 뭔가 될만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자기의 탓도 꽤 큰 편이라서 누구를 탓할 수가 없으니 그저 답답할 뿐이다. 엄청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으로 인해 빚더미에 오르고 이를 갚기 위해 데인족으로 변장한 부하들과 함께 약탈을 다니고, 이게 들통이 나서 죽음의 결투를 치루는 중 갑자가 쳐들어온 데인족들로 인해 모두가 뿔뿔히 흩어지고, 색슨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웨섹스왕국이 무너지기 일보직전, 왕을 구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른 단 한번의 전투로 데인족들을 박살낸 우트레드는 하지만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일등공신이면서도 가장 못한 포상을 받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다 (서점에서 미리 조금 펼쳐봤다).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읽고 나면 드디어 아직 드라마화 되지 않는 부분을 읽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즌 3는 언제 나오려는지.
나폴레옹은 3권을 시작해야 하는데, 막스 갈로의 책은 지리하기 짝이 없어서 선뜻 맘이 가지 않는다. 이런 저런 책을 읽다가 던져둔 것이 한 세 권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들도 마저 끝냈으면 한다. 잘 갖춰서 셋업해놓고 그냥 말년에는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고 수행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누구의 꿈처럼 오후 다섯시에는 퇴근해서 발을 씻고 잠잘때까지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