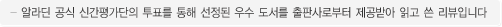[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 폴 크루그먼, 침체의 끝을 말하다
폴 크루그먼 지음, 박세연 옮김 / 엘도라도 / 2013년 4월
평점 :

절판

최근 "버냉키 쇼크"라고 불리는 현상이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미국의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달러를 과감하게 시장에 풀었던 연준의 버냉키가 달러의 공급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외환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경제 위기의 고통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냉키를 비롯한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회복을 이미 선언하고 그 이후의 정책을 대비하는 것 같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기 바쁜 우리의 관점과 국가경제와 세계경제를 관찰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그들의 관점이 차이라고 봐야 할까? 아무리 시선의 차이가 크다고 하지만,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은 조그만 경제의 변화에도 큰 타격을 입게 마련이다. 대공황이 이후에 가장 무시무시한 경제 위기라고 평가하던 이번 경제위기의 피해가 과연 그들의 선언 한마디로 다 회복된 것일까?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지금 현실은 나아지고 있지 않은데, 몇몇 지표라는 것으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는 심리"라는 관점 또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그만 희망으로 이 위기를 더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려는 의미 또한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관료들은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고 집행했을까? 지난 과정을 뒤돌아보면 수 생각만큼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을 많이 목격했었다. 이 사태를 만들어낸 집단들이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범죄자 또는 파괴자로 매도하면서 색깔론과 이념논쟁을 펼쳤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념에 물들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린스펀이나 로버트 루카스 같은 자유시장을 옹해했던 인물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자기고백을 통해서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망상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듯하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가 쇄퇴하고 케인즈가 부활을 수 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 오히려 반대편에서는 극우주의를 비롯한 극단적인 이념으로 무장한 이들이 더욱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파렴치한 은행가들과 졸부들은 권력과 결탁해 더욱더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아이러니 한 상황을 우리는 목격했다.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구제금융으로 보너스 잔치를 하던 그들은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수 많은 정책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다. 결국에 이러한 그들의 움직임에 대중들에게 파고든 극단적인 이념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수 많은 정책들을 가로 막아왔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했다. 결국에 제대로 된 구제책이나 복지 정책들은 그렇게 저지되어 왔다. 케인즈가 부활했다고 외쳤던 학자들이 머쓱할 정도로 오히려 극우와 우파들이 각국의 정권을 장악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났다.
폴 크루그먼의 이 책은 그런 현실에 대한 분노가 녹아 있는 듯하다. 이전 책도 강렬한 어조로 시장만능주의를 비판해왔던 그 이지만, 이 책은 좀 더 강한 목소리를 쏟아낸다.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회복을 더딘 것에 분노를 담은 듯하다. 그는 케인즈적 관점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들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정부의 적자재정을 강하게 옹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이상한 말과 함께 정부의 적자재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높기만 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크루그먼의 주장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최후의 대부자로써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정부가 그런 역할마저 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경제의 회복과정은 더 고통스러울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경제적 논리로 그것이 왜 큰 문제가 아닌지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적당한 인플레이션만 있다면 지금은 과도해 보일 수 있는 국가부채이긴하지만,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부채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채의 증가 속도를 경제 성장 속도보다 느리게 유리하면 국가의 부채는 위험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3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금리가 제로 아래로 떨어질 수 없는 한계에 따른 제약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고, 앞에서 말한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임금의 하향 경목 경직성에 의해서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구매력이 떨어진 상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도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을 펼친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 일본의 경기침체를 국복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것이다. 크루그먼은 경기침체로 인한 삶의 질 하락도 걱정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를 지적한다.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막으려는 노력들이 점차힘을 잃어갈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일본의 극우화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적 가치의 후퇴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민주적 가치의 후퇴는 바로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의 분위기를 서술한 역사학자 로버트 매켈바인은 당시에 있었던 "훌륭한 이웃"되기라는 화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현대 산업 자본주의의 탐욕적 개인주의에 반대해 공동체와 나눔을 모색하려는 시도였다."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자본주의의 탐욕적 개인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은 더 탐욕적으로 행동한다. 민주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에 대해서는 점점 인색하지고 있다. 수 많은 위기를 통해서 위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시대정신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과거의 패러다임에 대한 집착과 아집으로 구시대적 색깔론과 이념논쟁만 점점 난무하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지출삭감 정책이 이번 경기침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일시적인 지출 확대가 경기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는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크리스티나 로머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의 글을 접할 때 그저 '그건 너희들 생각이지'하고 넘겨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진심으로 바라건대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끝을 맺는 크루그먼의 진심어린 글이 강한 여운을 남긴다. 그렇다. 과거에 대한 향수와 아집을 버리고 "진심으로 바라건대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