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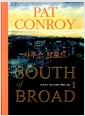
-
사우스 브로드 1
팻 콘로이 지음, 안진환 외 옮김 / 생각의나무 / 2009년 10월
평점 :

품절

'아름답다'고 느꼈다. 책을 읽고 아름답다고 느낀 적은 좀처럼 없었던 듯 하다. 대체 뭐가 아름답다는 것인지, 사실은 나조차도 잘 설명할 수 없다. 그저 나는, 내가 정말 책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시냇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흐름에 몸을 맡기고, 물살이 굽이굽이를 지나 어딘가로 향하는 것처럼 작가가 인도하는 이야기의 흐름에 깊숙이 빠져버렸다. 작품의 배경인 찰스턴은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미 나에게 또 하나의 고향처럼 느껴졌을 정도다.
외국문학에, 그것도 미국문학에 공감하기 힘들 때가 있다. 어디서나 사람 사는 일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각자가 간직한 '문화'라는 것이 있다. 각 문화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될 말, 해도 되는 행동,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생각 등은 현격히 구분되며 그 경계를 중심으로 너와 내가 분리된다.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저쪽이 농담으로 한 말을 이쪽은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틈'이 있는 것이다. 그 '틈'을 나는 그 어떤 문학작품보다 미국문학에서 가장 많이 느꼈었다. 형언할 수 없는 동떨어짐-이라 해야 할까. 아무리 가까이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가슴을 울리며 성큼 다가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별 다섯은 충분하다.
사랑스러운 나의 주인공들은 미국의 남부 찰스턴에서 태어났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혈통과 피부색으로 분류되는 사회가 바로 찰스턴이었다. 누구에게는 보석처럼 빛나는 도시였으나 그 누구에게는 삶을 끈질기게 연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도시. 어쩔 수 없이 '틈'을 느껴야 했던 그 도시에서 1969년 6월 16일의 만남들이 이루어진다. 그 만남들이 만약 권력과 계층, 인종에 관해 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묘사되었거나 설명하려 드는 식이었다면 매우 지루하게 전개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작가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아픔들을 뛰어넘은 청춘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절정을 맞이하고 찬란하게 스러질 수 있는지 너무나 훌륭하게 보여주었다. 한 사회에 어떤 이념과 사상이 존재하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어떻게 살아가고 사랑하는가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청춘소설이자 성장소설이며, 한 권의 시집이자 자서전이며, 그들의 위대한 만남과 여정을 기록한 전기이기도 하다.
우연의 힘에 꽤 자주 놀라곤 한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답지, 선택할 수 있었던 답지들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결국은 선택한다. 지금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그 선택이 내 삶의 어딘가에서 커다란 발자국을 드러낼 지 생각하면 그 가늠할 수 없는 운명의 힘에 탄성을 지르기도 한다. 만남도 그 중 하나다. 누군가에게 등을 떠밀리듯, 혹은 앞에서 밀쳐지듯 이루어진 만남은 순식간에 우리를 예측할 수 없는 먼 미래로 내던져버린다.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지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가 삶의 매력이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삶은 잔혹한 것이기도 하다. 폭풍우와 같은 거센 바람에 우리는 늘 무장하고 맞서야하며 간혹 내비치는 햇살에 겨우 한 줌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청춘은 한 줄기 바람처럼 가늘고 약하며 상처는 무겁다. 늘 힘들고 자주 불안하며 가끔씩 행복한 우리. 그러나 그것이 보통의 인생이라 해도, 가끔은 서로를 공격하고 증오의 언어를 내뱉어 상처를 주고받는다 해도, 그 누군가가 함께 있어준다면 그 폭풍우 속을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찰스턴의 나의 사랑하는 주인공들처럼.
아름다움은 결국 위대함으로 이어진다. 문장에서 아름다움을 느꼈고 작품 전체를 통해 문학의 위대함을 느꼈다. 이런 게 바로 문학의 힘이구나 하는 느낌. 누가 내 머리를 탁 쳐서 그 단어들이 세상 빛을 볼 수 있다면 좋을텐데 안타깝다. 올해 읽은 책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만한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