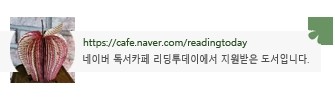-

-
새소녀 - 꿈을 따라간 이들의 이야기
벨마 월리스 지음, 김남주 옮김 / 이봄 / 2021년 12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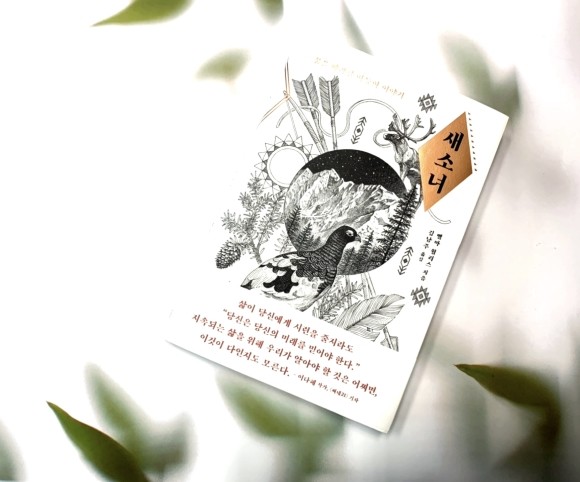
꿈을 좇아 사는 것이 그리도 힘든 일이었다면, 다구와 주툰바는 길을 떠나지 않고 무리에 남는 것을 선택했을까. 어쩔 수 없이 무리에 남게 된 다구의 생활은 어쩌면 그에게 큰 의미 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무리와 함께 있는 동안은 적어도 생명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은 적었을 것이다. 무언가를 얻은 다음에 잃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주툰바, 새소녀 또한 그랬을지도 모른다. 일생을 무리 안에 주저앉아 다른 여인들처럼 사는 것에 불만, 혹은 절망을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큰 비극을 겪을 줄 알았다면 아마도 떠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앞일을 모르는 우리가 그러하듯, 그러나 그들은 기어이 길을 떠난다.
작가가 작품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아타바스카 원주민 그위친족은 오늘날 유콘강과 포큐파인강과 타나나강을 따라 알래스카 동부와 캐나다 서부에 살고 있다.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하면 한때는 더 북쪽에 살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쪽으로 이동한 그위친족. 그들과 좋지 않은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누피아크족, 치콰이라 불렸던 그들의 습격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 다구와 새소녀의 이야기는, 그 가치를 깨지 않으려는 듯 담담한 어조 속에서 바람 결에 흘러가는 숨소리처럼 진행된다.
다구의 삶도 삶이지만 새소녀의 인생은 무리를 떠난 순간부터 비극 속으로 가라앉는다. 치콰이족에게 납치되고, 유린 당하고, 아이를 통해 희망을 꿈꾸었으나 그 미래도 빼앗긴 그녀를 끝내는 분노하게 만든 것은 사랑하는 이들까지 모욕당하는 현실. 그 현실을 벗어나고자 유령처럼 움직였던 그 밤의 새소녀. 마땅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그녀의 고통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틀링기트족을 만난 다구가 노래와 물자를 교환하자고 제안하는 장면이다. 다구는 자신의 무리에서 부르던 노래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 노래에 만족한 틀링기트족은 다구에게 먹을거리를 내어준다. 그리고 다구는 자신의 무리에게 이제는 틀링기트족의 것이 된 이 노래를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말하겠다고 약속한다. 서면으로 한 약속도 잘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서 단지 한 마디 말로 맺어진 맹세는 더 큰 무게감을 지니고 빛을 발한다. 그들에게는 언약이 곧 생명과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낭랑히 울리는 듯한 노랫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하다.
상처입고 다친 다구와 새소녀가 안식을 찾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떠나고자 발버둥쳤던 무리. 떠나는 아이들은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일까. 미래를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구와 새소녀의 삶은 묘한 동질감과 함께 동경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만든다. 다시 시작되는 인연. 삶이 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미래를 믿고 살아온 두 사람을 통해 생의 무게를 느꼈던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