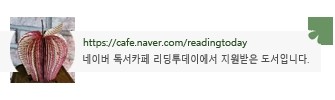-

-
일몰의 저편 ㅣ 이판사판
기리노 나쓰오 지음, 이규원 옮김 / 북스피어 / 2021년 9월
평점 :




소설은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읽어야 하는데 특정 부분 특정 단어만 끄집어 내서 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문맥으로 읽어 준다면 그런 남녀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 70
'기리노 나쓰오'라는 이름을 오랜만에 대면한다.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도 여전히 작가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있으면 망설여지는 것은 매한가지. 그가 그리는 세계가 어떨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탓이다. 마치 평범한 모든 것은 거부한다는 듯 작가님의 세계는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 되도록이면 살면서 접하고 싶지 않은 일들로 가득차 있다. 금기 따위는 멍멍이나 줘버리라는 듯 경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드는 그로테스크한 장면들, 인생은 빛과 희망이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라도 한 듯한 새드엔딩 of 새드엔딩. 이런 그의 작품을 읽고 어찌 심신이 멀쩡할 수 있으랴. 글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기로 작가님의 작품을 읽고 난 다음에는 꼭 앓아누웠었던 지난 날.
여기서부터는 잠시 기리노 나쓰오가 아닌 나카야마 시치리 이야기. 시치리의 [연쇄 살인마 개구리 남자]를 읽고 다시는 이 작가와 상종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거냐며, 설마 이건 상상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실행이라도 해 본 것이 아니냐며, 이런 기이한 정신상태를 가진 작가의 작품은 더 이상 읽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그 때. 지금도 여전히 <개구리 남자> 시리즈나 <비웃는 숙녀> 시리즈 같은 이야기에는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것은 작품과 이야기 속 인물에 대한 혐오감일 뿐 작가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왜 기리노 나쓰오 책을 읽고 나카야마 시치리가 떠올랐는가. [일몰의 저편] 주인공 마쓰 유메이는 '세상 사람들의 금기나 양식 따위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지점에 인간의 본질이 있다고 믿고 독자의 미간을 찡그리게 만들고 싶은' 작가다. 그런 그녀가 일명 '총무성 문화국 문화문예윤리향상위원회'라는 곳에서 소환장을 받는다. 그들은 마쓰의 작품이 문제라는 독자의 밀고를 받았다며 그녀에게 작품 성향의 전환을 위해 '요양소'에 머물 것을 강요했다. 결국 요양소에 갇힌 채 탈출의 기회만 엿보게 된 마쓰. 그런 마쓰와 그녀가 주장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기리노 나쓰오 같은 다크한 작품을 쓰는 작가들이 얼마나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을지 실감하게 되었다. 기리노 나쓰오도, 나카야마 시치리도 과연 대중의 시선에 얼마나 신경을 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작가라면 독자들의 평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을 터.
[일몰의 저편]은 독자의 시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국가의 권력으로 강제되는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에 대해 다룬다. 요양소는 요양소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진행되는 또 하나의 살육의 현장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식욕을 인질로 삼아 작가들을 길들이며 '올바른' 작품을 쓰라고 강요하는 주체는 소장이고 국가이지만, 그 뒤에 존재하는 독자들과 시장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분위기에 '쎈 언니' 기리노 나쓰오마저 갑갑함을 느꼈을까. 결코 해피엔딩일 것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씁쓸한 결말에 다다른 마쓰의 모습이 마치 기리노 나쓰오인 것 같아서 붙잡고 싶었다.
시시한 논리 들먹이지 마. 작품은 자유야. 인간의 마음은 자유니까, 무엇을 표현해도 돼. 국가권력이 그걸 금지하면 안 돼. 그게 검열이야, 파시즘이라고.
p317
논란이 될만한 소재가 충분한 작품이다. 소설을 읽으면서 좋은 소설, 나쁜 소설이 존재하는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내 자신이 미흡하다고 여겨졌다. 다만,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고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다. 문학이 시대를 반영한다면 아름다운 모습만 그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선호도와는 상관없이 삶의 잔혹한 부분을 그려냈다고 해서 '나쁜 소설'이라고 평가되지는 않기를. 작가들이 글을 쓴 의도를 조금이라도 깊게 생각하는 독자들이 늘어나기를. 그리하여 수많은 작가들이 일몰을 바라보며 절벽에 내몰리지는 않기를 바라본다.
북스피어의 새로운 시리즈 <이판사판>의 신호탄을 쏜 [일몰의 저편]. '지금껏 북스피어가 만들어 온 장르문학의 맥을 이어나갈 도서들로 어차피 이렇게 이름 지어도 기억하지 못할 테고 저렇게 이름 지어도 기억하지 못할 테지만 '이판사판'이라는 시리즈 이름은 안 잊어버리겠지'라는 마음으로 만드셨다고 한다. 딱 10권만 만들고 이 시리즈 끝장을 볼 생각이라는데, 노노, 부디 승승장구 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