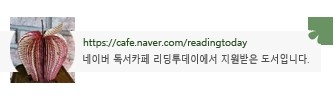당신 이해하느냐고, 이 사형수를.
p165
시종일관 이어지는 무미건조한 문체 속에서 이 문장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망설였다. 나는 과연 이 주인공을 이해하고 있는가.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마저도 그저 일상의 한부분처럼 받아들이는 듯한 뫼르소의 모습은 기이하게 다가올 정도였다. 이미 시신이 된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도 보려하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집에 돌아와 앞으로 열두 시간을 잘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던 뫼르소.
그의 모든 생활이 그러했다. 사랑하지는 않지만 잠자리를 함께 하는 마리에게 어쩌면 결혼할 수도 있겠다 이야기하는 뫼르소의 삶은 어쩐지 권태로 가득차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가 무엇에 기쁨을 느끼고 살아있다는 실감을 하는지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가끔 수영을 하고, 술을 마시고, 어쩐지 되는대로,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숨만 쉬고 있는 듯한 인물. 그런 그가 우연히 사람을 죽이고 만다. 그런데 과연 우연이었을까. 단 한발이었다면 몰라도, 어째서 그는 잠시 쉬었다가 연달아 네 방을 더 쏜 것인가. 죽음에 대한 무감함이었던가.
어쩌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재판장에서도 별다른 감정의 동요는 느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가 사람을 죽인 사실보다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사람이라면 응당 부모의 죽음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수군거림. 뫼르소는 그렇게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뫼르소가 감정을 터뜨린 것은 사형이 확정되고 사제가 그를 방문했을 때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나서야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한 뫼르소.
말로만 듣던 알베르 카뮈의 그 [이방인]을 마침내 만났다. 무척 기대하고 읽었는데 읽는 내내 뫼르소의 마음이 읽히지 않아 머리를 쥐어뜯어야 했다. 왜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보려 하지 않는가, 삶에 대해 그는 왜 그리 무덤덤한가. 아마도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러야 했던 시대 배경 때문이리라 짐작할 뿐이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을지 알 수 없다.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깊은 허무에 빠져들었을 것이고, 그 어떤 일로도 진정한 기쁨은 느낄 수 없었을 것이며, 만연한 죽음에도 큰 충격을 받지 못했으리라.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아헤맸을 사람들. 자신의 죽음 앞에서야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느꼈을까.

어려운 작품이다. 시대적 배경을 알고 읽는다해도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는 나에게는, 어둠 속에서 팔을 내밀어 길을 따라가는 듯했던 이야기. 애초에 세계문학, 고전소설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 오만이겠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도,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도 몇 번씩 읽어야 하지 않았던가. [이방인]도 앞으로 두 세번은 더 읽어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