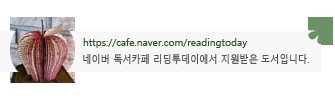<발행인의 말>이 등장하길래 대체 어떤 상황인가 싶었더니, [벨낀 이야기]는 이반 뻬뜨로비치 벨낀이라는 한 남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다섯 가지 이야기가 실린 단편집-이라는 설정이다. 고인의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벨낀은 가문의 재정적인 상황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으나 정직하고 온순한 젊은이로 많은 원고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것들은 대부분 실화로 여러 사람들에게서 벨낀이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는 하나 등장 인물들의 이름만큼은 벨낀이 직접 지은 것이라고. 감기가 열병으로 도져 세상을 떠난 벨낀. 여기에 그가 기록한 다섯 가지 이야기가 있다.
뿌쉬낀이나 똘스또이 등 러시아 작가들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고, 몇 편의 작품을 읽어보기도 했지만 다른 고전 작품들에 비해 살짝 멀리했던 이유는 등장인물들의 그 긴 이름 때문이기도 했다. 이반 뻬뜨로비치 벨낀은 물론, 작품들에 등장하는 아드리안 쁘로호로프, 이반 뻬뜨로비치 베레스또프 등 각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다. 여기에 러시아=추운 나라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작품들에서 모두 추위가 느껴졌던 것은 나만의 착각이겠지. 게다가 어쩐지 어려울 것 같다는 선입견 때문에 세트 중에서도 가장 손이 안 갈 것 같아 '에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심정으로 집었는데, 어라??!! 너무너무 재미난 것이다! 아서 코난 도일 저리 갈 만큼의 반전들과 입을 다시게 만드는 긴장감 등으로 초반의 우려와는 달리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다섯 편의 이야기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한 발>.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조마조마. 생각지도 못한 반전에 전율까지 느끼면서 엄지 손가락이 저절로 올라간다. 인물의 심리 묘사는 물론 이야기의 구성까지 완벽한 작품이라! 이 작품이 맨 앞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다음 작품들에까지 높은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듯 하다.

신기하게도 두 어편의 작품은 또 다른 어떤 작품들을 떠올리게 했다. <장의사>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귀족 아가씨-시골 처녀>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하나같은 느낌. <장의사>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망령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후에 자신의 집에 우글거리는 망령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게 된다. 내용도 구성도 완전히 다르지만 [크리스마스 캐럴]이 떠올랐던 것은 '망령'이라는 소재 때문이었을까.
<귀족 아가씨-시골 처녀>는 경쾌하면서도 발랄한 분위기의 작품으로 원수였던 두 가문의 이야기를 그렸다. 한쪽 가문의 아가씨가 다른 가문의 자제를 만나기 위해 신분을 속이고 시골 처녀로 분장한 후 밀회를 즐기며 애정을 키워가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별안간 두 가문의 원한이 사라져버린다. 이에 두 자식들을 결혼시키기로 합의한 아버지들에 의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아가씨. 작가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결말은 뻔한 것으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소재나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유쾌한 분위기가 생각나는 이야기들이었다.
학창시절 분명 [대위의 딸]을 읽어본 기억은 나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 때도 분명 어려운 이름과 지명들 때문에 매운 맛 좀 본 게 아니었을까. 뿌쉬낀의 작품이 이리 재미있을 줄이야! 다음에는 장편에 도전이다!!